


2021년 1월은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2천명을 밑돌고,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1년쯤 뒤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때 할아버지의 부고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여느 장례식과는 사뭇 달랐다. 병상 부족으로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까지 가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뒤 화장장의 가장 마지막 순번을 배정받았다. 흰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은 할아버지가 화장장에 들어서기 전 잠깐 관을 열어주었다. 화장장 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건 1분 남짓한 그 순간이 전부였다.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문객들을 돌려보내기 바빴고, 조문객 없는 장례식은 사흘 내내 적막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1년이 지나서야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다. 나는 그제서야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느낀 슬픔과 공허함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1936년생인 할아버지는 한평생을 농사꾼으로 사셨다. 고된 일을 마치고 반주를 하시면, 가끔 자신이 국민학생일 때 6.25 전쟁이 났었다며 전쟁 얘기를 해주시곤 했다. 과일과 단팥빵같은 주전부리를 좋아하셨고 체력이 떨어져도 소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하신 분이었다. 손녀의 대학교 졸업식을 본다고 먼 길을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 캠퍼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사진은 내가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됐다. 할아버지는 내가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고 선물해드린 방한 부츠를 신기 아깝다며 방 한켠에 모셔두기만 했다. 명절에 용돈을 드렸을 땐 별 내색 없다가, 나중에 그 봉투를 들고 신나게 5일장에 가셨다는 얘기를 할머니에게 전해듣고 웃었던 기억도 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애도하는 법을 찾고 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엄마는 할아버지를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 할아버지가 깐깐한 입맛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엄마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병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병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가끔 지난 밤 꿈에 할아버지가 다녀갔다고 얘기한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고, 표정은 어땠냐고 묻는 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은 없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마지막 길을 배웅했었다. 혹시나 추울까봐 패딩 점퍼를 입혔는데 방역 직원들이 그 위로 투명한 비닐을 답답하게 감쌌다며, 할아버지가 그 상태로 2시간 떨어진 도 종합병원까지 갔다면 무척 더워서 괴로웠을 것이라고. 아빠는 가끔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꺼내곤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두 번의 제사상과 세 번의 차례상을 차렸다. 평소에 제사를 왜 지내는지 모르겠다며 제사 보이콧을 했던 나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진짜로 저승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졌다. 향을 피워 할아버지의 영혼을 부르고, 영혼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차린 음식을 먹은 영혼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몇 번의 제사를 온전히 지내면서다. 저승이 있다면 죽은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승으로 간 것일 뿐이라고, 할아버지는 먼저 떠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서 바쁘게 노느라 이승은 생각나지도 않을 거라고 말이다. 병풍을 접고 제기를 정리하면서 다음 제사상에는 평소에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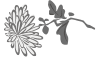 39분이
헌화하셨습니다.
39분이
헌화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