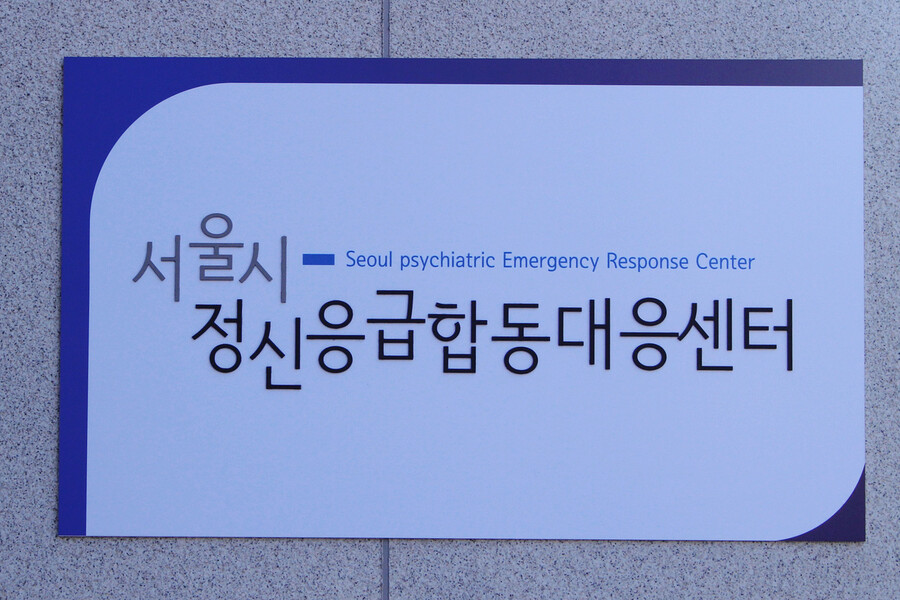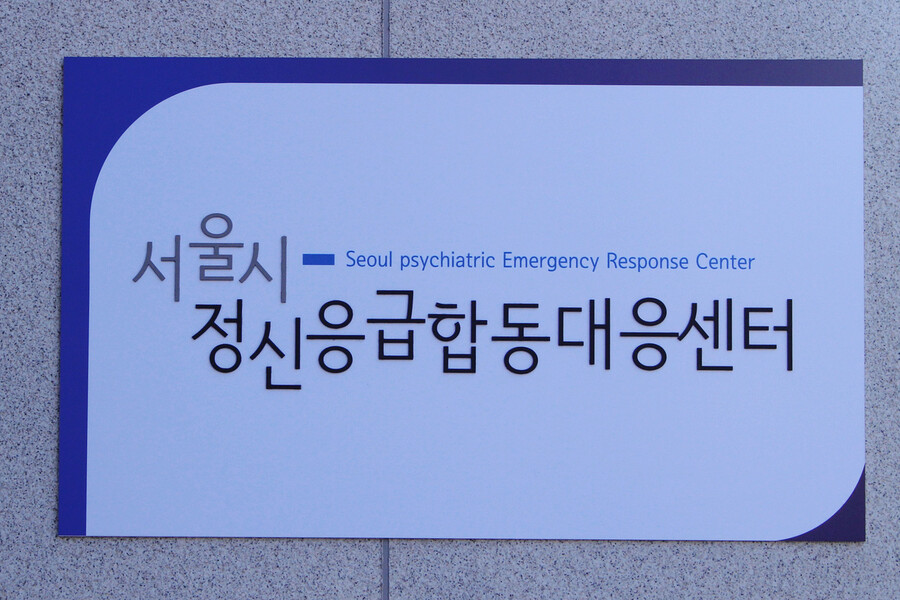ㄱ씨는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ㄱ씨의 이상 행동에 대한 신고를 받은 지구대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출동요청을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ㄱ씨 마음이 진정됐고, 가족 등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돼 ㄱ씨는 현재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다.
ㄴ씨도 주취 상태에서 자해 위험이 있어 지구대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로 출동을 요청한 사례다. 응급입원을 해야 하는데 간경화 이력으로 협진까지 필요한 상태였다. 센터는 내·외과적 치료가 모두 가능한 정신응급의료센터로 ㄴ씨를 이송했고, 이후 ㄴ씨는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치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다.
ㄱ씨와 ㄴ씨는 모두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11월 정식 출범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를 받는 경우다. 서울시는 22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센터를 운영한 결과 사례 총 1291건을 접수했다. 전화상담서비스는 992건이고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전문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한 건은 299건”이라고 밝혔다. 전문요원이 현장 출동한 299건 가운데 응급입원이 182건(60.8%)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1명꼴로 병원에 인계된 셈이다. 현장에서 전문요원의 상담으로 대상자 심리상태가 안정돼 보호자 등에게 인계된 사례가 71건(23.7%), 내·외과적 치료 연계를 받은 경우가 46건(15.3%)이다.
서울시는 응급입원 조처가 통상의 강제입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데 다른 규정을 통해 입원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최대 72시간까지만 입원이 가능한 조처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야간에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마련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그동안
일선 경찰이 조현병·조울증·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자의 응급 대응에 고충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현장 대응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요원이 대상자 면담과 정신과적 평가, 조치 등을 병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대상자 응급입원이 필요할 때는 입원가능 병상을 확인한 뒤 의료기관까지 이송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정신응급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후 관리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장 대응을 하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