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일하는 공동체의 ‘희망 찾기 프로젝트’.
충북 청주에 사는 ㅊ(24)씨는 희망이 없었다.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정 형편이 나날이 어려워지면서 2019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갔는데 생활이 쪼들려 결국 학교를 그만뒀죠. 알바를 구했는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면서 우울감에 빠졌죠.”
‘은둔형 외톨이’처럼 고립돼 가던 그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다, 사회적 관계망(SNS)에서 사단법인 일하는 공동체의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접하고, 문을 두드렸다.
청주에 뿌리를 둔 일하는 공동체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부의 지원을 받아 은둔형 외톨이, 취업 준비생, 백수 등 위기에 놓인 19~34살 청년을 돕는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 찾기 프로젝트’는 전문가 연계 심리상담, 사회활동 지원, 취업지원, 지지기반·환경 개선, 활동공간 지원 등으로 짜여 있다.
ㅊ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여 차례 ‘희망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심리상담을 받았다. 틈틈이 손글씨(캘리그라피), 요리, 여행, 독서, 사진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심리상담을 통해 다른 이를 의식하지 않는 대신 조금씩 나를 찾을 수 있었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자존감을 회복한 ㅊ씨는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희망 찾기 프로젝트’는 취업지원 기관 연계, 취업 정보 제공, 직업 탐방, 취업 클리닉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
일하는 공동체 ‘희망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집단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ㅅ(27)씨는 실직의 아픔을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극복했다. ㅅ씨는 대학 졸업 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지난 4월 어렵사리 한 직장에 취업했다. 하지만 3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일 처리가 더디다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이것밖에 안 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ㅅ씨는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찾아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최근 다시 취업했다. “상담을 통해 실직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게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고민 많은 청년의 말을 경청해 주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학교 폭력 피해 등으로 우울감에 빠져있던 ㅇ(23)씨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희망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을 찾았다. “심리상담과 함께 농사 체험, 산책, 사색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울감 등을 극복할 수 있었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일하는 공동체 ‘희망 찾기 프로젝트’에는 청년 101명이 참여했다. 취업(26명), 직업훈련(13명), 학업(5명) 등으로 프로젝트를 끝낸 이도 있지만 38명은 아직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은주 일하는 공동체 ‘희망 찾기 프로젝트’ 팀장은 “미취업자 이면서 교육. 직업훈련 등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는 오이시디(OECD) 기준으로 전체 청년의 18.9%로, 충북만 9만여명이다. 이들은 학교·노동시장 등에서 배제돼, 우울감·무력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공동체는 청년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 지원 조례 제정 등 대안을 찾는 일도 하고 있다. 다음 달 7일 충북도, 충북도의회 등과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 및 사회적 참여 방안’ 토론회를 열 참이다. 이 팀장은 “서울·광주·제주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등을 돕는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울산·충남 등은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문제는 당사자의 고통일 뿐 아니라 사회·국가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만큼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일하는 공동체 희망 찾기 프로젝트 누리집
▶한겨레 충청 기사 더 보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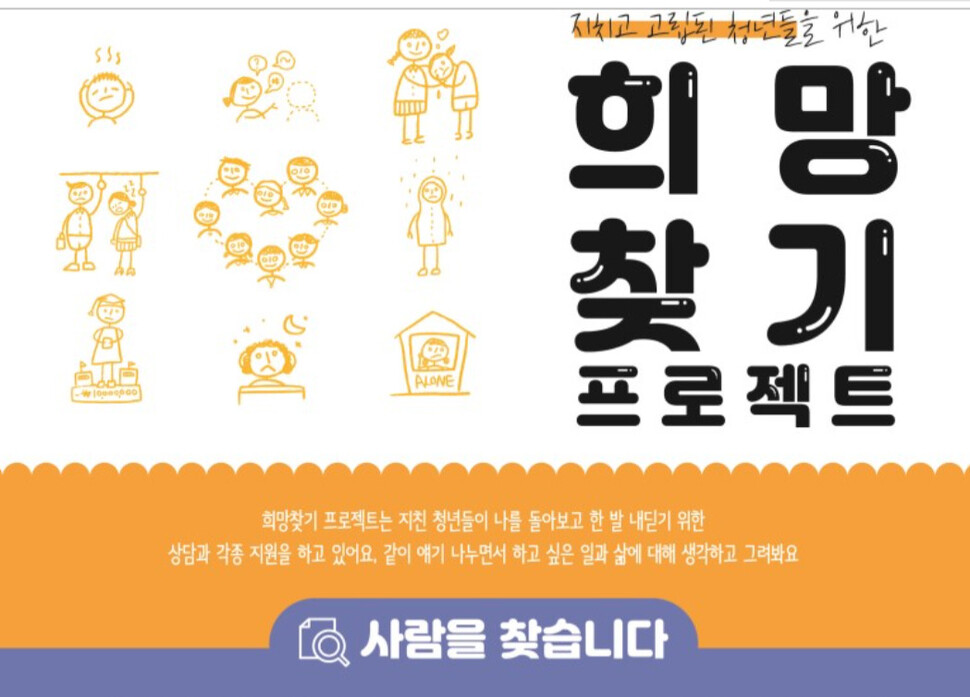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