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2일 과천의 자택 마당에서 ‘불면증 분투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 조현 기자
며칠만 잠을 못자면 누구나 미치게 된다. 오랫동안 불면으로 고생한 화학자가 <화학자의 숙면법>(태학사 펴냄)이란 책을 냈다. 이석현(71) 아주대 명예교수다.
이 책은 평생 불면과 싸운 그 자신의 분투기다. 어쩌면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학문적 성취보다 숙면이 삶에서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6년 49만4000명에서 2019년 63만7000명으로 28.7% 증가했다. 불면은 이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지난 2일 경기도 과천 자택에서 이 교수에게 불면 분투기와 해법을 들었다.
서울대·카이스트·프랑스 유학·박사
30대에 교수됐으나 ‘정체성’ 잃고 방황
50대 연구성과 내자 ‘명예욕’ 돋아 불안
“잠 못 이뤄 눈에 핏발 솟고 소화장애”
수면 경험 기록하며 손자병법 등 탐독
마음·운동 등 ‘화학자의 숙면면’ 펴내
이 교수의 자택은 관악산 아래 자리한 단독주택이다. 30대부터 이렇게 멋진 단독주택을 지어 역시 교수인 부인과 두 딸과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다니 부러움을 살 만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석사와 프랑스 루이파스퇴르대 박사를 거쳐 일찍이 30대에 교수가 됐다. 외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었다.
“남들처럼 교수가 되려고 조교 일하면서 고생한 적도 없고, 유학 다녀와서 별 어려움 없이 자리를 얻었다. 나름 성공 한 거 같았는데, 다음 목표를 잃었다. 실험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강의만 하기에도 바빠 학문적 성취를 이룰 여건이 안 돼 있어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 목표를 잃고, 일과 삶의 조화를 잃었던 데에 불면의 더 큰 원인이 있었다.”
이후 그는 외적 성공을 넘은 내적 성장을 꾀하고자 애썼지만, 50대 들어 학문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또 다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내 연구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리면서, 혹시라도 특허를 내기 전에 내용이 알려져 기술보호를 받지 못하면 ‘죽 쒀서 개 주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그 연구가 수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에 더 잠을 자기 어려웠고, 내 업적이 교과서에 한줄이라도 실리길 바라는 명예욕이 발동되자 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타고난 완벽주의 성격이 더욱 문제였다. 그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완전하기를 갈구한 형벌이었음을 자각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소화장애에다 욕망이 더해져 잠을 제대로 못 이룬 날에는 눈의 실핏줄이 터지기 일쑤였다. 그는 불면을 다스리기 위해 수면 경험을 기록하거나, 탈출구를 찾고자 <손자병법>까지 탐독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 있었다. 잠은 제 발로 와야 한다. 그저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으면 되는 일이었다. 불면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
이후 그는 잠이 잘 올 만한 몸과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때부터는 90분 정도 초벌 잠만 자고 나면 ‘더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고, 불면을 일으키는 소화장애가 두려워 매운 음식이나 커피와 막걸리 한잔도 꺼려하는 까칠한 자세도 버렸다. 그랬더니 의외로 신나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왔다. 고민하고 앉아 있는 대신 걸으며 몸을 움직였다. 결론적으로 운동만큼 좋은 처방을 찾기 어려웠다.
그가 과학자로서 특히 주목한 것은 뇌의 가소성이었다. 가소성이란 뇌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생각과 감정의 방향을 180도 바꿔보곤 했다. 관점만 바꾸어도, 마음과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삶은 고분자 예술이다. 삶에 정해진 길이 없듯이, 고분자 구조의 형태도 정해진 틀이 없다. 주위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해간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압박에 가장 잘 견디는 것은 쇠가 아니라 고무다. 고무 같은 회복탄력성을 가지려면 고민보다는 휴식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고분자를 연구하는 화학자답게 그는 고무 같은 외유내강의 마음가짐을 제시했다. 그는 그런 마음을 위해 프랑스 유학파답게 ‘톨레랑스’를 권유했다. “톨레랑스란 참고 견디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아를 넓히는 것이다. 자아가 넓어지면 웬만한 일엔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영국 유학시절 배운 영어 ‘킵 더 볼’(keep the ball)에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킵 더 볼’은 볼을 안 뺏기려고 혼자 드리블 하라는 뜻이 아니라, 패스를 하라는 뜻이다. 세상은 혼자가 아닌 팀이다. 불면도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기보다는 동네 사람들과 시덥지 않은 이야기라도 나누며 소통하는 게 좋다. 나도 예전엔 동네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붙였지만 지금은 자주 소통하려고 한다. 많이 걷고, 그렇게 대화한 날은 단잠을 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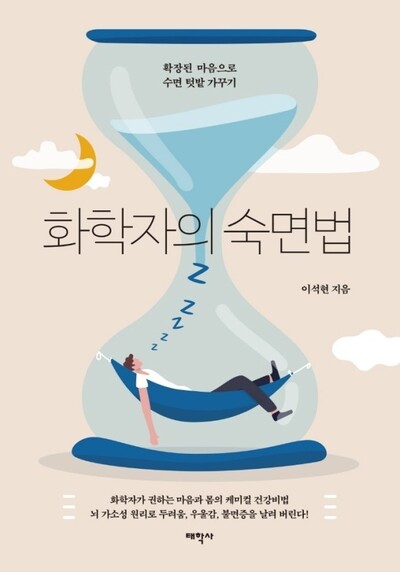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