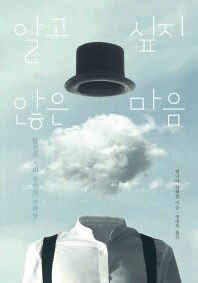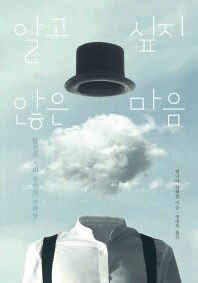알고 싶지 않은 마음
탈진실 시대 무지의 전략들
레나타 살레츨 지음, 정영목 옮김 l 후마니타스 l 1만7000원
눈부신 기술 발전에 기댄 이른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앎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될 것 같지만, 부정확한 정보와 음모론은 되레 기승을 부린다. 때론 우리 스스로 ‘알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욱 기대곤 한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레나타 살레츨(59·
사진)은 최신 저작 <알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앎에 다가설 때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무지와 무시, 부인의 전략을 구사하는지 짚는다. 정신분석학이 본격적으로 열어보였듯, 인간은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크 라캉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번뇌’(無明煩惱)에서 ‘무지를 향한 열정’이라는 개념을 빌려오기도 했다. 이러한 무지를 향한 열정은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앎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때론 사회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 메커니즘을 파괴할 수 있는 정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쓰이곤 한다.
특히 지은이는 “시대마다 그 시대 특유의 무지가 나타난다”며, 권력과 지식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난 시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권력과 무지의 관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탈진실’ 시대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곧 “인지적 무기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더 나아가 무엇을 아는 척하고 무엇을 모르는 척하는가 등을 놓고 겪게 되는 온갖 난점들을 훑어본다.
레나타 살레츨 류블랴나대학 교수가 지난 2016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제6회 도시인문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식 기반 경제가 강조되는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 지식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지은이는 ‘이케아화’라는 개념으로 지금 시대의 한 특징을 표현하는데, 이는 “온라인 정보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 덕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모든 것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케아화’의 부정적인 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부족을 인정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지식 경제가 활용하는 세련된 테크놀로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반면, 테크놀로지는 사용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기업으로 가져온다.
의료 영역에서, 또 데이터 수집에서 자리잡은 ‘고지 후 동의’라는 절차는 우리가 오늘날 앎과 관련해 빠지게 된 난점을 잘 보여주는 ‘무지의 전략’이라고 지은이는 지적한다. 의료진과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은 개인에게 온갖 정보들을 고지하며 ‘동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정보를 잘 소화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합리적 주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이를 거부하면 서비스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지은이는 코로나19, 유전학의 발달, 전쟁 등 다양한 현장으로부터 온갖 무지의 전략들을 읽어낸다. 무지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손쉽게 가르지 않고, “알지 못함을 아는 상태로부터 진정한 이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오래된 가르침을 은근히 제시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