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맥도날드
한은형 지음 l 문학동네 l 1만4500원
저녁 일곱시면 특정 패스트푸드점에 나타나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그곳에서 밤을 새우는 할머니가 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검정색 가방에 쇼핑백 두 개를 지닌 그이는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지는 않고 신문과 성경책을 읽고 때로 졸다가는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매장의 누구도 그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고 그이 역시 점원이나 다른 손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할 일을 한다.
한은형의 소설 <레이디 맥도날드>는 2010년대 초 방송에도 소개되었던 칠십 대 중반 여성 ‘노숙인’의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집이 없어 바깥에서 밤을 보낸다는 뜻에서 주인공 김윤자를 ‘노숙인’이라고 칭했지만, 그 자신은 그런 호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김윤자는 노숙자와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더럽고, 냄새가 나고, 거리에서 잔 표시가 난다. 책이나 신문 같은 것도 읽지 않는다.”
김윤자는 비록 집이 없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보내기는 하지만, 자신을 노숙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주 씻지는 못해도 가능한 한 몸을 깨끗이 관리하려 하고, 신문과 성경을 읽고 무료 영화를 보는 등 지적 자극과 문화 향수에도 적극적이다. 그를 취재하고자 접근한 방송 피디가 햄버거를 드시겠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이런 인조고기, 가공육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만.” 햄버거의 원료가 가공육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김윤자 할머니의 엄격한 자기 관리와 자존심 그리고 딱 부러지는 예의범절을 보여준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거는 마이 시크릿”, “오늘이 튜즈데이죠?”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말버릇을 우스꽝스러운 허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허세만은 아니라는 사실 역시 독자는 차차 알게 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새우는 여성 노인 이야기를 쓴 소설 <레이디 맥도날드>의 작가 한은형. “나는 레이디가 내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가져온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작가의 말’에 썼다. 목정욱 제공
<레이디 맥도날드>는 공중파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방송을 위해 김윤자를 취재하는 신중호 피디와 김윤자 자신의 시점을 오가며 ‘노숙자답지 않은 노숙자’ 할머니의 숨은 진실을 들추어낸다. 소설은 눈이 쌓인 벤치에 꼿꼿이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김윤자를 환경미화원이 발견하는 장면으로 문을 연다. 그의 쇼핑백 중 하나에는 “주간지와 경제 신문, 코리아 헤럴드 같은 영자 신문과 성경, 그리고 열 권가량의 수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들은 김윤자가 틈틈이 적은 일기인데, 그 마지막 문장이 이러하다. “운을 쌓지 못했다. 그래서 패배했다.”
“광장에 서서 발가벗고 싶지 않”다면서도 김윤자가 신중호의 취재에 응한 까닭은 “이야기가 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방송용 이야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피디 선생에게 하고 싶”어서 김윤자는 신중호를 만나고 그의 카메라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그렇게 촬영이 이어지면서 김윤자의 과거와 현재가 좀 더 선명해진다. 김윤자는 번듯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괜찮은 직장을 다니며 높은 수입을 올린 바도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명예퇴직 하고 평생의 의지처와도 같았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결혼도 하지 않은 그는 모아 놓은 돈을 까먹기만 하다가 결국 방 한 칸 없이 나앉기에 이른 것.
소설이 진행되면서 드러나거니와, 밤을 보낸 서울 정동의 패스트푸드점을 나온 김윤자는 근처의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며 앉은 채로 잠깐씩 잠을 청한다. 낮에는 안국동의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으로 장소를 옮겨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가까운 일본문화원에서 무료 영화를 보기도 한다. 밤과 낮의 많은 시간을 패스트푸드점에서 보내면서도 김윤자는 그곳에서 음식은 물론 음료도 사 먹지 않는다. 약간의 후원금을 사용해 그가 커피를 마시는 곳은 광화문의 커피 전문점인데, 패스트푸드점의 커피가 밍밍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신중호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는 “나는 이왕이면 멋있고 아름다운 게 좋아요”라며 미적인 감식안과 취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식안과 취향이 곧 그에 적합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김윤자의 자기 평가와 기대를 바깥 세계는 존중해 주지 않았다. “김윤자가 인생에서 잃는 게 많아질수록 인생에 거는 기대는 커졌으므로 그 기대가 충족될 확률은 점점 줄어들었다.” 일종의 악순환이 김윤자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
방송이 나간 뒤 그의 학교 친구들과 과거 직장 동료들이 김윤자를 찾아왔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김윤자는 모두 거절했다. 다만 고등학교 동창들이 준 돈 봉투만은 받았는데, 그 돈으로 김윤자가 한 일이야말로 지극히 김윤자답다 하겠다. 고급 호텔에 하루 투숙하며 그에 딸린 사우나를 이용하는 게 그것.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서 깨끗하게 죽는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죽음을 예감한 그는 노숙 생활 동안 그토록 꿈꾸었던 목욕을 했고, 그 뒤에 눈 쌓인 벤치에 앉아 죽음을 맞는다.
김윤자의 특별한 삶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신중호 피디는 속편을 거듭 제작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시청률로 상징되는 대중의 관심에는 그림자도 없지 않아서 이 방송을 ‘불행 포르노’라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신중호 자신 ‘이걸 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나?’라는 의문과 “레이디(=김윤자)의 불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 말미에서 그는 김윤자를 “매일같이 자신의 일상을 성실히 반복했던 근로자”이자 “위대한 퍼포머”로 재평가하기에 이른다. 소설의 주제가 담긴 대목이다.
“레이디의 집은 거리였다. 거리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이 레이디의 응접실이었고, 교회가 레이디의 침실이었다. 패스트푸드점 열 시간, 교회 네 시간, 커피 전문점 네 시간. 매일같이 레이디는 이곳들을 오가며 자신의 삶을 살았다. (…) 레이디는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의미를 만들었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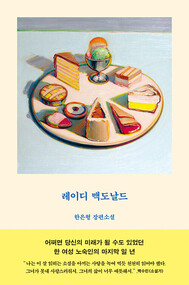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