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이었던 미국과 멕시코 사이 높게 세운 ‘국경 장벽’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미국 백악관 누리집
거대한 반격
포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파올로 제르바우도 지음, 남상백 옮김 l 다른백년 l 2만2000원
주권, 보호, 통제….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된 포퓰리즘의 언어에서 부쩍 이런 말들이 늘었다. 영국 ‘브렉시트’ 캠페인은 경제에 대한 “통제를 되찾자”(take back control)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선을 높이 쌓겠다는 반(反)이민정책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파 진영에서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각종 사회주의 운동은 식량·에너지주권 등의 개념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라고 요구해왔고, 스페인 포데모스 등 ‘좌파 포퓰리즘’도 이를 계승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등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 돌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얼마나 이전보다 강조됐는지 떠올려보라.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소속 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회학자 파올로 제르바우도(43)는 <거대한 반격>에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경제영역에 더욱 강하게 개입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는 ‘신국가주의’(neo-statism)”가 부상하고 있다고 짚는다. 지은이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평을 탐색하고 이에 바탕한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격’(recoil)은 좀 더 정확히는 총을 쐈을 때 발생하는 되튐 현상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지난 세기를 장악했던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에 대한 되튐, 또는 반작용을 겪고 있다는 비유다. 이 단어를 헤겔로부터 가져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끝없이 ‘외부화’를 지향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되튐 현상으로 다시금 자신의 내부로 몰두하는 ‘내부화’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의미가 담겼다.
영국 ‘브렉시트’ 결정의 주역이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19년 총선 당시 만들어 활용했던 온라인 홍보물. “우리의 국경을 통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보리스 존슨 트위터 갈무리
지은이는 냉전 종식 이후 전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교리의 핵심을 ‘외부화’, 또는 ‘외향정치’(exopolitics)로 풀이한다. 신자유주의는 원심력을 무한히 긍정하는 논리로,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 도입된 여러 가지 경영혁신, 외주화, 하청계약, 사업시설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근거를 제공”했다. 국가·사회 등 전후 케인스주의가 보장했던 것들이 내팽개쳐진 자리를 신성불가침한 자유, 기회, 유연성, 개방성, 열망, 기업가 정신 등이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몸부림만 남기는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사회적 불평등의 극심한 확대였다. 외부화의 가장 두드러진 희생자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 본질상 장소, 곧 인민이 집단적 통제를 주장하는 특정한 영토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2010년대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의 변증법적 부정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외부화 압력은 “스스로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인식, 그리고 광장공포증, 곧 개방된 공간에 대한 공포라 말할 수 있는 인식을 낳는 수많은 경제 흐름에 노출”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포퓰리즘으로 이끌리도록 만들었다. 다만 지은이는 포퓰리즘을 어떤 단일한 정치적 지향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을 포착해낸 일종의 ‘국면’이라고 본다. 포퓰리즘 지향들은 각각 그와 결부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에겐 “포퓰리즘 국면에서 새롭게 나타난 구체적인 정치적 태도와 새로운 계급 정렬을 포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핵심에는 ‘내부’를 향한 관심, 곧 내부성과 안전성이라는 감각을 재건하려는 ‘내향정치’(endopolitics)가 있다. 오늘날 정치 지평을 도식적으로 보자면, 내향정치의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좌파’, 그리고 붕괴 뒤에도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중도파’ 등이 주요 행위자로 꼽힌다.
소셜미디어, 포퓰리즘, 정치 커뮤니케이션 등을 연구하는 파올로 제르바우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소속 디지털문화연구소장. 유튜브 갈무리
내향정치의 성격을 지닌 정치적 대응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용어는 ‘주권’, 그리고 주권의 수단과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보호’와 ‘통제’ 등 세 가지다. 좌우파 내향정치 모두 신자유주의가 그토록 파괴하고자 했던, “정치권력의 중심이 국가권력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집단적 애착의 중심점이 되고 정치공동체의 정박점이 되는 장소권력을 탈환하는” 주권의 회복을 과제로 삼는다. 다만 우파가 토착민의 우위를 앞세워 경계를 굳건히 세우려는 ‘영토주권’을 추구한다면, 좌파는 주권의 내적인 측면, 곧 “사적 권력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앞세우는 ‘인민주권’을 추구한다. 우파는 소수자·이민자 등을 공격하여 토착민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식의 ‘보호’와 ‘통제’를 추구하지만, 좌파는 사회적 돌봄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보호’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민주적인 ‘통제’를 되찾으려 한다. 전반적으로 우파가 단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관용만을 전복하려 한다면, 좌파는 그것의 사회경제적 전제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면에서 지은이는 좌파 내향정치의 성격을 ‘사회보호주의’로, 우파 내향정치의 성격은 ‘유산자 보호주의’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지은이의 주장은 흔히 좌파가 우파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경계해온 애국주의를 진보적으로 탈환해 ‘민주적 애국주의’를 추구해보자는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코즈모폴리턴 자유주의자와 급진 좌파주의자는 탈영토화된 글로벌 민주주의, 곧 국경 없는 세계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그에 대한 ‘거대한 반격’이 말해주듯, 정치공동체의 장소적이고 영토적인 성격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1886~1964)의 논의를 빌리자면, 우리는 생산을 최적화하겠다는 ‘개선’(경제 개발)이 온통 파괴해버린 ‘거주’(삶의 터전)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서 있다. 물론 정치공동체의 장소성과 영토성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진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지은이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지닌 보호지향적 성격과 민족주의가 지닌 공격적 성격 사이의 대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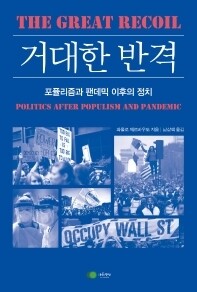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