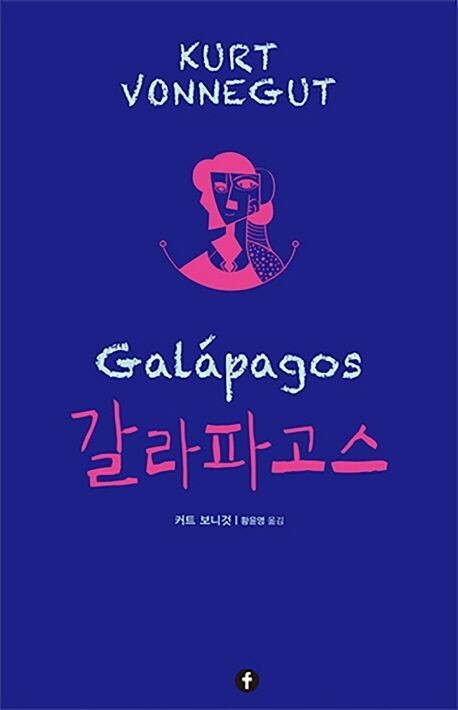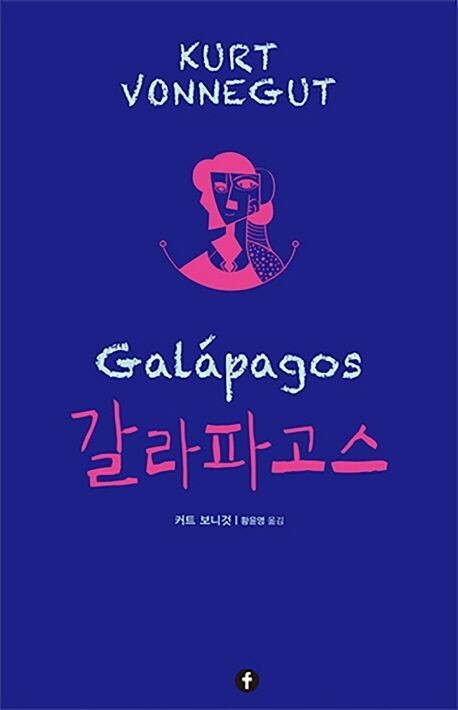“그 엄청나게 커다란 뇌만 뺀다면, 이곳은 아주 무해한 행성이었다.”
커트 보니것의 장편소설 <갈라파고스>(1985)는 1986년 이후로도 백만 년이나 존재해온 유령의 자문자답으로 시작합니다. 어쩌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한 섬에 표류하여 인류의 절멸 뒤에도 살아남게 된 소수의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지독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소설 속에서 ‘지나치게 큰 인간의 뇌’(실제론 1.4㎏ 정도지만 소설에선 과장하여 3㎏짜리라 합니다)는 쉴 새 없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큰 뇌를 지녔던 백만 년 전 인간들이 벌인 짓거리들이란, 금융위기나 전쟁 등 “자기 자신과 서로에게 그리고 살아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뿐이었다죠. 당시 기술의 결정체로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담은 휴대용 통역기 ‘만다락스’는 표류한 인간들 손에 쥐어져 섬에까지 따라가는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상황과 동떨어진(어떤 측면에선 잘 맞아떨어지는) ‘명언’들만 쏟아냅니다.
섬에 갇힌 소수의 인류는 백만 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물로 둘러싸인 환경 속 자연 선택은 바로 “물고기를 가장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헤엄치기 좋으려면 손발이 지느러미처럼 바뀌어야 했고, 물고기를 잘 붙들려면 손보다 턱이 더 발달해야 했습니다. 머리 역시 유선형으로 진화했는데, 그러려면 두개골과 그 속에 든 뇌는 과거와 달리 아주 작아져야 했답니다.
서양 천 년의 역사를 다룬 책 <변화의 세기>를 보다가 문득 자문해봅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 그것도 지표면에서 고작 2~3킬로미터의 ‘임계영역’에 격리된 우리는 미래에 과연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최원형 책지성팀장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