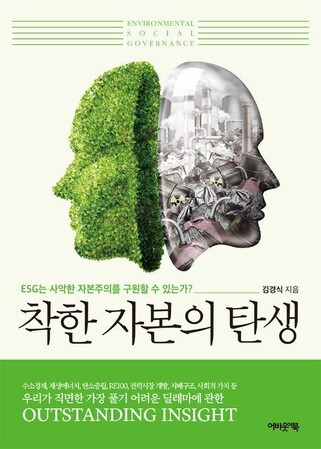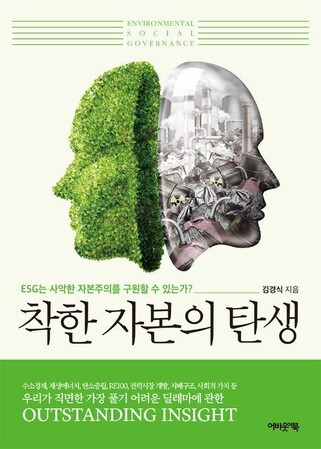▶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 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2021년 기준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발전(35.1%), 2위는 철강(19.7%)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다루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소재가 우리 사회의 필수 기간 상품인 전기와 ‘산업의 쌀’ 철이다. 30여 년간 제철업에 종사해온 지은이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영역(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전력요금, 전력 수요공급,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여러 문제를 실무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고민하고 정책적 해법을 궁리해왔다.
그는 기업에서 과장급으로 일하던 2003년 계간 <창작과비평>에 ‘한전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환경·에너지·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나아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평생 해야 할 임무를 설정한 셈이다. 지금은 독립연구실 ‘고철(高哲·古鐵)연구소’를 차리고 여러 종합일간지에 글을 쓰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는 전기와 철의 생산·소비 시장구조를 진단하면서 한국전력·포스코·현대제철 등 기업과 산업의 현실 풍경을 흥미롭게 해부한다. 우리 시대의 기업·사회 정신인 한국 ESG 생태계를 진화시키는 현실적 제언을 하는 게 그 목적이다. 두 상품을 놓고 저자는 유효한 ‘경쟁’과 가격신호가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두 방안을 목표로 설정해 제언을 모색한다. 그렇다고 ‘민영화’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유효 경쟁체제 구축과 시장 형성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소비자·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사회적책임’, 이사회 등 기업 안팎의 ‘지배구조’(거버넌스)와 밀접하게 연계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경쟁과 시장이 근간이 돼야 하는 까닭은 뭘까?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난 20년간 추진한 수소경제 정책은 신뢰하기 어렵다. 각국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로 쇳물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하려 경쟁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만 약 68조원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는 제자리걸음이고, 세계 최강의 수소경제를 외치지만 실질적 기술 수준은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그린수소를 생산할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왜 없을까?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없어서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수요 부족) 것은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해 요금이 점차 비싸지기 때문이다. 한전 송·배전망 개방(민영화가 아니라 돈을 받고 민간에 빌려주는 방식)을 통한 ‘경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경쟁과 시장이 작동해야 민간 발전사 사이에 판매 경쟁이 벌어지고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나면서 저탄소 기술 확보를 앞당기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실질적 유인이 제공될 수 있다.”
요컨대 지은이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기보다 생각을 반대로 바꿔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먹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창한다. 전기 소매 경쟁 도입 등 판매시장을 활성화하면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가 공급을 자극해 각종 기자재와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책 곳곳에 흥미롭게 배치된 역사적 탐구는 우리 시대의 문제와 현상을 역사적 시야에서 조망하도록 돕는다. 1962년 미국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이 펴낸 <침묵의 봄>, 1901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독점금지법 부활, 2001년 노르웨이 정유업체 에소(ESSO)의 부사장이 설파한 ESG 경영의 본질, 1887년 경북궁 건청궁을 밝힌 백열전등, 1709년 영국 제철업자 에이브러햄 다비의 인류 최초 코크스 제철 실험 성공 등이 그것이다.
2003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문을 썼던 지은이는 20년 만에 또 제안한다. “분할한 발전 5개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 통합을 통해 석탄발전소 퇴출과 LNG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고, 발전 5사에 분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 또 미숙련·저임금·고용불안을 방치해온 외주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진정한 ESG 경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 혹은 훌륭한 정부가 존재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공익적)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갖고 (ESG에) 뛰어들어야 한다.”
조계완 <한겨레>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