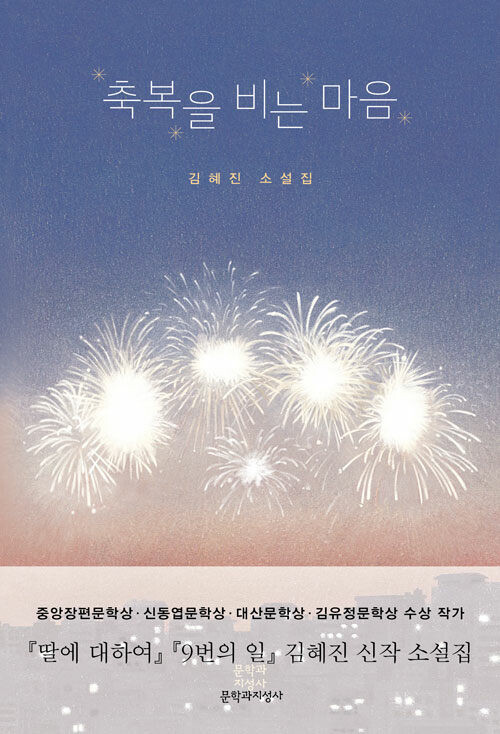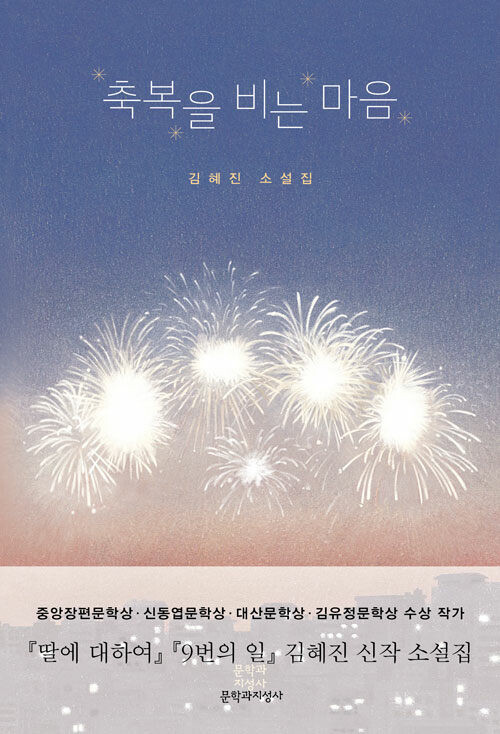세번째 소설집 ‘축복을 비는 마음’을 내놓은 김혜진 작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축복을 비는 마음
김혜진 지음 l 문학과지성사 l 1만6000원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의 도리 없는 택일이 이 시대 서민들의 주거권 아닐까. 이 불편한 가설은 김혜진(40)의 소설집 ‘축복을 비는 마음’을 통해 입증된다. 전체가 집의, 집에 의한, 집을 위한 이야기다.
‘20세기 아이’의 주인공은 초등학생 세미다. 동네가 낡았다. 지난해엔 물난리가 났다. 집들은 돌아보면 조금씩 더 작아져 있다. 세미의 집도 그렇다. 실은 세미의 집도 아니다. 할아버지 집이다. 아니, 할아버지도 아주 오래 세 든 집이다. 엄마가 몇달만 머물겠다고 언니와 자신을 데리고 와선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세미는 어렸을 때 놀러 와 쌓은 기억과 달라진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 “식구들을 점점 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만드는 이 집이 미워 죽을 것 같다.” 그러던 중 집을 보러 중년 여성이 찾아온다. 불만부터 토하기 바빴던 ‘임장객’들과 달리 집마당 한편의 동백나무를 알아본다. 세미와 대화를 나눠준다. 여자는 세미에게 말한다. “네 덕분에 이 집이 아주 환하구나.”
세미는 할아버지를 졸라 물 새는 옥상을 고치자 한다. 방수 페인트도 칠해본다. 그날 밤부터 동네엔 비가 퍼부었다. 다음 주말 재방문한 중년 여성은 세미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개발될 곳인가 투자할 집인가 따지는 데 여념이 없다. 어수선해진 옥상을 보고 표정이 굳어진다. 세미의 동네는 다시 사람들 찾지 않고 조용해진다. 마침 동백도 피었으나 냄새가 없다.
맞다, 좋은 냄새가 났던 중년 여성이 첫 임장 때 데려온 세미 또래 딸아이가 세미에게 한 말이 있었다. “저 다리 건너면 21세기, 여긴 20세기”라고. 세미는 병 든 집을 고칠 수도, 떠날 수도 없다. 냄새도 추억도 지워진 20세기에 갇혀, 황량한 마음들만 겨우 품는 집이 허락될 뿐이다.
세미의 엄마처럼 ‘미애’(단편) 또한 6살 해민과 주거빈곤에 갇혀 있다. 한겨울 코로나 국면에서, 일자리와 새집을 구해야 하기에 아이를 돌봐줄 이가 절박했다. 다행히 선(해야 한다고 노력)한 이웃 송선우를 만나 작정하듯 언니라 부르며 여러 신세를 진다. 하지만 관계는 곧 틀어진다. 선우는 해민과 미애에 대한 혐오, 차별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미애의 태도가 서글프다. 되레 선우에게 사과하고 매달린다.
미애처럼 순미 또한 임차인으로 임대인 만옥을 언니라 부르며 돈독한 자매애를 쌓는다. 재개발 기대로 산 낡은 ‘목화맨션’(단편)에 8년가량 순미를 들였고 순미 또한 제 처지에 그만한 집이 없었으나, 결국 임대-임차의 신분 차이로 결별한다. 모두 황폐해지고 마는 형상이다.
특히 젠더, 돌봄, 관계를 상처 내는 ‘집’의 만행은 논리나 현상이 아니라, 서정성으로 더 명료해진다. 등단 11년차 김혜진이 줄곧 사회문제를 ‘입증’한 방식이다. 길가에 버려진 폐가구를 보면 “어떤 집”일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상상한다고 작가가 한겨레21에 말한 때가 3년 전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 완성한 단편 8편을 꼬박 담았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