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은 권력이다’ 펴낸 박정자 교수
인터뷰 / ‘시선은 권력이다’ 펴낸 박정자 교수
시선 비대칭성은 권력관계의 반영
현대엔 전자장치가 대신하는 감시와
신상정보 등 내주는 개인이 상호작용
“감시 인지해지해야 권력이 함부로 못해” 이미지 시대라고 한다. 지하철역만 가보자. 부쩍 늘어난 광고 이미지가 빼곡하다.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관은 눈이다. 하지만 눈으로는 불충분하다. 바라보는 행위, 시선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 정년퇴임하는 박정자 상명대 불어교육과 교수(사진)는 최근 펴낸 〈시선은 권력이다〉(기파랑)에서 바로 시선이 함의하는 바를 탐구하고 있다. ‘권력으로서 시선’은 사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바라보고 바라보이는 시선의 비대칭성에서 지배·종속의 관계를 간파한 이후 매우 낯익은 명제가 됐다.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상상적인 교도소 설계도인 파놉티콘은 이 명제를 실증하는 대표적인 보기다. 이 공간에서 간수는 자신의 존재 유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시선과 빛에 노출된 수인들에게 자기만의 공간은 상상 속에만 있다. “시선의 비대칭성이란 사실 권력관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남학생이 그러더군요. 예비군 훈련장에선 교관이 어떤 형태의 시선을 보내더라도 대원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파놉티콘에서 시선이 감시의 기제였다면 현대는 전자장치의 눈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다. 정보가 시선의 구실을 대신한 것이다. 전자우편이 세상에 공개된 신정아 사건에서 박 교수는 “내 정보를 내가 100%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평범한 통화기록만으로도 “미시권력의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 든다는 것이다. 현대의 전자 파놉티콘 감시는 또한 전지구적이고 물샐틈이 없다. 개인들이 권력의 아귀 속에 꼼짝없이 속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개인들은 기업의 멤버십 카드 혜택을 얻거나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강제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뤄지는 통제의 네트워크가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는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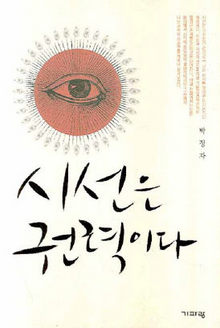 박 교수는 ‘가시성의 역전 현상’이란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다. 푸코의 시대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곧 가시성이 권력이었다면 요즘에는 ‘바라봄’과 ‘바라보여짐’이 서로 거부감 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대 아래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존재인 연예인들이 갖는 권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푸코의 권력이론을 무색게하는 새로운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왕조시대는 스펙터클의 시대였다. 사열식에서 수만명의 병사는 왕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근대적 감옥이 등장한 이후에는 한 사람이 만인을 보는 감시 시대가 되었다. 그는 지금을 스펙터클과 감시의 융합 시대로 일렀다. 새로운 권력 이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감시 사회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분열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개인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때 (권력도 감시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박 교수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이 사유하는 ‘나와 타자의 관계성’을 비교하며 이를 자신이 펼치는 시선론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인간이 상호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헤겔의 생각보다는 나와 타자 사이의 동시적 상호인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르트르의 생각이 더 옳아 보인다고 밝혔다. 남이 자기를 보듯이 나를 보고, 또 나도 나를 보듯이 남을 본다는 전제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그가 시선의 비대칭성에 30년 가까이 관심을 갖는 이유로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 교수는 ‘가시성의 역전 현상’이란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다. 푸코의 시대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곧 가시성이 권력이었다면 요즘에는 ‘바라봄’과 ‘바라보여짐’이 서로 거부감 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대 아래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존재인 연예인들이 갖는 권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푸코의 권력이론을 무색게하는 새로운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왕조시대는 스펙터클의 시대였다. 사열식에서 수만명의 병사는 왕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근대적 감옥이 등장한 이후에는 한 사람이 만인을 보는 감시 시대가 되었다. 그는 지금을 스펙터클과 감시의 융합 시대로 일렀다. 새로운 권력 이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감시 사회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분열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개인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때 (권력도 감시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박 교수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이 사유하는 ‘나와 타자의 관계성’을 비교하며 이를 자신이 펼치는 시선론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인간이 상호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헤겔의 생각보다는 나와 타자 사이의 동시적 상호인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르트르의 생각이 더 옳아 보인다고 밝혔다. 남이 자기를 보듯이 나를 보고, 또 나도 나를 보듯이 남을 본다는 전제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그가 시선의 비대칭성에 30년 가까이 관심을 갖는 이유로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현대엔 전자장치가 대신하는 감시와
신상정보 등 내주는 개인이 상호작용
“감시 인지해지해야 권력이 함부로 못해” 이미지 시대라고 한다. 지하철역만 가보자. 부쩍 늘어난 광고 이미지가 빼곡하다.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관은 눈이다. 하지만 눈으로는 불충분하다. 바라보는 행위, 시선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 정년퇴임하는 박정자 상명대 불어교육과 교수(사진)는 최근 펴낸 〈시선은 권력이다〉(기파랑)에서 바로 시선이 함의하는 바를 탐구하고 있다. ‘권력으로서 시선’은 사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바라보고 바라보이는 시선의 비대칭성에서 지배·종속의 관계를 간파한 이후 매우 낯익은 명제가 됐다.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상상적인 교도소 설계도인 파놉티콘은 이 명제를 실증하는 대표적인 보기다. 이 공간에서 간수는 자신의 존재 유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시선과 빛에 노출된 수인들에게 자기만의 공간은 상상 속에만 있다. “시선의 비대칭성이란 사실 권력관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남학생이 그러더군요. 예비군 훈련장에선 교관이 어떤 형태의 시선을 보내더라도 대원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파놉티콘에서 시선이 감시의 기제였다면 현대는 전자장치의 눈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다. 정보가 시선의 구실을 대신한 것이다. 전자우편이 세상에 공개된 신정아 사건에서 박 교수는 “내 정보를 내가 100%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평범한 통화기록만으로도 “미시권력의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 든다는 것이다. 현대의 전자 파놉티콘 감시는 또한 전지구적이고 물샐틈이 없다. 개인들이 권력의 아귀 속에 꼼짝없이 속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개인들은 기업의 멤버십 카드 혜택을 얻거나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강제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뤄지는 통제의 네트워크가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그는 정리했다.
〈시선은 권력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