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 도시에 사는 스님의 ‘얼굴 부자론’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스님은 ‘수도승’이다. ‘수도에 사는’ 승려라는 뜻이다. 산승으로 오래 살았지만, 최근 몇 해는 서울 조계사에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여느 도시 사람 같은 삶을 체험 중이다. 불교와 ‘속세’의 소통을 매개하는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진 셈이다.
이 책은 지난 20여년 글쓰기로 표현해 온 성찰의 기록이다. 원철 스님의 시선은 스스로를 향한 반성부터 종교에 대한 자성까지 종횡무진 오간다. 자기 키보다 큰 널빤지를 등에 지고 옮기다 보면, 정면 외에는 주위를 돌아보기 어렵게 된다며, 천주교의 줄기세포, 개신교의 사학법, 불교의 문화재 관람료 시각은 각 종교가 짊어진 널빤지라고 꼬집는다. 어느 순간 젊은이들이 말을 걸어주지 않는 현실에 서글퍼하다가도, ‘가을에 캔 고구마는 봄에 씨앗이 된다’며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갈라져 버린 서울 강북과 강남을 바라보며, “강북에선 탱자되고 강남에선 귤이 되지만, 봄이 오면 모두 함께 같은 꽃을 피운다”는 시구를 가만히 되뇌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뜻하는 ‘선’이 ‘젠 스타일’이라는 유행으로 변질된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얼굴 가난만큼 서러운 게 없다”며 인생 공부를 강조하는 이 책은 불교철학과 시공간을 뛰어넘는 선사 이야기를 두루 들려주며, ‘투명하고 맑은 얼굴’을 만드는 지혜를 선사한다. 원철 지음/뜰ㆍ1만원.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 팍팍한 삶, 철학이 더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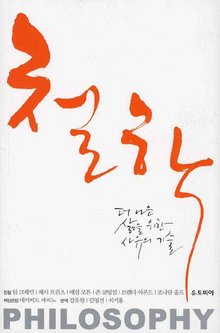 〈철학-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
〈철학-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걸까?” 취업에, 재테크에 가뜩이나 먹고살 고민하기도 바쁜데 ‘웬 뜬구름 잡는 소리냐’, 지청구 듣기 딱 좋은 질문이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이 천착해온 근원적 질문들이 찬밥도 아닌 쉰밥 취급받는 이 시대에 또 한 권의 철학 책이 나왔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이라는 부제는 실용 만능 시대의 냄새를 풍기는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철학의 안간힘으로도 비친다. 플라톤부터 미셸 푸코까지, 서양 철학자들의 고민을 주욱 훑어 대항목 121가지와 소항목 73가지로 정리한 방식은 기존의 철학 입문서들과 비슷하다. ‘실재가, 양심이 무엇이냐’는 추상적 주제에 숨막혀 할 독자들을 위해, 사형제도나 세계화, 자유무역 등의 실용적 선택들이 어떻게 철학과 닿아 있는지를 컬러사진과 곁들여 보여준 점은 친절하다. 최근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선 다시 철학 공부가 인기란다. 로스쿨 진학 등에 유용한 구술능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다른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나. 꼭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해도, 철학 책 한 권 곁에 둬도 좋을 것 같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내가 왜 사나’에 대한 답변이 간절해지는 법. 데이비드 파피노 책임편집ㆍ강유원 김영건 석기용 옮김/유토피아ㆍ3만5000원.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 해박한 지식 바탕 ‘환경재앙’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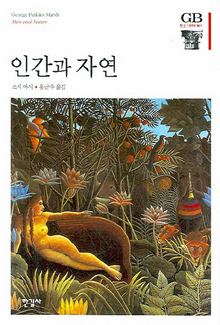 〈인간과 자연〉
조지 마시(1801~1882)는 변호사이자 정치가, 언어학자, 전문 외교관 등으로 활동했던 ‘다 빈치적’ 인물이다. 그가 1864년 쓴 이 책은 가용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자만심에 시달리던 당대인들의 환상을 바로잡고,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한 고전으로 꼽힌다. 전문 생태학자가 아닌 그는 상식의 눈으로, 인간이 자연의 위력에 복종하는 미물이 아니라 마음먹은 방향으로 자연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경고한다. 특히 그는 환경 악화를 야기하는 가장 파괴적인 사안으로 삼림 파괴를 꼽으며 동서고금을 넘나든 풍부한 사례를 제시한다. 엮은이는 마시가 “아담 스미스가 정치경제학에서,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에서 달성했던 것처럼, 접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종합했다”고 평가한다. 책이 나온 지 8년 만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되게 된다. 무엇보다 측량조차 덜된 광활한 미개척지를 지닌, 19세기 미국에서 살던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것이 부럽다. 환경 오염에 시달리면서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한 2008넌 한국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조지 마시 지음ㆍ홍금수 옮김/한길사ㆍ2만5000원.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인간과 자연〉
조지 마시(1801~1882)는 변호사이자 정치가, 언어학자, 전문 외교관 등으로 활동했던 ‘다 빈치적’ 인물이다. 그가 1864년 쓴 이 책은 가용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자만심에 시달리던 당대인들의 환상을 바로잡고,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한 고전으로 꼽힌다. 전문 생태학자가 아닌 그는 상식의 눈으로, 인간이 자연의 위력에 복종하는 미물이 아니라 마음먹은 방향으로 자연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경고한다. 특히 그는 환경 악화를 야기하는 가장 파괴적인 사안으로 삼림 파괴를 꼽으며 동서고금을 넘나든 풍부한 사례를 제시한다. 엮은이는 마시가 “아담 스미스가 정치경제학에서,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에서 달성했던 것처럼, 접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종합했다”고 평가한다. 책이 나온 지 8년 만에 미국에서 세계 최초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되게 된다. 무엇보다 측량조차 덜된 광활한 미개척지를 지닌, 19세기 미국에서 살던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것이 부럽다. 환경 오염에 시달리면서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한 2008넌 한국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조지 마시 지음ㆍ홍금수 옮김/한길사ㆍ2만5000원.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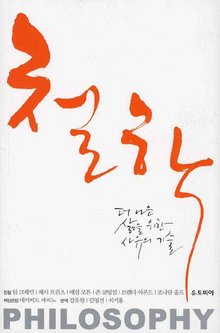
〈철학-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걸까?” 취업에, 재테크에 가뜩이나 먹고살 고민하기도 바쁜데 ‘웬 뜬구름 잡는 소리냐’, 지청구 듣기 딱 좋은 질문이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이 천착해온 근원적 질문들이 찬밥도 아닌 쉰밥 취급받는 이 시대에 또 한 권의 철학 책이 나왔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유의 ‘기술’이라는 부제는 실용 만능 시대의 냄새를 풍기는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철학의 안간힘으로도 비친다. 플라톤부터 미셸 푸코까지, 서양 철학자들의 고민을 주욱 훑어 대항목 121가지와 소항목 73가지로 정리한 방식은 기존의 철학 입문서들과 비슷하다. ‘실재가, 양심이 무엇이냐’는 추상적 주제에 숨막혀 할 독자들을 위해, 사형제도나 세계화, 자유무역 등의 실용적 선택들이 어떻게 철학과 닿아 있는지를 컬러사진과 곁들여 보여준 점은 친절하다. 최근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선 다시 철학 공부가 인기란다. 로스쿨 진학 등에 유용한 구술능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다른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나. 꼭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해도, 철학 책 한 권 곁에 둬도 좋을 것 같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내가 왜 사나’에 대한 답변이 간절해지는 법. 데이비드 파피노 책임편집ㆍ강유원 김영건 석기용 옮김/유토피아ㆍ3만5000원.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 해박한 지식 바탕 ‘환경재앙’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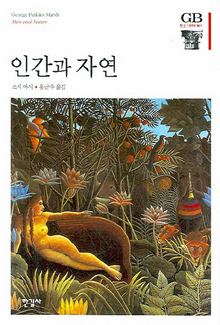
〈인간과 자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