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안전먹거리 장터인 ‘파머스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채소와 과일을 고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자연과 함께한 1년〉
바버라 킹솔버 외 지음·정병선 옮김/한겨레출판·2만5000원
미국판 ‘신토불이’ 실천한 가족
시골농장에서 지낸 1년의 기록 식품산업 고발 ‘지역먹거리 운동’
“소비자 각성해야 지속가능한 삶” “이곳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려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1871)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한 말이다. ‘이곳’은 어디인가. 멈춤이 처짐이므로 달려야 제자리를 지키는 ‘이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지구다. 진화와 변화는 이 순간에도 줄달음친다. 진화를 모른대서, 진화를 인정 않는대서 자연은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 천지불인(天地不仁). 자연은 인간사 인지상정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탓할 것도 욕망이요, 벗할 것도 욕망이다. 문제는 욕망의 방향이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자연은 인간에게 응답하라 닦아세운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제 몸을 보이며. 여기 응답의 기록이 하나 있다. <자연과 함께한 1년>. 생물학을 전공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버라 킹솔버, 환경학 강사인 남편 스티븐 호프, 대학생 큰딸 카밀과 막둥이 릴리가 주인공이다. 이 책은 “그 출처를 제대로 아는 동물과 식물로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한해살이를 기록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3천㎞를 달려 애팔래치아 남부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한다. 출발점은 이렇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와 농산물에 충성 서약을 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단념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산 채소와 육류가 아무리 유혹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른바 ‘지역 먹을거리 운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바버라 가족이 보낸 1년은 한마디로 ‘없이 사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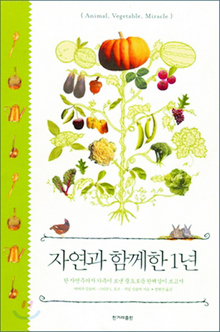 3월 하순, 그들은 아스파라거스 새순을 잘라 먹는 것으로 한해살이의 출발을 기념하는 의식을 치른다. 자연이 제공하는 최고의 엽산과 비타민, 칼륨에다 강력한 항암제인 글루타티온까지 품은 아스파라거스지만, 그것만으로 4월 식탁을 채울 순 없는 노릇이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겨우내 저장해뒀던 근채류, 겨울호박, 말린 토마토에다 온갖 봄나물이 있지 않은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서 길러진 먹을거리로 사는 일이 불안하다면 한해살이 식물 전개도를 그려보면 된다. 4·5월엔 시금치, 케일, 상추, 근대. 그 다음엔 양배추, 브로콜리가 나고, 6·7월이면 애호박, 오이, 피망, 방울토마토가 형형색색 농장과 장터를 장식한다. 8·9월엔 수박, 호박, 멜론이 퍼레이드를 벌인다. 바버라는 묻는다. “우리 가운데 다수가 이런 먹기 방식을 박탈과 궁핍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아무 때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식물학적으로 괴이한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혀 끝 미뢰는 우리를 파괴하는 어뢰다. 보라, 선진국이 상품의 과잉생산을 조장한 뒤 국제시장에서 ‘공정 가격’ 한참 아래로 팔아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훼손하고 제 이익을 불리며, 아마존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수출용 대두만을 재배토록 강요하니 환경은 최악이고 노동은 열악하며 임금은 하락하고 제품 질마저 형편없는 사태를 불렀다는 것은 이미 상식 아닌가. ‘평평한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지구’가 과제다.
이처럼 이 책은 단순한 귀농 일기가 아니라, 먹을거리에 대한 회고록이자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이며 땅에 대한 탐색서이다. 텃밭 가꾸고 빵 굽고 치즈·요구르트 만들고 닭과 칠면조 기르는 일이 실험을 넘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소소한 재밋거리도 건포도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다. 아장걸음 걷는 막내딸 릴리는 제가 키운 닭과 달걀을 팔아 멋진 말을 사겠다고 선포하고, 남편 스티븐은 칠면조 암컷이 난데없이 펼치는 애정 공세에 줄행랑을 놓기도 한다. 이들 가족의 1년치 가계부는 어떨까. 한 사람의 한 끼에 든 돈이 불과 50센트였다. “배급은 없었다. 식사를 거르지도 않았다.” 100평의 텃밭에서 먹을거리를 주로 얻었다 해도 놀라운 수치다. 풍요로운 식탁에다 절약까지 덤으로 얻은 셈이다. 1년 프로젝트의 성과는 분명했다. “지역 먹을거리 운동 실천의 요점은 자신이 속한 먹을거리 영역을 신뢰하는 것이다.”
무감어수 감어인(無鑒於水 鑒於人). 물에 제 낯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제 삶과 맘을 비출 일이다. 킹솔버 가족의 한해살이 이야기야말로 또렷한 거울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은 결코 권력이나 자본의 선의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각성한 소비자들이 떨치고 일어나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게 지은이 주장의 알곡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3월 하순, 그들은 아스파라거스 새순을 잘라 먹는 것으로 한해살이의 출발을 기념하는 의식을 치른다. 자연이 제공하는 최고의 엽산과 비타민, 칼륨에다 강력한 항암제인 글루타티온까지 품은 아스파라거스지만, 그것만으로 4월 식탁을 채울 순 없는 노릇이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겨우내 저장해뒀던 근채류, 겨울호박, 말린 토마토에다 온갖 봄나물이 있지 않은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서 길러진 먹을거리로 사는 일이 불안하다면 한해살이 식물 전개도를 그려보면 된다. 4·5월엔 시금치, 케일, 상추, 근대. 그 다음엔 양배추, 브로콜리가 나고, 6·7월이면 애호박, 오이, 피망, 방울토마토가 형형색색 농장과 장터를 장식한다. 8·9월엔 수박, 호박, 멜론이 퍼레이드를 벌인다. 바버라는 묻는다. “우리 가운데 다수가 이런 먹기 방식을 박탈과 궁핍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아무 때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식물학적으로 괴이한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혀 끝 미뢰는 우리를 파괴하는 어뢰다. 보라, 선진국이 상품의 과잉생산을 조장한 뒤 국제시장에서 ‘공정 가격’ 한참 아래로 팔아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훼손하고 제 이익을 불리며, 아마존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수출용 대두만을 재배토록 강요하니 환경은 최악이고 노동은 열악하며 임금은 하락하고 제품 질마저 형편없는 사태를 불렀다는 것은 이미 상식 아닌가. ‘평평한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균등한 지구’가 과제다.
이처럼 이 책은 단순한 귀농 일기가 아니라, 먹을거리에 대한 회고록이자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이며 땅에 대한 탐색서이다. 텃밭 가꾸고 빵 굽고 치즈·요구르트 만들고 닭과 칠면조 기르는 일이 실험을 넘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소소한 재밋거리도 건포도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다. 아장걸음 걷는 막내딸 릴리는 제가 키운 닭과 달걀을 팔아 멋진 말을 사겠다고 선포하고, 남편 스티븐은 칠면조 암컷이 난데없이 펼치는 애정 공세에 줄행랑을 놓기도 한다. 이들 가족의 1년치 가계부는 어떨까. 한 사람의 한 끼에 든 돈이 불과 50센트였다. “배급은 없었다. 식사를 거르지도 않았다.” 100평의 텃밭에서 먹을거리를 주로 얻었다 해도 놀라운 수치다. 풍요로운 식탁에다 절약까지 덤으로 얻은 셈이다. 1년 프로젝트의 성과는 분명했다. “지역 먹을거리 운동 실천의 요점은 자신이 속한 먹을거리 영역을 신뢰하는 것이다.”
무감어수 감어인(無鑒於水 鑒於人). 물에 제 낯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제 삶과 맘을 비출 일이다. 킹솔버 가족의 한해살이 이야기야말로 또렷한 거울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은 결코 권력이나 자본의 선의로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각성한 소비자들이 떨치고 일어나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게 지은이 주장의 알곡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바버라 킹솔버 외 지음·정병선 옮김/한겨레출판·2만5000원
미국판 ‘신토불이’ 실천한 가족
시골농장에서 지낸 1년의 기록 식품산업 고발 ‘지역먹거리 운동’
“소비자 각성해야 지속가능한 삶” “이곳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려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1871)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한 말이다. ‘이곳’은 어디인가. 멈춤이 처짐이므로 달려야 제자리를 지키는 ‘이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지구다. 진화와 변화는 이 순간에도 줄달음친다. 진화를 모른대서, 진화를 인정 않는대서 자연은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 천지불인(天地不仁). 자연은 인간사 인지상정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탓할 것도 욕망이요, 벗할 것도 욕망이다. 문제는 욕망의 방향이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자연은 인간에게 응답하라 닦아세운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제 몸을 보이며. 여기 응답의 기록이 하나 있다. <자연과 함께한 1년>. 생물학을 전공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버라 킹솔버, 환경학 강사인 남편 스티븐 호프, 대학생 큰딸 카밀과 막둥이 릴리가 주인공이다. 이 책은 “그 출처를 제대로 아는 동물과 식물로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한해살이를 기록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3천㎞를 달려 애팔래치아 남부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한다. 출발점은 이렇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와 농산물에 충성 서약을 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단념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산 채소와 육류가 아무리 유혹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른바 ‘지역 먹을거리 운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바버라 가족이 보낸 1년은 한마디로 ‘없이 사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자연과 함께한 1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