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태(40)
전성태 단편소설집 <늑대>
남과 북, 자본과 핏줄 얽힌 21세기 한반도 자화상 그려
6개월간 체류경험 담아 “작가로서 돌파구 마련” 전성태(40)씨의 세 번째 소설집 <늑대>(창비)에는 단편 열 편이 묶였는데 이 가운데 여섯이 몽골을 무대로 삼은 것이다. 2005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반년 동안 몽골에 체류했던 경험이 낳은 작품들이다. 작가는 “10년 남짓 소설을 쓰다 보니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갔던 것인데, 작품도 건지고 작가로서도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 것일까. 전성태씨의 몽골 소설에 등장하는 한인들 역시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 가령 <목란식당>의 주인공인 여행사 가이드는 “비정한 세계로부터 탈락한 느낌” “어떤 경쟁에서 지레 겁을 먹고 밀려나 이 초원으로 도망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코리언 솔저>의 주인공인 시인은 자신이 “생애에서 가장 북쪽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놓여 있는 북쪽이란 위도상의 지점만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 역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몽골의 한국인들이 유보적이며 심지어 패배주의적인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는 해도, 몽골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등장은 매우 공격적이며 위협적이다. 그 자신 한국인인 <목란식당>의 가이드조차 자신의 고객이 된 보험사 점장들 앞에 어쩐지 수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문명으로 무장하고 초원에 진출한 낯설고 두려운 세력들처럼 여겨졌다.” 같은 한인에게 이런 느낌을 줄 정도라면 몽골인들에게는 어떻겠는가. 표제작 <늑대>는 아스팔트 포장길로 상징되는 ‘자본의 검은 혓바닥’이 몽골의 순정한 초원을 잠식해 들어가는 양상을 인상적으로 그린다. 거구의 수컷 늑대를 사냥하려는 ‘솔롱고스 사업가’는 한국과 자본의 몽골 침탈을 대리하는 인물이다. “국경이 사라지고 그저 자본의 의지만으로 굴러간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나 하는 게 그의 생각이다. 몽골인 촌장은 그의 침탈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익을 챙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놓치지 않는다. 그의 시점으로 서술된 아래의 문장들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몽골 사회에 불어닥친 변화를 슬프지만 아름답게 요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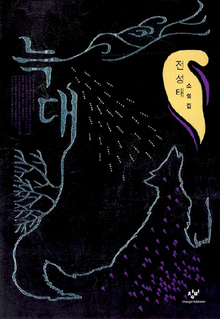 “한잔 수태채가, 게르에서 하룻밤 잠이 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노동이, 늑대를 쫓는 동행이 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게르 천창으로 빛나는 별과 스미는 달빛이, 지나는 바람과 흩날리는 눈이 역시 돈의 현영(現影)처럼 손님들을 끌어왔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단순히 초원과 자본 사이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잠든 골짜기를 깨우는 낡은 총소리로 상징되는 뜻밖의 결말은 여러 겹의 모순이 충돌하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차원을 향해 소설을 열어 놓는다.
“한잔 수태채가, 게르에서 하룻밤 잠이 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노동이, 늑대를 쫓는 동행이 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게르 천창으로 빛나는 별과 스미는 달빛이, 지나는 바람과 흩날리는 눈이 역시 돈의 현영(現影)처럼 손님들을 끌어왔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단순히 초원과 자본 사이의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잠든 골짜기를 깨우는 낡은 총소리로 상징되는 뜻밖의 결말은 여러 겹의 모순이 충돌하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차원을 향해 소설을 열어 놓는다.
몽골에서 부닥치는 것이 초원과 자본만은 아니다. 울란바타르의 북한식당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목란식당>과 <남방식물>에서는 남과 북 또는 자본과 핏줄 사이의 버성김이 부각된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목란은 그냥 식당인데”, 그곳을 찾는 한국인들은 제 나름의 욕망과 회한을 경쟁적으로 그곳에 투사한다. 그 식당을 남과 북 양쪽 체제 대결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극우 기독교도들, 반대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보려는 교민들, 또는 지나간 청춘기를 비춰 줄 향수의 거울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386 세대들이 한데 엉켜서 이곳은 21세기 한반도의 축소판으로 구실한다. 또 하나의 ‘북한 소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탈북을 택한 이들을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전성태 특유의 너스레와 해학이 빛을 발한다. 일쑤 외국인노동자로 오해받곤 하는 작가 자신의 외모를 소재로 삼은 듯한 <이미테이션>은 “어차피 인생은 또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베끼는 거”라 생각하는 가짜 혼혈 주인공을 통해 짝퉁과 다문화의 빛과 그늘을 포착한다. 글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6개월간 체류경험 담아 “작가로서 돌파구 마련” 전성태(40)씨의 세 번째 소설집 <늑대>(창비)에는 단편 열 편이 묶였는데 이 가운데 여섯이 몽골을 무대로 삼은 것이다. 2005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반년 동안 몽골에 체류했던 경험이 낳은 작품들이다. 작가는 “10년 남짓 소설을 쓰다 보니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갔던 것인데, 작품도 건지고 작가로서도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 것일까. 전성태씨의 몽골 소설에 등장하는 한인들 역시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 가령 <목란식당>의 주인공인 여행사 가이드는 “비정한 세계로부터 탈락한 느낌” “어떤 경쟁에서 지레 겁을 먹고 밀려나 이 초원으로 도망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코리언 솔저>의 주인공인 시인은 자신이 “생애에서 가장 북쪽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놓여 있는 북쪽이란 위도상의 지점만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 역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몽골의 한국인들이 유보적이며 심지어 패배주의적인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는 해도, 몽골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등장은 매우 공격적이며 위협적이다. 그 자신 한국인인 <목란식당>의 가이드조차 자신의 고객이 된 보험사 점장들 앞에 어쩐지 수세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문명으로 무장하고 초원에 진출한 낯설고 두려운 세력들처럼 여겨졌다.” 같은 한인에게 이런 느낌을 줄 정도라면 몽골인들에게는 어떻겠는가. 표제작 <늑대>는 아스팔트 포장길로 상징되는 ‘자본의 검은 혓바닥’이 몽골의 순정한 초원을 잠식해 들어가는 양상을 인상적으로 그린다. 거구의 수컷 늑대를 사냥하려는 ‘솔롱고스 사업가’는 한국과 자본의 몽골 침탈을 대리하는 인물이다. “국경이 사라지고 그저 자본의 의지만으로 굴러간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나 하는 게 그의 생각이다. 몽골인 촌장은 그의 침탈에 협조하는 대가로 수익을 챙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놓치지 않는다. 그의 시점으로 서술된 아래의 문장들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몽골 사회에 불어닥친 변화를 슬프지만 아름답게 요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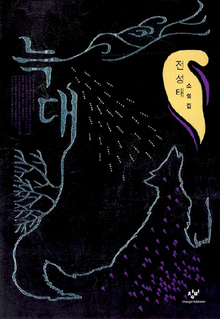
〈늑대〉
몽골에서 부닥치는 것이 초원과 자본만은 아니다. 울란바타르의 북한식당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목란식당>과 <남방식물>에서는 남과 북 또는 자본과 핏줄 사이의 버성김이 부각된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목란은 그냥 식당인데”, 그곳을 찾는 한국인들은 제 나름의 욕망과 회한을 경쟁적으로 그곳에 투사한다. 그 식당을 남과 북 양쪽 체제 대결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극우 기독교도들, 반대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보려는 교민들, 또는 지나간 청춘기를 비춰 줄 향수의 거울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386 세대들이 한데 엉켜서 이곳은 21세기 한반도의 축소판으로 구실한다. 또 하나의 ‘북한 소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탈북을 택한 이들을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전성태 특유의 너스레와 해학이 빛을 발한다. 일쑤 외국인노동자로 오해받곤 하는 작가 자신의 외모를 소재로 삼은 듯한 <이미테이션>은 “어차피 인생은 또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베끼는 거”라 생각하는 가짜 혼혈 주인공을 통해 짝퉁과 다문화의 빛과 그늘을 포착한다. 글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