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쓰레기는 매립된다. 지난 20일 큰비가 내린 뒤 쓰레기로 뒤덮인 충청북도 대청호에서 어민들이 그물망으로 쓰레기 더미를 묶고 있다. 연합뉴스
4% 인구가 쓰레기 30%를 만들어
‘과잉생산’ 자본주의 거대 발명품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규제가 관건
‘과잉생산’ 자본주의 거대 발명품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규제가 관건
〈사라진 내일〉
헤더 로저스 지음·이수영 옮김/삼인·1만4000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한 재 1만6000톤을 실은 화물선 키안시가 1986년 카리브해로 출발했을 때만 해도, 16년 동안 바다를 떠돌게 되리라고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키안시는 처음에는 바하마로 갔으나 바하마 정부는 입항을 거부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파나마를 전전했지만 모든 곳에서 이 유독한 재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키안시는 아이티 근해에 싣고 온 재 3분의 1 분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키안시호가 아이티 근해에 버린 재는 2000년까지 해변에 방치되었다. 결국 펜실베이니아 주가 2002년 아이티 해변에 불법으로 버린 재를 수거한 뒤에야, 키안시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키안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버린 쓰레기를 제3세계 국가들이 날마다 수입한다. 미국은 2002년 중국에 230만톤의 강철과 고철, 약 145억개의 다 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수출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를 잊을지는 몰라도 쓰레기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 내일>은 ‘그 많던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미국의 쓰레기 처리 역사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해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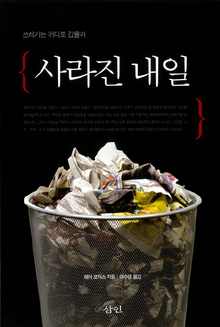 지은이 헤더 로저스는 쓰레기가 ‘현대 산업사회의 발명품’이라고 단언한다. 오늘날 미국은 전세계 인구의 4%밖에 되지 않으면서 전체 쓰레기의 30%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뉴욕 브루클린의 어떤 농부는 “내가 죽으면 농장의 모든 분뇨는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써넣었다. 공산품은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해 온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주부들은 쓰고 남은 기름을 끓여서 비누로 만들었다. 보기 흉해 식탁에 놓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은 찬장에 두고 재활용했다.
미국인의 소비 습관은 2차 세계대전 후 급격히 바뀌었다. 기업들은 전후 호황을 맞아 물건을 대량으로 쏟아냈다. 물건들을 되도록 빨리 버리고 새로 사도록 부추길 필요가 있었다. 의도적으로 사망 예정일이 있는 제품을 설계했다. 이른바 ‘노후화의 내재화’ 전략이다. 반도체 회사 페어차일드 대표는 “갑자기 여러 기능이 멈추는 제품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후화의 내재화 전략은 일회용 제품에서 정점을 이뤘다. 기저귀와 면도기가 일회용으로 등장했으며, 심지어는 일회용 프라이팬도 등장했다. 미국 정부도 연방 고속도로관리청 대출, 제대군인원호법 등 각종 법제를 통해 소비 진작 정책을 펼쳤다.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산물도 아니었던 셈이다. 미국 기업과 정부가 재배하고 배양한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는 대신 쓰레기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쪽을 택했다. 소각과 재활용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점점 경쟁에서 밀려났다. 대신 ‘위생 매립지’ 방식이 각광을 받았다. 트럭을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해 매립지로 보내고, 매립지에서는 셀이라 불리는 특수 용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렸다. 쓰레기 압축 방식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일도 많았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우선이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도 보인다는 뉴욕시 남서부 끝에 있는 프레시킬스 매립지도 이런 매립지 가운데 하나다.
<사라진 내일>은 소비자 개개인의 실천에서만 쓰레기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문제의 근원이 소비자의 낭비에 앞서 쓰레기가 양산되도록 유도하는 생산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기를 규율하도록 기대하지 말고 강제적인 환경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빈곤층 20%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3.6%에 지나지 않았다. 쓰레기 매립지 대부분이 집중된 곳도 빈곤층 거주지역이었다. 쓰레기 문제가 세계 최대 소비 국가 미국만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한국이 바다에 버린 폐기물도 2007년에 750만톤에 달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지은이 헤더 로저스는 쓰레기가 ‘현대 산업사회의 발명품’이라고 단언한다. 오늘날 미국은 전세계 인구의 4%밖에 되지 않으면서 전체 쓰레기의 30%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뉴욕 브루클린의 어떤 농부는 “내가 죽으면 농장의 모든 분뇨는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써넣었다. 공산품은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해 온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주부들은 쓰고 남은 기름을 끓여서 비누로 만들었다. 보기 흉해 식탁에 놓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은 찬장에 두고 재활용했다.
미국인의 소비 습관은 2차 세계대전 후 급격히 바뀌었다. 기업들은 전후 호황을 맞아 물건을 대량으로 쏟아냈다. 물건들을 되도록 빨리 버리고 새로 사도록 부추길 필요가 있었다. 의도적으로 사망 예정일이 있는 제품을 설계했다. 이른바 ‘노후화의 내재화’ 전략이다. 반도체 회사 페어차일드 대표는 “갑자기 여러 기능이 멈추는 제품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후화의 내재화 전략은 일회용 제품에서 정점을 이뤘다. 기저귀와 면도기가 일회용으로 등장했으며, 심지어는 일회용 프라이팬도 등장했다. 미국 정부도 연방 고속도로관리청 대출, 제대군인원호법 등 각종 법제를 통해 소비 진작 정책을 펼쳤다.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산물도 아니었던 셈이다. 미국 기업과 정부가 재배하고 배양한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는 대신 쓰레기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쪽을 택했다. 소각과 재활용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점점 경쟁에서 밀려났다. 대신 ‘위생 매립지’ 방식이 각광을 받았다. 트럭을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해 매립지로 보내고, 매립지에서는 셀이라 불리는 특수 용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렸다. 쓰레기 압축 방식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일도 많았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우선이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도 보인다는 뉴욕시 남서부 끝에 있는 프레시킬스 매립지도 이런 매립지 가운데 하나다.
<사라진 내일>은 소비자 개개인의 실천에서만 쓰레기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문제의 근원이 소비자의 낭비에 앞서 쓰레기가 양산되도록 유도하는 생산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기를 규율하도록 기대하지 말고 강제적인 환경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빈곤층 20%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3.6%에 지나지 않았다. 쓰레기 매립지 대부분이 집중된 곳도 빈곤층 거주지역이었다. 쓰레기 문제가 세계 최대 소비 국가 미국만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한국이 바다에 버린 폐기물도 2007년에 750만톤에 달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헤더 로저스 지음·이수영 옮김/삼인·1만4000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한 재 1만6000톤을 실은 화물선 키안시가 1986년 카리브해로 출발했을 때만 해도, 16년 동안 바다를 떠돌게 되리라고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키안시는 처음에는 바하마로 갔으나 바하마 정부는 입항을 거부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파나마를 전전했지만 모든 곳에서 이 유독한 재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키안시는 아이티 근해에 싣고 온 재 3분의 1 분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키안시호가 아이티 근해에 버린 재는 2000년까지 해변에 방치되었다. 결국 펜실베이니아 주가 2002년 아이티 해변에 불법으로 버린 재를 수거한 뒤에야, 키안시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키안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버린 쓰레기를 제3세계 국가들이 날마다 수입한다. 미국은 2002년 중국에 230만톤의 강철과 고철, 약 145억개의 다 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수출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를 잊을지는 몰라도 쓰레기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 내일>은 ‘그 많던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미국의 쓰레기 처리 역사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해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사라진 내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