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렴의 역주서 ‘아언각비·이담속찬’
인터뷰/역주서 ‘아언각비·이담속찬’ 펴낸 정해렴씨
그에게 청년의 순발력은 없다. 세월은 청년의 순발력을 조금씩 거둬갔으나 지금 그한테서 풍겨나오는 지식의 노련함은 더욱 깊게 했다. 40여년 동안 출판 편집자의 근성과 끈기는 풍설을 거뜬히 견뎌내어 주름진 눈과 손에 살아남아 있다.
1991년부터 주로 정약용·신채호·한용운 등 근대 선각자들의 저서를 꼼꼼한 역주서로 펴내온 ‘1인 출판’ 현대실학사의 대표이자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든 60대 편집자인 정해렴(66)씨가 최근 다산 정약용의 저서로만 따져 19권째 역주서인 <아언각비·이담속찬>을 직접 쓰고 편집해 냈다. “다산이 남긴 저술 500권 가운데 경학 분야를 뺀 실학 분야만 따져 250권이고 이를 오늘날 책 분량으로 엮으면 대략 25권인데 이제 19권째를 냈으니 그의 실학 분야 저술은 거의 모두 역주서로 다시 나오게 됐다”며 그는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
일부는 박석무 선생 등과 함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가 혼자서 한글로 옮기고 주를 달아 펴낸 학술총서 목록엔 <한용운 산문선집>(1991)을 시작으로, <신채호 역사논설집>(1995), <다산 논설선집>(1996), <다산 문학선집>(1996), <성호사설 정선>(1998), <역주 흠흠신서>(1999), <다산 시 정선>(2001), <역주 경세유표>(2004), <목민심서 정선>(2004)까지 모두 33권이 채워졌다. 사무실은 역주 작업에 쓰이는 여러 사전·자료들과 15년 작업의 결과물인 역주서들로 가득하다.
이번에 낸 ‘아언각비’(雅言覺非)는 다산이 200여 가지 말을 골라 당시 세상에서 잘못 쓰이는 사례를 분석한 것(1818년)이고, ‘이담속찬’(耳談續纂)은 중국 속담 177개와 우리 속담 214개를 아우른 속담사전(1820년)이다. “다산이 18년 귀양살이를 끝내고 돌아와 <목민심서>를 보완하고 <흠흠신서>를 저술하는 사이에 그의 언어학 쌍벽이라 할 ‘아언각비’와 ‘이담속찬’을 쓴 것은,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으려면 말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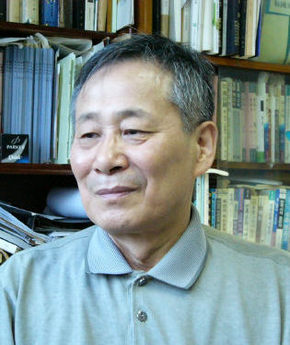 다시 그는 다산의 의학서 <마과회통(麻科會通)>의 역주서를 준비하고 있다. “20권째인 이 책이 사실상 다산 실학을 정리하는 역주서의 마지막일 듯합니다. 한두 권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학자로서 다산의 학식을 드러낼만한 귀중한 책이지요.” 또 다산·추사·초이 선생이 차에 관해 쓴 시문을 엮은 그의 책들이 내년부터 출간될 예정이다.
그는 혼자 출판사를 운영한다. 요즘 말로 1인 출판이다. 1996년 창비를 떠나 서울 마포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으니 벌써 10년째 1인 출판은 이어지고 있다. 1964년 신입 편집자로 출판계에 들어와 신구문화사를 거치고 76년부터는 창비 편집부장을 지냈으며, 1980년대 초 서너해 동안엔 창비 대표를 맡기도 했던 그는 “창비 대표 시절에도 편집에서 손을 놓지 않아 40여년 내내 편집 현장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손을 거쳐간 책만 어림잡아 1천권에 이른다. “편집을 하며 원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원서를 들춰보다보니, 정확한 풀이와 출처를 찾아 정리하는 역주서의 집필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다시 그는 다산의 의학서 <마과회통(麻科會通)>의 역주서를 준비하고 있다. “20권째인 이 책이 사실상 다산 실학을 정리하는 역주서의 마지막일 듯합니다. 한두 권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학자로서 다산의 학식을 드러낼만한 귀중한 책이지요.” 또 다산·추사·초이 선생이 차에 관해 쓴 시문을 엮은 그의 책들이 내년부터 출간될 예정이다.
그는 혼자 출판사를 운영한다. 요즘 말로 1인 출판이다. 1996년 창비를 떠나 서울 마포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으니 벌써 10년째 1인 출판은 이어지고 있다. 1964년 신입 편집자로 출판계에 들어와 신구문화사를 거치고 76년부터는 창비 편집부장을 지냈으며, 1980년대 초 서너해 동안엔 창비 대표를 맡기도 했던 그는 “창비 대표 시절에도 편집에서 손을 놓지 않아 40여년 내내 편집 현장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손을 거쳐간 책만 어림잡아 1천권에 이른다. “편집을 하며 원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원서를 들춰보다보니, 정확한 풀이와 출처를 찾아 정리하는 역주서의 집필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60대 나이에도 자신을 ‘현장의 전문 편집자’로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는 “우리나라 편집자들은 임기응변엔 능하지만 편집의 깊은 원리에는 여전히 약한 것 같다“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며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할만한 권위 있는 전문 편집자들이 성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출판사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 두지 않은 그에게 국사학과 중문학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원고를 입력해주는 두 아들 두영(39)씨와 하영(37)씨는 든든한 1인 출판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한때 출판학 교수가 될 기회도 있었지만 역시 편집은 나의 천직”이라고 말하는 그는 “아들에게 힘든 출판 일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겐 편집 인생이 그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글·사진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60대 나이에도 자신을 ‘현장의 전문 편집자’로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는 “우리나라 편집자들은 임기응변엔 능하지만 편집의 깊은 원리에는 여전히 약한 것 같다“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며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할만한 권위 있는 전문 편집자들이 성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출판사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 두지 않은 그에게 국사학과 중문학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원고를 입력해주는 두 아들 두영(39)씨와 하영(37)씨는 든든한 1인 출판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한때 출판학 교수가 될 기회도 있었지만 역시 편집은 나의 천직”이라고 말하는 그는 “아들에게 힘든 출판 일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겐 편집 인생이 그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글·사진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