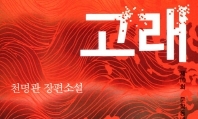주원규의 다독시대
거대한 뿌리
김수영 지음, 민음사 펴냄(2014)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김경주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2012) 김수영과 김경주, 두 시인을 좋아하는 이들은 그들을 검은 시인으로 부르길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검은 시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두 시인의 시적 정체성을 변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두 시인의 정체성을 이뤄 온 두 시대의 불온성, 두 시대를 거대한 심연으로 도색해버린 검은빛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수영과 김경주는 여지없이 검은 시인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다’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검다는 의미는 시대의 정서를 소환하기 마련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환멸에 대한 저항의 정서를 끝 모를 욕구로 환유하길 갈구한다. 환멸은 대개 잿빛을 닮아 있다. 하지만 잿빛이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인도될 때, 잿빛은 환멸에 대한 저항의 발현, 심연의 검은빛으로 변색된다. 이러한 환멸의 태도는 시대의 비극 혹은 시대의 격동과 흐름을 같이한다. 김수영의 시집 <거대한 뿌리>가 쏟아내는 검은 시어(詩語)의 찬란함은 4·19라는 시대정신, 불의의 침식성에 저항하는 의로운 징후들을 시대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쏟아낸 전리품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여전히 김수영을 기억하는 이유일 것이다. 4·19로 대표되는 시대는 희망과 좌절의 구획 분리가 일관된 선명성을 갖고 전개되었으며 그 선명성의 틈새에서 김수영은 환멸이 무엇인지 정치하게 드러냈다. 그런데, 같은 환멸을 이야기하는 검은 시어의 방출이 또 다른 시대를 만나면서 낯선 경이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2000년대에 등장해 김수영의 재래(再來)로 평가받은 김경주의 첫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가 그렇다. 없음을 내세운 김경주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저항의 대상이 거세된 시대다. 이렇듯 여간해선 거역되지 않는 거세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검은 시인 김경주는 그 자신만의 저항의 방식으로 지독한 실제적 환멸을 은유의 심연 속에 밀어 넣고 심연의 검은빛을 중얼거리는 것으로 시대를 고발하고자 했다. 두 검은 시인은 아마도 검은빛으로 도색된 시대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그들의 시를 향유하는 오늘의 우리 역시 중심이 거세된 유령으로 방황하거나 그 반대인 무류(無謬)의 사상누각 건설을 강요받고 있다.
 검은 시인들이 말하는 바는 비교적 선명하다. 환멸을 밀고 가는 힘이 저항에 있음을 긍정하는 것. 유령이든 주변이든, 어떻게든 시대의 야만을 고발하는 ‘나’ 그리고 ‘우리’를 선고하는 것이다. 그 선고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자. 검은 시인들의 검은 시어를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주원규 소설가
※ ‘장정일의 독서일기’에 이어 ‘주원규의 다독시대’를 매달 싣습니다. 출판문화 침체로 독서율이 떨어진 시대에 대한 역설적 희망을 담았습니다. 주원규 소설가는 제14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인 <열외인종 잔혹사>를 비롯해 장편소설 <무력소년 생존기> <너머의 세상> 등을 썼으며 에세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평론집 <성역과 바벨> 등을 펴냈습니다.
검은 시인들이 말하는 바는 비교적 선명하다. 환멸을 밀고 가는 힘이 저항에 있음을 긍정하는 것. 유령이든 주변이든, 어떻게든 시대의 야만을 고발하는 ‘나’ 그리고 ‘우리’를 선고하는 것이다. 그 선고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자. 검은 시인들의 검은 시어를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주원규 소설가
※ ‘장정일의 독서일기’에 이어 ‘주원규의 다독시대’를 매달 싣습니다. 출판문화 침체로 독서율이 떨어진 시대에 대한 역설적 희망을 담았습니다. 주원규 소설가는 제14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인 <열외인종 잔혹사>를 비롯해 장편소설 <무력소년 생존기> <너머의 세상> 등을 썼으며 에세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평론집 <성역과 바벨> 등을 펴냈습니다.
김수영 지음, 민음사 펴냄(2014)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김경주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2012) 김수영과 김경주, 두 시인을 좋아하는 이들은 그들을 검은 시인으로 부르길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검은 시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두 시인의 시적 정체성을 변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두 시인의 정체성을 이뤄 온 두 시대의 불온성, 두 시대를 거대한 심연으로 도색해버린 검은빛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수영과 김경주는 여지없이 검은 시인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다’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검다는 의미는 시대의 정서를 소환하기 마련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환멸에 대한 저항의 정서를 끝 모를 욕구로 환유하길 갈구한다. 환멸은 대개 잿빛을 닮아 있다. 하지만 잿빛이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인도될 때, 잿빛은 환멸에 대한 저항의 발현, 심연의 검은빛으로 변색된다. 이러한 환멸의 태도는 시대의 비극 혹은 시대의 격동과 흐름을 같이한다. 김수영의 시집 <거대한 뿌리>가 쏟아내는 검은 시어(詩語)의 찬란함은 4·19라는 시대정신, 불의의 침식성에 저항하는 의로운 징후들을 시대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쏟아낸 전리품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가 여전히 김수영을 기억하는 이유일 것이다. 4·19로 대표되는 시대는 희망과 좌절의 구획 분리가 일관된 선명성을 갖고 전개되었으며 그 선명성의 틈새에서 김수영은 환멸이 무엇인지 정치하게 드러냈다. 그런데, 같은 환멸을 이야기하는 검은 시어의 방출이 또 다른 시대를 만나면서 낯선 경이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2000년대에 등장해 김수영의 재래(再來)로 평가받은 김경주의 첫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가 그렇다. 없음을 내세운 김경주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저항의 대상이 거세된 시대다. 이렇듯 여간해선 거역되지 않는 거세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검은 시인 김경주는 그 자신만의 저항의 방식으로 지독한 실제적 환멸을 은유의 심연 속에 밀어 넣고 심연의 검은빛을 중얼거리는 것으로 시대를 고발하고자 했다. 두 검은 시인은 아마도 검은빛으로 도색된 시대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동시에 그들의 시를 향유하는 오늘의 우리 역시 중심이 거세된 유령으로 방황하거나 그 반대인 무류(無謬)의 사상누각 건설을 강요받고 있다.
주원규 소설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