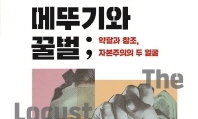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세계경제사 들어서기
송병건 지음/도서출판 해남(2013)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뒤 당황한 국민들에게 영국 정치인들은 “이민이나 난민을 제한하는 자율권을 가지면서도, 통합된 유럽 시장에 영국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 그러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즉각 “체리피킹은 안 된다”고 잘랐다. 영국이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상황은 세계화를 둘러싼 ‘삼자택이’(Trilemma)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세 가지 가치, 즉 국제 시장 통합, 국가주권, 민주정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 혹은 기껏해야 두 개를 만족시킬 뿐이란 게 ‘삼자택이’의 딜레마다. 영국에 대입하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서 가결하는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면 통합된 유럽시장의 달콤함은 잊어야 한다는 얘기다.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돼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개별 국가는 무역 및 자본시장 자유화, 노동유연성, 재정건전성 같은 세계화의 ‘황금구속복’을 입어야 한다. 이런 제약조건 아래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지되는 민주정치는 껍데기만 남기 십상이다. 국가의 주권은 살아 있지만 노조를 적대시하고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매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싫다면, 즉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세계화의 강도를 약하게 제한해야 한다. 2차대전 뒤 세계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그것이었다. 이 체제의 설계자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런 딜레마를 잘 알았기에 무역은 자유화하면서 국제자본 이동에는 빗장을 걸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전후의 복지국가가 가능했고, 패전국 일본의 부흥이나 한국, 대만 같은 신흥국도 적당히 문을 걸어잠그고 수출을 늘리며 일어설 수 있었다. 또 다른 선택지, 즉 세계화의 혜택과 민주정치를 조화시키는 길은 표준과 규제(글로벌 거버넌스)가 지배하는 세계 연방을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그런 시도였다. 이때 정치는 국제 수준으로 옮겨가고 국민국가의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자국 소시지의 고기 함유 비율까지 규제하는 브뤼셀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점차 참기 힘들어졌다. 지난 30년간 질주해온 세계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은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는 날로 보호주의 색채가 농후해지고 있다. 세계화가 격차를 낳고 이제 그 직접 피해자인 가난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던지는 ‘한 표’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제학자인 대니 로드릭은 “세계화를 떠받치는 기둥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세계화가 국내 정치와 충돌할 때는 정치가 이기게 돼 있다”고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화를 중심으로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엮여져 왔는지를 알아보려면 <세계경제사 들어서기>가 좋은 입문서이다. 이 책의 미덕은 경제 서적치고는 쉽게 쓰인 것이다. 삽화나 사진도 많아 넘기는 맛이 있다. 이 책을 읽고 좀 더 본격적인 세계화 고찰서인 대니 로드릭의 <자본주의 새판짜기>(21세기북스, 2011, 원제 Globalization Paradox)를 읽으면 현안인 브렉시트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다. 이봉현 편집국 미디어전략 부국장 bhlee@hani.co.kr
송병건 지음/도서출판 해남(2013)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뒤 당황한 국민들에게 영국 정치인들은 “이민이나 난민을 제한하는 자율권을 가지면서도, 통합된 유럽 시장에 영국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 그러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즉각 “체리피킹은 안 된다”고 잘랐다. 영국이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상황은 세계화를 둘러싼 ‘삼자택이’(Trilemma)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세 가지 가치, 즉 국제 시장 통합, 국가주권, 민주정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 혹은 기껏해야 두 개를 만족시킬 뿐이란 게 ‘삼자택이’의 딜레마다. 영국에 대입하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서 가결하는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면 통합된 유럽시장의 달콤함은 잊어야 한다는 얘기다.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돼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개별 국가는 무역 및 자본시장 자유화, 노동유연성, 재정건전성 같은 세계화의 ‘황금구속복’을 입어야 한다. 이런 제약조건 아래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지되는 민주정치는 껍데기만 남기 십상이다. 국가의 주권은 살아 있지만 노조를 적대시하고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매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싫다면, 즉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세계화의 강도를 약하게 제한해야 한다. 2차대전 뒤 세계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그것이었다. 이 체제의 설계자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런 딜레마를 잘 알았기에 무역은 자유화하면서 국제자본 이동에는 빗장을 걸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전후의 복지국가가 가능했고, 패전국 일본의 부흥이나 한국, 대만 같은 신흥국도 적당히 문을 걸어잠그고 수출을 늘리며 일어설 수 있었다. 또 다른 선택지, 즉 세계화의 혜택과 민주정치를 조화시키는 길은 표준과 규제(글로벌 거버넌스)가 지배하는 세계 연방을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그런 시도였다. 이때 정치는 국제 수준으로 옮겨가고 국민국가의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자국 소시지의 고기 함유 비율까지 규제하는 브뤼셀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점차 참기 힘들어졌다. 지난 30년간 질주해온 세계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은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는 날로 보호주의 색채가 농후해지고 있다. 세계화가 격차를 낳고 이제 그 직접 피해자인 가난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던지는 ‘한 표’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제학자인 대니 로드릭은 “세계화를 떠받치는 기둥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세계화가 국내 정치와 충돌할 때는 정치가 이기게 돼 있다”고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화를 중심으로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엮여져 왔는지를 알아보려면 <세계경제사 들어서기>가 좋은 입문서이다. 이 책의 미덕은 경제 서적치고는 쉽게 쓰인 것이다. 삽화나 사진도 많아 넘기는 맛이 있다. 이 책을 읽고 좀 더 본격적인 세계화 고찰서인 대니 로드릭의 <자본주의 새판짜기>(21세기북스, 2011, 원제 Globalization Paradox)를 읽으면 현안인 브렉시트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다. 이봉현 편집국 미디어전략 부국장 bh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