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후의 지암일기
윤이후 지음, 하영휘 외 옮김/너머북스·5만8000원
윤이후는 고산 윤선도의 손자이자 공재 윤두서의 생부다. <어부사시사>를 비롯해 뛰어난 문명(文名)을 남긴 할아버지와 <자화상>으로 잘 알려진 아들의 화명(畫名)에 가려져 유명세는 덜한 편이다. 하지만 윤선도의 여러 손자들 가운데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윤이후 혼자였고, 같은 항렬의 모든 이들이 후사가 없어 윤이후의 아들들이 양자로 들어갔다. 그만큼 해남윤씨 집안에서의 존재감이 높은 인물이다.
<지암일기>는 그가 전라도 함평 현감이었던 1692년 1월1일부터 세상을 뜨기 5일 전인 1699년 9월9일까지 쓴 일기다. 17세기 조선이 겪었던 혹독한 재난과 기근, 당시의 풍습과 정계의 사정까지 폭넓게 담겨 있는 기록의 보물창고 같은 책이다.
윤이후가 은퇴 뒤 둑을 쌓고 초당을 짓고 살았던 죽도 전경. <윤이후의 지암일기>를 번역한 하영휘 성균관대 교수 등이 현지답사를 통해 비로소 죽도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냈다.
“길 옆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었다. 참혹하다. 올해 흉년은 전에 없던 일이나, 영암과 해남은 모두 조금 낫다고들 한다. (…) 길을 떠난 후 나주 위로는 보이는 참상이 더욱 심하고, (…) 광호촌만 해도 죽은 사람이 7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이로 미루어 다른 지역 상황도 알 만하다.”(1696년 4월28일 계축, 맑음) 같은 날 일기에는 “내가 비축해 둔 곡물로 여러 번 사사로이 진휼했기 때문”에 윤이후가 살던 “팔마 마을은 얼굴색이 누렇게 뜨거나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 없다”는 내용도 나온다.
유복자로 태어난 윤이후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의 품에서 자랐다. 이 유모에 관한 애틋한 심경을 적은 ‘유모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일기에 남기기도 했다. “유모의 손자 대까지는 신공(身貢)을 징수하지 말고 또 잡아다 부리지 마라. 그 후소생은 여러 대가 지나도 절대로 외손에게 상속하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지극한 뜻을 잊지 마라.”
일기에는 총 25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370여 명은 지식 엘리트 계층이고, 승려 60여 명, 노비가 250여 명이나 된다. 1697년 10월20일에는 덕립이라는 노비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노 덕립이 새벽닭이 울 때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이 노의 나이가 올해 여든인데, 부부가 지금껏 해로하고 자손이 60여 명이나 된다. 실로 세상에 드문 복이다”라고 썼다.
1696년 3월11일 일기에는 암행어사의 태만과 부정부패 행태를 비판하는 대목도 있다. “○암행어사는 가는 곳마다 미적대며 머물렀다. 어제는 무위사에 묵고 이어서 방향을 틀어 도갑사로 갔으며 제 맘대로 유람하면서 무쉬(武倅)들에게 의복 등의 물건을 받아내어 항상 말 10여 마리의 짐을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그 하는 짓이 놀랍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한심하다.”
윤이후는 은퇴 뒤 해남 일대 해안과 섬에 둑을 쌓아 농지를 간척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갔다. 간척 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해남윤씨 집안이 대대로 재산을 증식해온 방편이었다. 그는 죽도, 속금도, 두모동 제방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 사후처리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일기에 실린 <일민가>는 이미 알려진 작품이다. 그밖에도 윤이후가 부르고 쓴 시와 산문 250여 편이 수록돼 있다. 하영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등이 공을 들여 번역한 흔적이 역력하다.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일기 속 공간과 현재 위치와 지도 등 1272쪽에 이르는 대작이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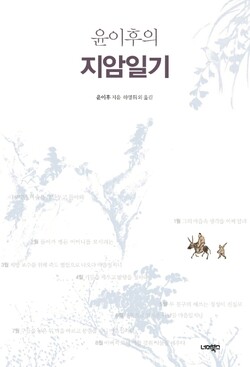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