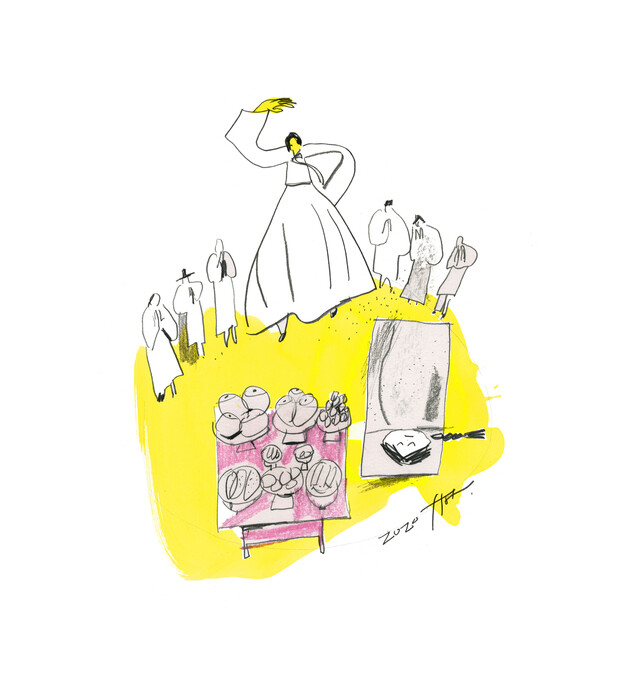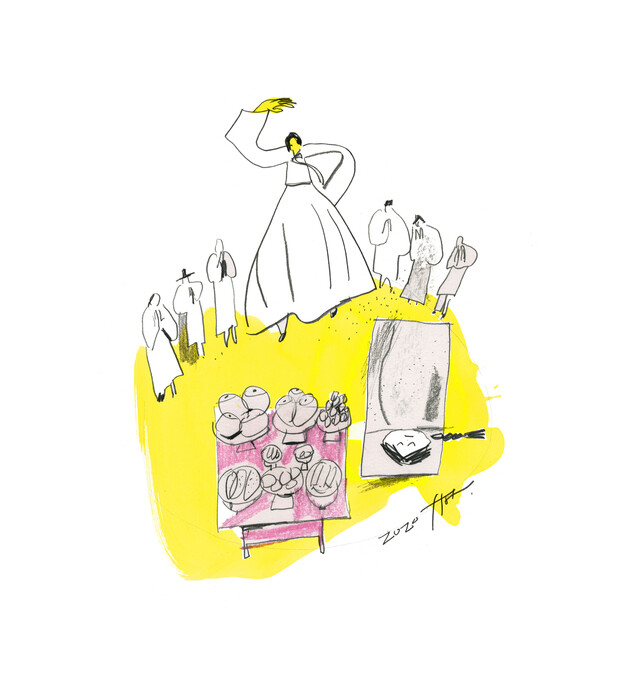크게 이름을 알려 시대의 주목을 받은 이들이 역사의 전면을 장식하지만 조선시대 사람 수를 놓고 볼 때,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5백원짜리 동전이 나올 확률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다 할 사건이나 기록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몫을 치열하게 살았을 것이다. 16세기 성주지역의 무녀(巫女) 추월(秋月)도 단골 고객의 기록이 없었다면 ‘모래알’ 백성으로 묻힐 뻔했다. 추월과 단골 이문건과의 거래는 15년 이상 지속되었다. 고독과 분노의 감정이 남들보다 심했을 유배객 이문건은 죽기 직전까지 추월을 통해 적잖은 위로를 받는다.
대과 급제를 거쳐 고급 관료를 지낸 이문건, 처음엔 유교 지식인답게 무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 세 들어 사는 주인집의 안채에서 무사(巫事)를 벌이려 하자 무녀를 불러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한다. 그런데 아들의 혼인으로 어린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자주 일어나자 서서히 추월에게 의존하게 된다. 추월을 불러 “바깥의 나쁜 귀신을 달래게” 하고 그녀를 통해 “망극한 근심”을 내려놓는다.
추월은 모계 세습을 통해 무녀가 되었다. 부역(賦役)의 의무가 없었던 대부분의 여자들과는 달리 추월은 수익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업인이다. 그녀는 무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남편 정억수와 의붓아들을 건사하는 ‘가장’이었다. 추월의 어머니는 전라도에서 활동하는데, 경상도로 넘어와 추월의 무사를 대신 맡기도 한다. 추월이 이소(離所) 죄와 뇌물죄에 걸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다. 무녀는 교구와 유사한 개념의 무업권(巫業權)을 가지는데,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추월의 행위가 고객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인지 더 벌기 위한 욕심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추월의 단골 이문건은 학문과 의술을 구비한 유의(儒醫)다. 가족의 질병은 그의 손에서 대략 해결되었고, 인근의 지인들도 그의 처방을 받기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 수많은 죽음을 목도한 그에게 돌아가며 드러누워 사경을 헤매는 가족들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귀신 씌운’ 병이나 ‘사기(邪氣)가 발동’한 질병은 무녀 추월의 몫이었다.
추월은 치병 굿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단골 이문건은 몸져누운 아내가 영 일어나지를 못하자 추월을 불러 귀신을 달래게 한다. 이질을 앓아 목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세 살배기 손녀딸을 위해 추월에게 구명시식(救命施食)을 부탁한다.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어 애원하며 목숨을 되돌려 달라는 의식이다. 원인도 없이 나날이 말라가는 손자의 병인을 ‘유의’ 이문건은 ‘무의’(巫醫) 추월에게 묻는다. 추월은 식신(食神)을 달래는 의식을 행하고, 가족들은 기도한다. 추월은 고객으로부터 곡식도 받아가고 틈틈이 자기 가족들의 병에 쓸 약을 챙겨간다. 추월이 무엇을 요구하든, 심지어는 남편 정억수의 무리한 부탁까지도 이문건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사족 남성 이문건에게 추월은 신의 대리인이었다. 그녀에게 “신을 대신하여 아픈 아기를 구해 달라”고 하고, 추월은 천지신명의 말이라며 열흘 후면 완전히 나을 것이라 한다. 미지의 세계는 추월이 장악한 듯, 새벽에 암탉이 우는 이유를 묻는 이문건에게 추월은 ‘좋은 징조’라고 답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유교경전의 지식을 추월이 엎어버린 셈이다. 무녀 추월은 먼 길을 떠나는 고객 가족의 안위를 빌어주고, 고객의 부탁으로 안타깝게 죽은 노(奴)의 제사를 지내준다. 한 마을을 돌면서 우환에 든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생업을 엮어간 무녀 추월. 그녀의 삶에서 권력이란 타인을 향한 정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