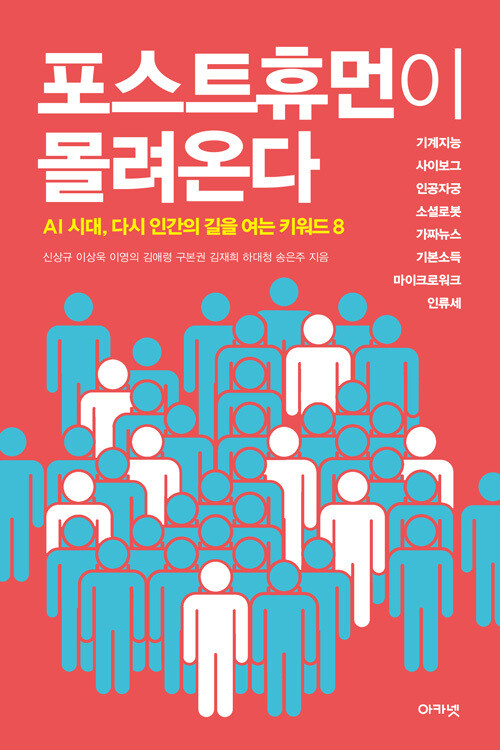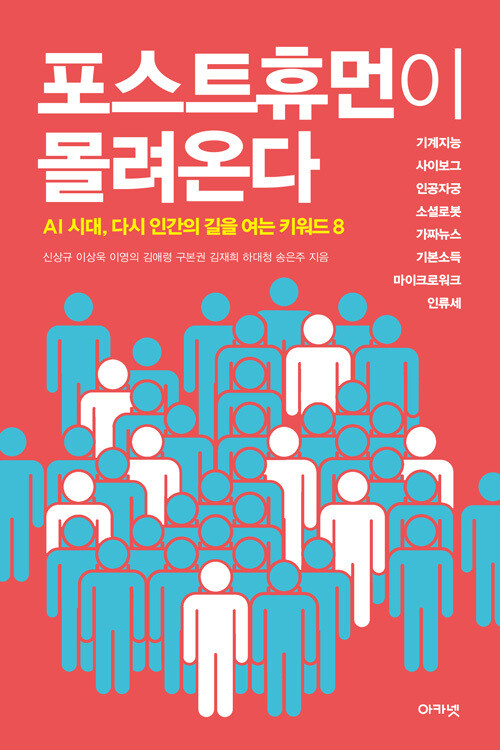로버트 페페렐의 <포스트휴먼의 조건>은 1995년 첫 출간된 뒤 2003년과 2009년에 걸쳐 개정판이 나옵니다. 포스트휴머니즘 관련 지식이 빠르게 증가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휴머니즘이 인간과 비인간을 나눠 위계화했다는 지은이의 비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새 책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신상규 등 지음) 프롤로그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이 비인간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삶을 재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명, 기계, 물질의 본성이 바뀌고 상식과 지식의 기반도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속화와 기후변화의 가속화 사이에 놓인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인간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강남순 교수는 새 책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에필로그에서 근대 담론이 지향하던 ‘거대 담론’ ‘인류 보편’ 같은 추상화를 경계하며 구체적인 ‘얼굴’에서 비롯한 “너와 나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근대적 주체인 개인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거니와 강 교수 또한 공동체의 구호 아래 개체성이 함몰되거나 개체성의 이름으로 공동체성이 배제되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망의 출발은 오로지 “내가 나일 수 있을 때”여야 한다고요. 이때 ‘나’는 ‘너’와 위계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기 위해 깨어 있는 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하셨던 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을 듯한데, 깨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잠이든 몽상이든 깨어날 때마다 나침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나침반이 될 만한 책들을 골라 보았으니, 코로나 시대의 사랑법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즐거운 독서 하시길 빕니다.
이유진 책지성팀장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