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지도, 나무
프랑코 모레티 지음, 이재연 옮김/문학동네·1만6000원
프랑코 모레티(70)는 이탈리아 출신 영문학자이자 비교문학자로 <세상의 이치>(1987), <근대의 서사시>(1995) 같은 문학사회학 연구서가 국내에도 소개돼 있다. 디지털 문학 연구의 쟁점을 담은 최근작 <멀리서 읽기>(2013)가 번역 중인 가운데, 그의 2005년 저작인 <그래프, 지도, 나무>가 이재연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의 번역으로 한국어판을 얻었다.
본문으로 100쪽을 갓 넘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 책은 매우 도발적이며 논쟁적인 주장, 그와 함께 참신하고 흥미로운 통찰을 담았다. “텍스트는 문학사에서 적절한 학문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단언이 텍스트를 신성시하는 많은 문학 비평가와 연구자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오래되고 불필요한 구분짓기(고급문학과 저급문학, 정전과 기록된 문학 작품 전체, 이러저러한 민족문학…)를 새로운 시간적, 공간적, 형태론적 구분들로 대체”하겠다는 거창한 포부는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2009년에 국내 개봉한 영화 <셜록 홈즈>의 한 장면. 프랑코 모레티는 문학사론 <그래프, 지도, 나무>에서 영국 추리소설의 분기를 진화론적 계통수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셜록 홈스 시리즈가 진화론적 최종 승리를 거둔 비결을 들여다본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의 2013년작 제목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가 이 책에서도 방법론적 토대가 된다. 문학 비평과 연구라면 무엇보다 작품을 꼼꼼하게 읽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 미국 영문학계를 지배했고 한국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신비평은 텍스트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한 작품 해석을 주창한 바 있다. 그러나 모레티는 신비평 식의 ‘꼼꼼한 읽기’(close reading)에 대립되는 ‘멀리서 읽기’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개별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거시적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을 동원하자는 것이다.
책은 ‘그래프’ ‘지도’ ‘나무’라는 세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장 제목들이 모여 책 제목을 이룬다. 문학 연구서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제목들부터가 모레티의 독창성을 웅변하는 듯하다. 그래프와 지도와 나무를 통틀어 이 책에서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래프와 지도와 나무 형태로 된 다이어그램으로 문학사 서술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첫 장 ‘그래프’에서 모레티는 영국(1720~1740년), 일본(1745~1765년), 이탈리아(1820~1840년), 스페인(1845~1860년대 초반), 나이지리아(1965~1980년) 다섯 나라의 다섯 시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시기 해당 국가의 소설 출간 종수 변화를 살폈더니, “매년 다섯 편에서 열 편씩, 즉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편씩 신간 소설이 출간되던 데서, 매주 한 편 꼴로 급증하였다.” 모레티는 이 다섯 나라의 소설 장르 발흥을 그래프로 그려 보이는데, 비록 시기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프의 모양으로 표시되는 출간 종수 증가 양상은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레티는 1740년부터 1900년까지 영국 문학에서 지배적이었던 소설 양식의 흥망을 살펴본다. 그 결과 “160년간 44개의 장르가 나타났”으며, 하나의 장르가 20~30년 동안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다가 다음 장르로 주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모레티는 이 장 말미에 ‘구혼 소설’ ‘서간체 소설’ ‘고딕 소설’ 등 44개 장르의 발흥 연대를 밝혔는데, 두 번째 장 ‘지도’에서는 이 가운데 ‘촌락 서사’(village stories)를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이어 간다.
“촌락 서사는 19세기 초 영국 문학의 인기 장르 중 하나였고, 1824년에서 1832년까지 총 5권으로 발간된 메리 밋퍼드의 소설 <우리 마을>에서 그 인기의 정점을 찍었다.” 모레티는 <우리 마을>에서 하나의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마다 젊은 화자가 마을 중심부에서 매번 다른 방향을 향해 산책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동선에 주목한다. 그는 이 소설의 공간이 시간과 사건 순서에 따른 선형적(linear) 형태가 아닌, 순환되는 원형적(circular) 형태를 띤다고 주장한다. 스코틀랜드 목사 존 걸트가 50년 간 기록한 <교구 연대기>와 19세기 독일의 베스트셀러 소설 <검은숲 마을 이야기>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그는 촌락 서사가 ‘자족적인 중심부’를 둘러싼 원형 구조를 보이며, 산업화와 전쟁 같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인해 중심부가 재편되면서 촌락 서사 역시 주도적 장르 지위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마지막 장 ‘나무’에서 모레티는 찰스 다윈의 ‘계통수’를 문학사 서술에 동원한다. 진화론의 계통수는 어족의 분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쓰이는데, “언어가 분기함으로써 진화한다면, 문학도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모레티를 자극한다. 그는 영국 추리소설을 예로 들어 가며 실마리가 있는지, 그 실마리를 작품 안에 숨겨 두었는지, 그것을 독자가 알아챌 수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작품들을 분류하고 계통을 세운다. 그런 가지 치기 끝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셜록 홈스 시리즈가 추리소설의 대표자로 기존 문학사에는 등재되지만, 모레티는 “잃어버린 99퍼센트의 작품들을 문학사의 편물 속으로 다시 통합시켜 우리가 마침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자신의 작업의 장점으로 내세운다.
모레티의 작업은 계량적 연구방법을 통해 문학사에서 패턴과 구조를 찾아내고 그를 통해 소수의 정전(canon)에 가려진 대다수 방대한 작품을 복원시키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모레티 스스로 자신이 “개별 텍스트의 해석보다는 일반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선호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은 그가 청년기에 심취했던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격한 찬사와 그만큼 격렬한 비판을 함께 받은 모레티의 이 책이 한국의 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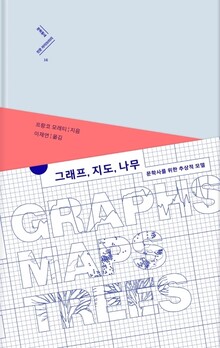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