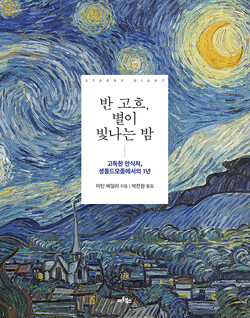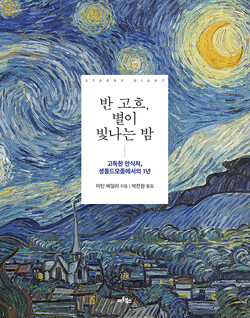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마틴 베일리 지음, 박찬원 옮김/아트북스·2만5000원
‘그들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 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아마 그들은 이제 귀 기울일 거예요.’(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돈 맥클린은 그의 노래 <빈센트>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느꼈을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의 예술적인 열정을 상상해 담았다.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그림과 생애를 떠올려 상상하지 않고 실체를 향해 성큼 발을 딛는다. 지은이 마틴 베일리는 1987년부터 무려 33년간 화가의 발자취를 좇은 ‘반 고흐 전문가’다. 이 책은 빈센트가 1889년 5월부터 1년간 생폴드모졸 정신 요양원에 머물렀던 시기를 천착했다. 고독한 안식처에 머물며 <별이 빛나는 밤>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아몬드꽃> <소용돌이치는 배경의 자화상> 등 널리 알려진 걸작을 비롯해 150여 점의 작품을 그려냈던 시기다.
이 책의 미덕은 끈질긴 추적과 취재에 있다. 지은이는 빈센트와 함께 요양원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흔적까지 더듬는다. <정원사>의 실제 주인공 이름과 정체를 밝혀내는 과정은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속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별이 빛나는 밤>이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인지 궁금해했던 ‘고흐 마니아’라면, 천문학까지 동원한 지은이의 설명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책에 실린 여러 그림을 보며 눈호강하는 것은 기본, 책을 덮으며 점점 선명해지는 건 그의 목소리다. 비로소 독자들은 귀기울여 듣고, 알게 된다. 고독과 절망만으로 빈센트 반 고흐를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