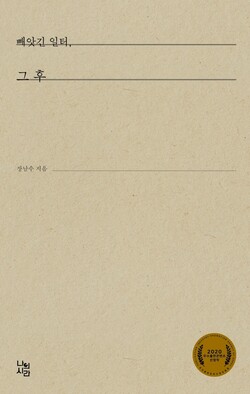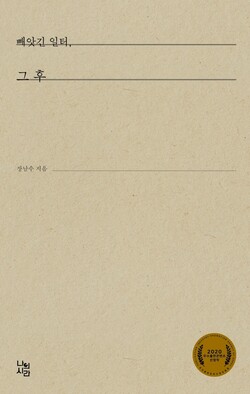빼앗긴 일터, 그 후
장남수 지음/나의시간·1만5000원
‘남녘 남(南)’에 ‘물가 수(洙)’. 글쓰는 노동자 장남수의 어릴 적 이름은 ‘사내 남(男)’에 ‘빼어날 수(秀)’를 썼다. 50~60년대 많은 집이 그랬듯 사내아이에 대한 부모의 염원을 담은 이름을 지닌 딸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동생을 돌보고 친척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다 스무살 무렵 공장에 들어갔다. 그래도 “학교로 치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격”인 원풍모방에 운 좋게 입사한 저자는 당시 드물게 체계가 잡혀 있던 회사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동일방직 똥물 사건’의 연대투쟁 등 한국 노동운동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 치열했던 현장의 기록이 1984년 창작과비평에서 나온 <빼앗긴 일터>다. 올해 5월 복간된 <어느 돌멩이의 외침>과 함께 노동자가 직접 쓴 노동문학의 수작으로 꼽힌다. 저자는 오래전 절판된 책을 복간하는 대신 ‘그후’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 노동을 시작하게 되기까지의 어린시절과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 겪었던 굵직한 사건 등 책의 앞 부분은 전작에서 다뤘던 이야기다. ‘그후’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거제도행 버스를 타면서 시작된다. 해고노동자가 되면서 투쟁 현장의 외곽 지원과 홍보, 그리고 기록자로서 자신을 재정비하며 써내려간 글들이다. 쉰 살에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서 배우고 느낀 자신의 이야기는 전작에서 이십대에 멈췄던 개인서사가 2000년대 이후 생활사와 함께 촘촘히 엮인다.
어릴 적 함께 야학에서 공부했던 친구들과 재회하거나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동료들의 2세와 만나는 장면은 감동적이면서도 착잡한 여운을 준다. 치열했던 노동운동이 민주화를 견인했던 한국사회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단순치 않은 독서의 감흥을 주는 탓일 터이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