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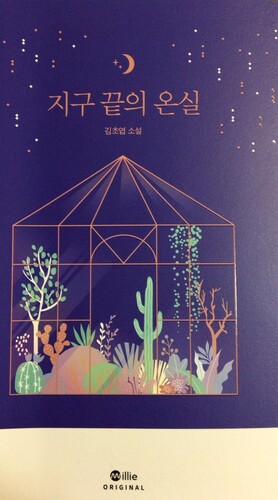
김초엽 지음/밀리의서재·1만4000원 김초엽(사진)은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에스에프(SF) 작가다. 2017년에 등단한 그는 지난해 첫 작품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냈고, 이 책은 14만부가 넘게 팔렸으며 권위 있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대중의 사랑과 문단의 평가를 함께 받은 셈이다. <지구 끝의 온실>은 그의 첫 장편으로, 독서 앱 밀리의서재의 오리지널 종이책으로 먼저 선보였다. 여느 독자들이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 소설은 유기체에 치명적인 먼지 ‘더스트’로 인류의 90퍼센트 가까이가 소멸했다가 문명이 재건된 시점을 배경으로 삼는다. 더스트 이후의 생태를 다루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아영은 한국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식하는 유해 잡초 ‘모스바나’의 생태적 특성을 살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는다. 모스바나는 더스트 종식 시기에 빠르게 번식했다가 그 뒤 서식 면적이 좁아졌던 식물인데, 문제는 새롭게 발견된 모스바나의 유전체가 70년 전 더스트 종식 시기의 이 식물 유전체와 비슷하다는 점. 여기에다가 이 식물이 밤이면 푸른 빛을 내뿜는다는 목격담은 아영이 어린 시절 동네 노인 이희수의 집 정원에서 보았던 낯선 덩굴 식물과 푸른 빛을 상기시킨다. 아영의 전자우편으로 전달된 익명의 제보 그리고 학술 행사차 찾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만난 ‘마녀’ 나오미의 이야기는 더스트 종식과 모스바나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미와 이희수 같은 여성들이 겪은 박해와 용기에 관한 감추어졌던 진실로 독자를 데려간다. 더스트가 목숨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권력과 자금을 지닌 자들은 돔을 지어 생존을 도모한다. 인류의 일부는 더스트에 내성을 지닌 ‘내성종’으로 확인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어서 사냥과 실험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쫓기던 여성들이 돔 바깥 외딴 숲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로부터 더스트 종식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애초부터 세상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었다. 이곳 마을은 그들을 받아들여준 유일한 세계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하게 허락된 세계를 확장하고 싶어 했다. (…) 사람들은 약속하고 있었다. 이 숲을 나가도, 레이첼의 식물들을 심겠다고. 그래서 숲 바깥의 세계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겠다고.”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추리적 기법에 담은 에스에프. <지구 끝의 온실>은 지금 독자에게 다가갈 요소들을 두루 지녔다. 그렇지만 김초엽의 중단편들에서 보았던 놀라운 인간 이해와 과학적 통찰이 이번에는 메시지와 이야기에 짓눌린 것이 아닌가 하는 독후감이 남는다. 글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사진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