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밤마다 수다를 떨었고,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궈징 지음, 우디 옮김/원더박스·1만6500원
낯선 도시로 이사온 지 한달 만에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발생한다. 병은 순식간에 번져나가고, 진원지로 지목된 도시는 봉쇄된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자동차가 사라지고 약국과 슈퍼마켓의 매대도 텅 비어간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홀로 고립된 여성은 “오직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인 하루하루를 기록해나가기 시작한다.
이전 같으면 디스토피아적 근미래를 다루는 에스에프(SF) 소설이라고 생각했을 이 상황은 이제 모두가 아는 현실, 중국 우한의 이야기다. ‘어느 페미니스트의 우한 생존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한이 봉쇄된 지난 1월23일부터 3월1일까지(해제는 4월8일) 매일 쓴 일기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연재형식으로 이어진 글들은 200만회에 이르는 조횟수를 기록하면서 중국 밖에까지 우한의 현실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도시의 봉쇄 소식을 접했을 때는 뭘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봉쇄가 얼마나 길어질까. 뭘 준비해야 할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봉쇄는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많은 이들이 그랬듯 망연했던 지은이도 가장 먼저 한 건 마트에 가서 사람들을 따라 쌀, 국수 같은 생존 필수 식량을 챙기는 일이었다.
1월27일 코로나19로 인해 봉쇄된 중국 우한시 중산로의 모습. 연합뉴스
지은이는 일상이 사라진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 매일 낮에는 거리를 산책하고 밤이 되면 중국 각지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화상으로 수다를 떤다. 저마다 다른 정도의 고립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드라마 이야기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가정폭력 등 여성들이 처해진 겹겹의 고통, 코로나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알리면서 공안당국의 압력을 받다가 코로나로 숨진 의사 ‘리원량’에 대한 애도와 정보가 통제된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나간다.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관계의 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끈은 친구 같은 기존 관계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댓글로 확장된다. 서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자의 건강을 걱정하고 마스크나 물품 등 격려의 힘을 보태려는 익명의 ‘끈’들이 보여주는 선의와 연대가 가슴 뭉클하다.
저자는 도시 안에서도 봉쇄의 단계를 높이면서 외출금지가 결정될 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인터뷰한다. 그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도시의 청소부들이다. 도시가 봉쇄되면서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청소부들은 그렇지 못했다. “아주머니는, 당신은 위에서 얘기가 없으면 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 행인이 아주머니에게 죽는 게 두렵지도 않느냐고 물으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죽는 게 두려워도 방법이 없다고, 더럽고 치사하면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청소부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봉쇄 강도가 심해졌을 때는 숨쉬기도 불편한 방역복을 입고 황량한 우한의 거리를 청소했다. 감염과 죽음의 공포에도 차별이 엄존한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해제에서 팬데믹 시대에 국가의 역할, 개인의 자유, 집의 의미,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진단 등에서 근본적인 사유의 전환이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 책이 “모범적 선구”라고 평가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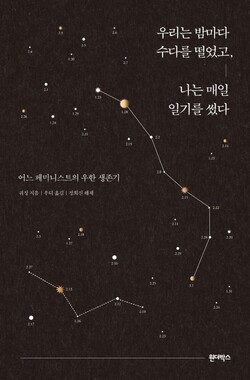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