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감 부식하고 불평등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결함 지적
‘능력의 폭정’ 줄이기 위한 ‘유능력자 제비뽑기’ 등 대안 제시
‘능력의 폭정’ 줄이기 위한 ‘유능력자 제비뽑기’ 등 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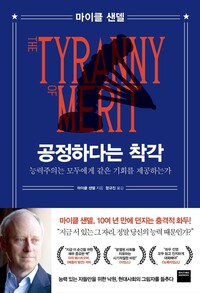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와이즈베리·1만8000원 여기 두 사회가 있다. 한 곳은 태어남과 동시에 계급이 정해지는 귀족정 사회이고, 다른 한 곳은 능력에 따라 계급이 달라지는 능력주의 사회다. 보통 이런 선택지 뒤엔 ‘당신은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따라붙겠지만(그리고 아마도 다수가 후자를 선택하겠지만),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이 뻔한 질문을 한 번 더 꼰다. “두 사회 모두에서 상류층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해 준다면, 당신은 어디를 택하겠는가?” 아마도 대답은 후자일 것이다. 생득적으로 주어진 승리보다, 재능과 노력으로 쟁취한 승리가 더 떳떳하고 더 폼이 나니까. 경제적 부에 더해 ‘능력 자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샌델 교수의 대답도 다르지 않다. “귀족적 특권과 달리 능력주의적 성공은 스스로의 자리를 스스로 얻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가 된다면 귀족정보다 능력주의 사회가 더 낫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더 “맥빠지는 일”이다. 귀족정 사회에서 가난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재능과 야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단순한 부 이상의 것을 향유하듯, 빈자도 단순한 궁핍 그 이하를 겪어낸다. 바로 모멸감과 절망이다. 샌델 교수의 새 책 <공정하다는 착각>은 원제(능력주의의 폭정, The Tyranny of Merit)가 암시하듯, 능력주의가 부자에게는 오만을, 빈자에게는 절망을 주는 방식으로 쌍방향 폭정을 저지르며 민주주의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발한다. 샌델 교수는 이번에도 주특기인 ‘생경한 질문 던지기’를 유감없이 발휘해 독자가 능력주의의 이면을 스스로 들춰보게 한다. 초반부터 질문은 능력주의 그 자체를 향한다.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입시·채용 비리 같은 ‘간섭’이 없다면, 그러니까 정말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능력주의는 한 사회가 지향할 만한 정의로운 원칙이 될 수 있냐는 물음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그는 능력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재능’이란 단어부터 해체하기 시작한다. “수백만 달러를 받는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받던 시대에 태어난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샌델이 유도하는 결론은 이렇다. “재능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이고(샌델이 아무리 노력한들 르브론 제임스만큼 농구를 할 수는 없다) (…) 내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농구가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인 여건)에 산다는 것도 역시 우연의 산물”이기에 “능력에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판단은 실수이자 자만”이라는 것이다. 샌델 교수의 문제의식은 이 ‘오만’이 공동체에 필수적인 사회적 연대감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줘야 할 이유도, 받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대감을 부식시키기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능력주의를 온몸으로 흡수한 ‘패자’는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한다. 이들은 공론장에 참여해 불평등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주저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공론장은 소수 엘리트 목소리로 채워지며 ‘공동화’ 된다는 게 샌델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한다. 굴욕감을 표현(“언제부터 미국이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까?”“언제부터 그들이 우리를 형편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까?”)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이 꾹꾹 삼켜왔던 모욕감과 분노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대학은 능력주의적 열망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지난 8월 대학 내 신문 ‘하버드 가제트’에 실린 샌델 교수. 와이즈베리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