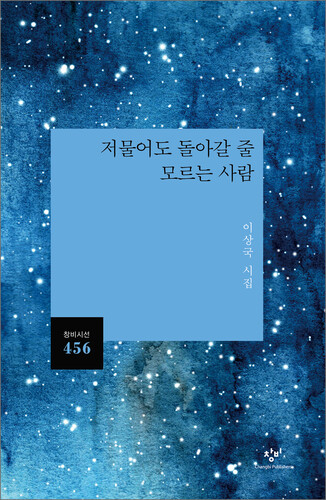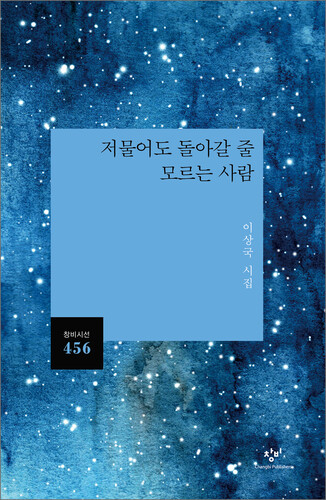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
이상국 지음/창비·9000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상국(
사진) 시인이 신작 시집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을 내놓았다. 1976년 등단 이후 45년 만에 여덟 번째 시집.
시인의 어조는 편안하면서도 그윽하다. 수록된 시들의 소재와 범위는 사뭇 다채롭지만, 그것들이 결국 향하는 것은 시인 자신이다. 시집 제목부터가 시인 자신을 가리킨다. “어려서부터 말 따라 노래 따라/ 해 지고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시 아저씨’)을 동네 문구점 주인은 무턱대고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아저씨라 불리기를 시인은 바란다.
“사장은 무슨 사장,/ 아저씨라고 불러다오./ 바람처럼 낙타처럼/ 마을과 장터를 떠돌았으나/ 아직 동네에서조차 이름을 얻지 못한 나를/ 그냥 아저씨라 불러다오./ 시 아저씨라 불러다오.”
아저씨라는 호칭은 무명이나 익명과 다를 바 없는 범칭이지만, 그 앞에 ‘시’를 붙이면 그 말은 아연 긴장과 활기를 띠게 된다. 정현종 시인의 ‘별 아저씨’에 이어지는 자부라 할 수도 있겠다. ‘오늘 하루’라는 작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흔한 여름날의 일상을 그렸는데, 마지막 연에서 ‘시 아저씨’의 본심이 드러난다.
“반세기가 넘게 평화가 지속되는데도/ 누가 또 별을 달았다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나는 벌써 오래전에 시인이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도반(道伴)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도반과 어울려 수행하는 모습을 보라.
“나도 한때는 시냇물처럼 바빴으나/ 누구에게서 문자도 한 통 없는 날/ 조금은 세상에게 삐친 나를 데리고/ 동네 중국집에 가 짜장면을 사준다.// 양파 접시 옆에 춘장을 앉혀놓고/ 저나 나나 이만한 게 어디냐고/ 무덤덤하게 마주 앉는다.// 그리운 것들은 멀리 있고/ 밥보다는 다른 것에 끌리는 날// 그래도 나에게는 내가 있어/ 동네 중국집에 데리고 가/ 짜장면을 시켜준다.”(‘도반’ 부분)
자기를 타자화하고 그렇게 타자가 된 자신과 더불어 도를 수행하는 경지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 “나를 아끼고 남을 존중하며/ 마스크와 한 철 보내고 나니/ 아무래도 내가 좀 커진 것 같다”(‘마스크와 보낸 한 철-코로나19를 견디며’)고 시인은 다른 시에서 쓰는데, 코로나와 마스크에 필적할 온갖 마군(魔君)의 훼방을 뚫고 반세기 가까이 시업을 이어온 시인의 내공이 그런 경지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사진 창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