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노예12년>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가끔은 마약까지 좋아했던 남자 론 우드루프(매슈 매코너헤이). 일하다 다쳐 병원에 갔다가 자신이 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고 살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도 악착같이 삶을 이어간다. 끈질기게 버티어낸다. 결국 의사가 말한 30일을 거뜬히 넘기고도 무려 7년이나 더 살아남은 남자의 실제 이야기.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로피 3개를 가져갔다.
같은 날 트로피 7개를 가져간 영화 <그래비티>에서 주인공 스톤 박사(샌드라 불럭)의 남은 산소는 고작 10퍼센트였다. 9퍼센트, 8퍼센트, 7퍼센트…. 점점 줄어드는 산소를 아껴 마시며 스톤은 필사적으로 지구를 향해 움직인다. 90분 동안 홀로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대기권에 진입한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이 두 편과 나란히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 <캡틴 필립스>에서 필립스 선장(톰 행크스)은 선원들을 대신해 소말리아 해적의 인질이 된다. 3박4일 동안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유독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았던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노예 12년>이 작품상을 받은 건 그중에서도 제일 힘들게 살아남은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혼자 실없는 생각을 했다. 7년, 90분, 3박4일의 시간이 12년의 세월을 이길 재간은 없는 게 아닐까, 허튼 짐작도 해보았다. 뉴욕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흑인 뮤지션이 루이지애나로 팔려가 목화를 따야 했던 실제 이야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솔로몬 노섭(추이텔 에지오포)은 매일매일 채찍질에 살이 찢기고 발길질에 피를 쏟는다. 그렇게 12년을 버틴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다시 자유인이 된다.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노예로 살아남는 처세를 가르치는 다른 흑인을 향해 솔로몬이 던진 이 멋진 대사를, 나는 이렇게 번역하기로 한다. “저는 ‘살아남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같은 소망을 담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론은 이렇게 말한다. “사실 나는 그리워요. 시원한 맥주도 마시고 로데오도 하고 여자랑 춤추러도 가고 애도 갖고 싶어요. 한번뿐인 인생이 지금 이 꼴이니 가끔은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용케 ‘살아남긴’ 했지만 그건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으니. 오늘의 공기를 내일도 들이마시는 게 살아남는(survive) 거라면, 어제의 일상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바로 살아가는(live)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 그리운 사람은 그저 ‘살아남’기 바쁜 현재가 더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비티>의 스톤 박사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애타게 구조 요청 하다가 우연히 들려온 지구의 소리. 희미한 전파를 타고 ‘아닌강’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들려왔을 때도 스톤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닌강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더 크게 울고 말았다. 그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눈물 나게 그리운 일상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아닌강, 개가 다시 짖게 해줄래요?” 결국 스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에게 울면서 매달린다. 지구의 흔해 빠진 개 짖는 소리가 우주의 누군가에겐 유일한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다.
쌍용의 24명은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손해배상 금액 47억원은 솔로몬 노섭을 옭아맨 족쇄보다 더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파업할 일 없는 프리랜서인 나는 어쨌든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 ‘남들’의 하나로 사는 마음이 편치 않다. 잘못된 법의 채찍질에 누군가의 삶이 찢기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건 참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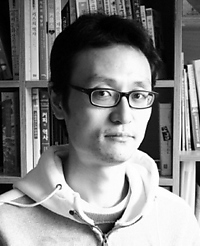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마지막 장면. 론이 황소 등에 올라탄다. 마구 날뛰는 황소 위에서 악착같이 버티는 론의 모습은 요동치는 운명 위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의 7년을 닮았다. 하지만 결국엔 땅바닥에 나동그라져야 끝이 나는 게 로데오다. 나는 우리의 삶이 로데오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난 황소처럼 미쳐 날뛰는 이 세상을 진정시킬 능력이 내겐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아닌강이 되는 것. 흔해 빠진 개 짖는 소리라도 실어 보내는 것. 그래서 이번 칼럼 원고료를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기로 했다.
김세윤 방송작가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마지막 장면. 론이 황소 등에 올라탄다. 마구 날뛰는 황소 위에서 악착같이 버티는 론의 모습은 요동치는 운명 위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의 7년을 닮았다. 하지만 결국엔 땅바닥에 나동그라져야 끝이 나는 게 로데오다. 나는 우리의 삶이 로데오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난 황소처럼 미쳐 날뛰는 이 세상을 진정시킬 능력이 내겐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아닌강이 되는 것. 흔해 빠진 개 짖는 소리라도 실어 보내는 것. 그래서 이번 칼럼 원고료를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기로 했다.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