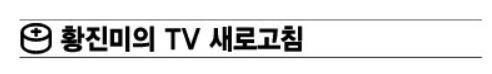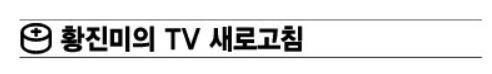<티브이 동물농장>(에스비에스)은 반려견 순심이를 떠나보낸 이효리를 보여주었다. 지난 9일과 16일 2주에 걸쳐 방송된 프로그램은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반려동물과 사별한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안겼다.
이효리는 2010년에 여섯살쯤 된 순심이를 입양한 뒤 10년간 함께 살았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이효리 부부는 온전히 순심이를 돌보며 그 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순심이와 오래 살던 옛집에 데려가고 근처를 산책하며 고즈넉한 시간을 가졌다. 옛날 사진을 보고 “순심이도 젊고 나도 젊었다”며 회한에 젖는 이효리의 모습은 반려견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한 시절이 지나감을 절감하는 사람의 쓸쓸함이 묻어났다. 이효리는 마지막 순간 다른 반려견들도 순심이에게 인사하는 듯 보였다며 죽음의 순간에도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 반려견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야기였다.
이효리는 순심이를 통해 한 생명체와 이토록 깊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순심이와의 만남은 이효리의 삶의 궤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1998년 데뷔 후 줄곧 최고의 가수이자 예능인으로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효리는 자신이 제작한 4집 음반이 표절 사기를 당해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효리는 극심한 혼란을 딛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모델이자 폭넓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소셜테이너’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순심이와의 만남이다.
마음고생을 겪던 이효리는 어린 시절 키우던 개 메리가 떠올랐다고 한다. 무심한 어른들에 의해 보신탕집으로 보내진 메리를 떠올리며, 이효리는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다니게 된다. 누구나 어린 시절 상처가 있지만, 개인적 상흔으로 묻어둘 뿐 사회봉사로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진 않는다. 성찰의 밑바닥에서 떠오른 메리에게 미안함을 씻고자 봉사를 다닌 이효리는 이미 성숙한 인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효리는 그곳에서 병든 순심이를 만나 입양했고, 어디든 이효리를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순심이와 함께 화보를 찍고 동물보호단체 후원을 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고, 신념에 반하는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해고노동자를 돕는 일에 나섰다. 자본주의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효리의 단단한 행보는 어떤 진보 인사의 번지르르한 말보다 훨씬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유기견 입양에 뜻을 비친 이상순과 결혼하고, 제주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예능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되었다. 여러 유기동물들과 함께 천천히 차를 마시고 요가 하며 사는 그의 일상은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새로운 화두이다.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 시절 영화 <플란다스의 개> <뽀삐> 등이 남의 눈엔 하찮은 짐승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족인 반려동물의 위상에 주목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입양된 반려동물들이 15~20년의 수명을 마치고 이제 자연사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대략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개·고양이 장례식은 유난스러운 ‘돈지랄’로 치부되며 조롱과 핀잔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려동물 상을 당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자책, 상실, 비탄, 고독, 우울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더욱이 반려동물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슬픔이다 보니 애도를 통해 치유되기 힘들다. 그래도 최근에는 ‘펫로스 증후군’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관련 책도 여럿 출판되었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줄이기 위해 적합한 장례의식과 충분한 애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노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키우던 개가 죽었을 때 더 많이 울고 슬퍼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족의 죽음은 대부분 일상공간과 분리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장례도 완전히 의례화되어서 죽음의 본질을 오롯이 체험하기 힘들다. 오늘날 노부모를 직접 수발하는 사람은 드물다. 독립 후 따로 살면서 간간이 찾아뵙다 노부모의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모시다가 임종 소식에 달려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반려동물은 근 20년간 살을 맞대고 매일 일상을 공유한다. 새끼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온전히 나에게 삶을 위탁한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애지중지 기르던 아기였으나 어느새 노쇠해진 반려동물의 몸을 닦고 약을 먹인다. 호전과 악화에 따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품에 안고 보듬는다. 이는 마치 어린 자식의 죽음이나 부모를 직접 간병하다 집에서 임종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흡사하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현대사회에서 일상공간 바깥으로 추방해버린 죽음을 직접 맞닥뜨리는 계기이자, 죽음의 본질을 사유하게 하는 체험이다. 하기야 반려동물과의 삶도 생의 본질을 체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던가. 반려동물이 아니었다면 똥오줌을 치울 일도 없고, 사람도 똥오줌을 배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산책길에 돋아난 풀이나 햇빛에 관심을 기울일 일도 없고, 자투리 음식이나 귀가 후 재회가 뭐 그리 신나고 반가운지 알지 못할 일이다. 동물을 돌보는 행위가 자신을 돌보는 행위가 되고,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기에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진리를 반려동물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다. 무지개다리 너머에는 먼저 간 반려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부디 진실이길. 그리움에 목이 멘다.
대중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