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김성윤의 덕후감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유튜브에서는 2012년 세계 최고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4억2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강남스타일에 대한 플래시몹, 리액션, 그리고 ‘건담스타일’을 비롯한 각종 패러디물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쯤 되면 강남스타일에 대한 패러디에 대한 패러디. 실로 어지러울 지경이다.
인기의 비결이 뭘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덕분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건 그냥 그렇다 치자. 왜냐면 같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 놓인 다른 콘텐츠들도 있는데 왜 하필 강남스타일만 뜬 건가 하면 더는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 퍼포먼스와 멜로디가 대중의 눈과 귀를 열었다는 점이다.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외국인들은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능수능란하게 춤을 춰대는 싸이의 ‘미니미’, 여자의 엉덩이를 보고 대놓고 환호하는 싸이, 그리고 ‘엘리베이터 가이’ 노홍철의 저질 댄스까지. ‘말춤’이 따라 하기 쉽다는 점도 빼먹을 수 없겠다. 팬들로 하여금 수행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쪽에선 대세라 할 수 있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한국말을 몰라도 쉽게 외울 수 있는 훅멜로디(‘옵옵옵옵’)가 가미되니 한마디로 말해 중독성 ‘짱’이다.
여기까지가 표준적 해석이다. 좀더 적극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진원지는 빌보드 성적 보도에 급급한 국내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 쪽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강남스타일의 풍자와 해학에 주목한다. “뚱뚱한 한국인 사이코가 반(反)자본주의적 메시지를 분출하고 폭발시키고 있다.”(가디언) “이 노래는 본질보다 돈과 외모를 강조하는 물질문화를 겨냥하고 있다.”(유튜브)
이러한 풍자와 해학성은 강남이 뭔지 몰라도, 그리고 굳이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더라도 뮤직비디오 영상 자체만으로 전달되는 모양이다. 노래하는 얼굴에 쓰레기가 날아들고, 선글라스를 쓴 채 화장실에서 랩을 토해내고, 정장 차림으로 사타구니 아래에 엎드려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단순 코미디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그의 말마따나 “옷은 세련되게, 춤은 싸구려같이”(dress classy, dance cheesy) 입고 추는 와중에 현대적 삶의 물신성과 속물근성을 폭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싸이와 강남스타일에 마음놓고 열광하면 되는 걸까.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강남스타일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광하는 대중의 정서 구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뚱뚱한 동양 남성 사이코’라는 맥락은 찜찜한 구석이 있다. 1930~40년대의 시리즈물 <찰리 챈>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 <팀 아메리카>(2004)에서 론리(lonely)를 ‘ronery’로 발음하는 김정일로 이어져, 이제는 ‘오픈 콘돔 스타일’로 들리는 싸이에 이르기까지, 영미권에서 보는 동양 남자의 스테레오타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오는 웃음의 이면,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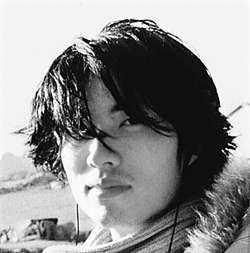 ‘성애화된 오리엔탈리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미심쩍은 사정은 우리 쪽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싸이 덕분에 미국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국위가 선양됐다는 둥, 케이팝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둥, 부산떠는 모습은 어딘지 흉해 보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세계 정복” 운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식의 빗나간 ‘애국주의적 상상’은 가히 꼴불견이라 할 만하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요즘은 전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반지성주의에 빠져 그냥 ‘즐기라’(enjoy it!)는 명령이 일종의 시대정신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스타일은 이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저 즐기면 될 뿐일까.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성애화된 오리엔탈리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미심쩍은 사정은 우리 쪽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싸이 덕분에 미국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국위가 선양됐다는 둥, 케이팝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둥, 부산떠는 모습은 어딘지 흉해 보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세계 정복” 운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식의 빗나간 ‘애국주의적 상상’은 가히 꼴불견이라 할 만하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요즘은 전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반지성주의에 빠져 그냥 ‘즐기라’(enjoy it!)는 명령이 일종의 시대정신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스타일은 이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저 즐기면 될 뿐일까.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