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볼>(2011)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엘에이(LA) 다저스가 ‘에라이 다 졌스’가 되기 직전 기사회생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간신히 두번째 승리를 따낸 아침에 이 글을 쓴다. 육상효 감독이 엊그제 트위터에 재잘대시길 “다저스 경기 보다가 화면에서 3루 앞자리에 앉은 선배를 봤다. 궁금해 그 자리가 얼마인지 문자로 물었더니 답이 왔다. 600달러. 흠.” 그런데도 5만6000석 다저스타디움엔 오늘도 빈자리가 없었다. 흠.
요 앞에서 던진 공을 나무방망이로 얼른 받아 치는 놀이가 대체 뭐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매일 모여드는 걸까? 영화 <미스터 고>의 대사처럼 “집(home)에서 출발해 집(home)으로 돌아오는 경기”라서? 전설의 포수 요기 베라가 남긴 유명한 말대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스포츠라서?
그런 흔해 빠진 말보다 훨씬 더 근사한 대사로 야구의 매력을 속삭이던 영화를 나는 알고 있다. 존 큐색이 주연한 작고 예쁜 영화 <화성 아이, 지구 아빠>(2007). 자기가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6살 아이 데니스와 그 아이를 입양한 싱글 대디 데이비드의 이야기. 둘 사이의 서먹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 볼 요량으로 아이를 야구장에 데려간 날, 세상에서 가장 심드렁한 여섯살배기의 표정으로 앉아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말한다. “야구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니? 10개 중에 3개만 쳐도 스타가 된다는 거야. 그것보다 조금만 더 잘 치면, 아주 조금만 더 잘 치면 슈퍼스타지.”
데니스는 좋게 말해서 괴짜, 하지만 또래의 언어로 말하면 ‘찐따’. 데이비드는 조금 ‘다른’ 아이를 자꾸 ‘틀린’ 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때문에 속상한 아빠였다. 그래서 아이를 야구장에 데리고 갔다. 10번 중에 7번 실패해도 괜찮아, 10개 중에 3개만 받아 쳐도 잘하는 거야, 야구는 그래, 인생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보자꾸나. 아빠는, 그리고 야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넌 이제 겨우 한번의 헛스윙을 했을 뿐이라고, 세상이 너에게 던진 강속구를 멋지게 받아 칠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이다.
<더 팬>(1996)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아빠가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이유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아빠는 모든 걸 야구에 빗대 말하는데, 어린 아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가르칠 때도 이런 식이다. “야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플레이는 희생플라이야. 왜 그런지 아니?” “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니까요?” “그렇지. 그 대신 아웃을 당했는데도 타율이 낮아지진 않아. 희생플라이는 타율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구가 인생보다 낫다는 거야. 야구는… 공평하거든.”
야구는 공평하지만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희생플라이를 날려 보내고도 박수받지 못한 아빠. 회사를 위해 열심히 희생번트를 댔지만 그걸 실적 계산에서 빼주지 않아 해고당한 아빠.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아빠가 선수 한명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누군가로부터 단 한번만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지만 그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맞이한 인생의 9회말에 끝내 역전 만루홈런의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으니. 점점 더 야박해지는 세상의 룰에 짓눌릴수록 야구의 너그러운 룰에 자꾸 더 열광하게 되는 자의 인생이란, 그저 쓸쓸하고 안쓰러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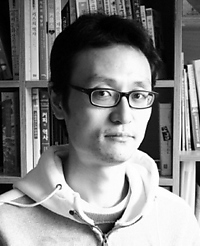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가을이다. <머니볼>(2011)의 한 장면에도 다시 마음이 머무는 계절이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 빌리(브래드 피트)가 어떤 선수의 자료 화면을 살펴보던 장면. 한 선수가 공을 친다. 힘껏 달린다. 마음이 급해서 1루를 돌다가 넘어지고 만다. 허둥지둥 흙바닥을 기어서 다시 1루로 돌아오는데 1루수가 웃고 있다. 주루 코치도 웃고 있다. 그제서야 고개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는 선수. 이런, 그가 친 게 홈런이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뒤늦게 베이스를 도는 선수의 뒷모습. 어쩌면 꼭 나의 뒷모습인 것만 같아 더 측은해 보이던 그의 등번호 5번.
자신이 친 공이 펜스를 넘어갔는지 확인해 볼 여유도 없이 오늘도 허둥지둥 흙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세상은 어김없이 강속구를 뿌려댄다. “야구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니? 10개 중에 3개만 쳐도 스타가 된다는 거야. 그것보다 조금만 더 잘 치면, 아주 조금만 더 잘 치면 슈퍼스타가 되지.” 조금은 위안이 되는 이 대사를 외우며 타석에 선다. ‘3할의 미학’이 부디 야구장 밖에서도 통하는 룰이 되기를 염원하며 힘껏, 10월의 오후를 휘둘러 본다.
김세윤 방송작가
가을이다. <머니볼>(2011)의 한 장면에도 다시 마음이 머무는 계절이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 빌리(브래드 피트)가 어떤 선수의 자료 화면을 살펴보던 장면. 한 선수가 공을 친다. 힘껏 달린다. 마음이 급해서 1루를 돌다가 넘어지고 만다. 허둥지둥 흙바닥을 기어서 다시 1루로 돌아오는데 1루수가 웃고 있다. 주루 코치도 웃고 있다. 그제서야 고개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는 선수. 이런, 그가 친 게 홈런이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뒤늦게 베이스를 도는 선수의 뒷모습. 어쩌면 꼭 나의 뒷모습인 것만 같아 더 측은해 보이던 그의 등번호 5번.
자신이 친 공이 펜스를 넘어갔는지 확인해 볼 여유도 없이 오늘도 허둥지둥 흙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세상은 어김없이 강속구를 뿌려댄다. “야구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니? 10개 중에 3개만 쳐도 스타가 된다는 거야. 그것보다 조금만 더 잘 치면, 아주 조금만 더 잘 치면 슈퍼스타가 되지.” 조금은 위안이 되는 이 대사를 외우며 타석에 선다. ‘3할의 미학’이 부디 야구장 밖에서도 통하는 룰이 되기를 염원하며 힘껏, 10월의 오후를 휘둘러 본다.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