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NEW),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제공
연말 극장가에서 ‘대작’ 영화 <대호>와 <히말라야>(가나다 순)가 오는 16일 동시에 개봉하며 한 판 승부를 벌인다. 자타공인 ‘1000만 배우’ 최민식과 황정민의 대결로 볼 수도 있다. 영화 포스터조차 두 배우의 얼굴이 전부다. 제작비도 엄청나다. <대호>는 170억원짜리이고, <히말라야>는 순제작비로 100억원을 들였다. 조선시대 마지막 호랑이와 에베레스트 휴먼 원정대라는 소재의 무게감도 팽팽하다. 올해 마지막 한국블록버스터의 대결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잡으러 왔다…영화 ‘대호’
손에서 총 놓은 조선 최고 명포수
일제시대 지리산 배경으로
씨가 마른 조선호랑이 사냥 나서
“최민식·산·호랑이 셋이 주인공”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하다. 맹수와 사냥꾼이 등장한다. <모비딕>이 거대한 고래를 추적하는 이야기라면, 여기선 호랑이를 뒤쫓는다. 그런데, 그놈이 일제강점기 때 자취가 끊어진 조선 호랑이고, 그를 닮은 조선 최고의 명포수가 어우러진다고 하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의 산야를 떠돌면서 찍은 <대호>(감독 박정훈)다. 때는 1925년 일제시대. 조선 최고의 명포수로 이름을 떨치던 ‘천만덕’(최민식)은 이제는 총을 들지 않는다. 지리산의 오두막에서 늦둥이 아들 ‘석’(성유빈)과 단둘이 약초를 캐면서 근근히 살아간다. 그런데 일본인들 사이에 최고의 전리품으로 통하는 호랑이 가죽을 얻기 위해, 일본 고관 ‘마에조노’(오스기 렌)는 일본군과 조선인 포수들을 다그친다. 도포수 ‘구경’(정만식)은 대호를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천만덕 영입에 나서고, 천만덕은 다시 총을 잡는다. 영화 전체를 가로지르는 조선 호랑이의 당당함은 ‘민족적 자존심’을 상징한다. 원래 조선 호랑이는 최대 몸무게 400㎏, 길이 3.8m로 전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위용을 자랑한다. 이번에 나오는 대호는 포수들에게 굴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위엄조차 갖췄다. 실제, 일제는 해수(해로운 동물)을 박멸한다는 명분 아래 조선의 상징이었던 호랑이 사냥에 나섰고, 조선 호랑이는 1921년 경주에서 잡힌 것을 끝으로 한반도에서 사라졌다. 같은 날 개봉하는 <히말라야>가 네팔의 해발 고도 8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그 속에 깃들고자 하는 산사람 이야기를 그렸다고 한다면, <대호>의 지리산(해발 1916m)은 배경으로만 머물지 않는다.조선인한테 그 산은 신성함과 애뜻함 등 온갖 정서가 계곡마다 서려 있는 곳이다. 이모개 촬영감독은 “천만덕과 호랑이 그리고 조선의 산, 이렇게 셋이 주인공”이라고 했다. 12살 이상 관람가.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찾으러 왔다…영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동료 주검 찾으러
오르는 엄홍길 대장의 실화 다뤄
광대한 자연 앞 무모할지 모르는
한국적 정서와 설경 잘 풀어내 2004년 5월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하고 산을 내려오던 원정대장 박무택은 ‘설맹’에 걸리면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부대장 백준호는 탈진한 후배 장민을 먼저 내려보내고 고립되어 있던 박무택을 구하러 왔지만 박무택이 숨지자 홀로 산을 내려오다 실종되고 만다. 나중에 박무택의 시신은 해발 8750m 지점에서, 나머지 두 대원의 시신은 8400m 지점에서 목격되었다. 박무택과 히말라야 8000m급 4좌를 함께 올랐던 엄홍길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에베레스트로 간다. ‘죽음의 지대’에서 시신을 옮기려 애쓰는 이야기가 주는 인상이 워낙 강렬한 탓에 영화는 대체로 실화에 충실하되 엄홍길과 박무택의 끈끈한 관계와 주변 인물들을 좀더 꾸며내는 정도로 만들어졌다. 해발 7500m 위로 올라가면 산소는 평지의 3분의1밖에 안 되고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피돌기가 줄어든다고 한다. 빨리 등정을 마치고 내려와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곳에서 24시간 넘게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분투했던, 엄홍길 대장이 이끈 원정대의 시도는 다른 나라 등반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영화는 그들이 무모했을지 몰라도 헛된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대한 자연을 제대로 담아낼 제작 기술과 함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생히 전달하는 것이 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였다.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화 속 박무택(정우)은 엄홍길(황정민)의 뒤를 따라 헐떡이며 산을 오르면서도 외친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나 등반훈련을 하던 강원도 산자락에서나 등반대원들의 태도는 한결 같다. 쉬지 않고 떠들며 웃고 우는 등반대원들을 보노라면 산악영화에도 ‘한국형’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장대한 설산을 걸을 때 차올라오는 고통과 희열을 묵묵히 담아두지 않고 말재간으로 계속 토해내는 영화 <히말라야>는 한국적 정서와 태도를 한짐 가득 지고 높은 산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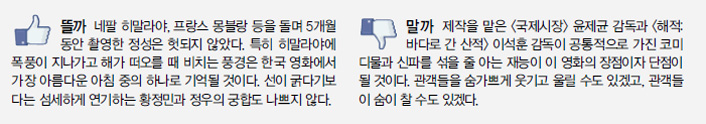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일제시대 지리산 배경으로
씨가 마른 조선호랑이 사냥 나서
“최민식·산·호랑이 셋이 주인공”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하다. 맹수와 사냥꾼이 등장한다. <모비딕>이 거대한 고래를 추적하는 이야기라면, 여기선 호랑이를 뒤쫓는다. 그런데, 그놈이 일제강점기 때 자취가 끊어진 조선 호랑이고, 그를 닮은 조선 최고의 명포수가 어우러진다고 하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진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의 산야를 떠돌면서 찍은 <대호>(감독 박정훈)다. 때는 1925년 일제시대. 조선 최고의 명포수로 이름을 떨치던 ‘천만덕’(최민식)은 이제는 총을 들지 않는다. 지리산의 오두막에서 늦둥이 아들 ‘석’(성유빈)과 단둘이 약초를 캐면서 근근히 살아간다. 그런데 일본인들 사이에 최고의 전리품으로 통하는 호랑이 가죽을 얻기 위해, 일본 고관 ‘마에조노’(오스기 렌)는 일본군과 조선인 포수들을 다그친다. 도포수 ‘구경’(정만식)은 대호를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천만덕 영입에 나서고, 천만덕은 다시 총을 잡는다. 영화 전체를 가로지르는 조선 호랑이의 당당함은 ‘민족적 자존심’을 상징한다. 원래 조선 호랑이는 최대 몸무게 400㎏, 길이 3.8m로 전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위용을 자랑한다. 이번에 나오는 대호는 포수들에게 굴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위엄조차 갖췄다. 실제, 일제는 해수(해로운 동물)을 박멸한다는 명분 아래 조선의 상징이었던 호랑이 사냥에 나섰고, 조선 호랑이는 1921년 경주에서 잡힌 것을 끝으로 한반도에서 사라졌다. 같은 날 개봉하는 <히말라야>가 네팔의 해발 고도 8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그 속에 깃들고자 하는 산사람 이야기를 그렸다고 한다면, <대호>의 지리산(해발 1916m)은 배경으로만 머물지 않는다.조선인한테 그 산은 신성함과 애뜻함 등 온갖 정서가 계곡마다 서려 있는 곳이다. 이모개 촬영감독은 “천만덕과 호랑이 그리고 조선의 산, 이렇게 셋이 주인공”이라고 했다. 12살 이상 관람가.
찾으러 왔다…영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동료 주검 찾으러
오르는 엄홍길 대장의 실화 다뤄
광대한 자연 앞 무모할지 모르는
한국적 정서와 설경 잘 풀어내 2004년 5월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하고 산을 내려오던 원정대장 박무택은 ‘설맹’에 걸리면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부대장 백준호는 탈진한 후배 장민을 먼저 내려보내고 고립되어 있던 박무택을 구하러 왔지만 박무택이 숨지자 홀로 산을 내려오다 실종되고 만다. 나중에 박무택의 시신은 해발 8750m 지점에서, 나머지 두 대원의 시신은 8400m 지점에서 목격되었다. 박무택과 히말라야 8000m급 4좌를 함께 올랐던 엄홍길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에베레스트로 간다. ‘죽음의 지대’에서 시신을 옮기려 애쓰는 이야기가 주는 인상이 워낙 강렬한 탓에 영화는 대체로 실화에 충실하되 엄홍길과 박무택의 끈끈한 관계와 주변 인물들을 좀더 꾸며내는 정도로 만들어졌다. 해발 7500m 위로 올라가면 산소는 평지의 3분의1밖에 안 되고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피돌기가 줄어든다고 한다. 빨리 등정을 마치고 내려와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곳에서 24시간 넘게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분투했던, 엄홍길 대장이 이끈 원정대의 시도는 다른 나라 등반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영화는 그들이 무모했을지 몰라도 헛된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장대한 자연을 제대로 담아낼 제작 기술과 함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생히 전달하는 것이 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였다.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화 속 박무택(정우)은 엄홍길(황정민)의 뒤를 따라 헐떡이며 산을 오르면서도 외친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나 등반훈련을 하던 강원도 산자락에서나 등반대원들의 태도는 한결 같다. 쉬지 않고 떠들며 웃고 우는 등반대원들을 보노라면 산악영화에도 ‘한국형’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장대한 설산을 걸을 때 차올라오는 고통과 희열을 묵묵히 담아두지 않고 말재간으로 계속 토해내는 영화 <히말라야>는 한국적 정서와 태도를 한짐 가득 지고 높은 산으로 간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