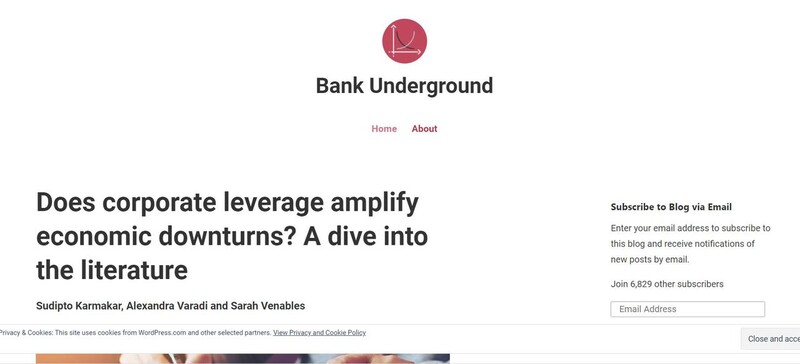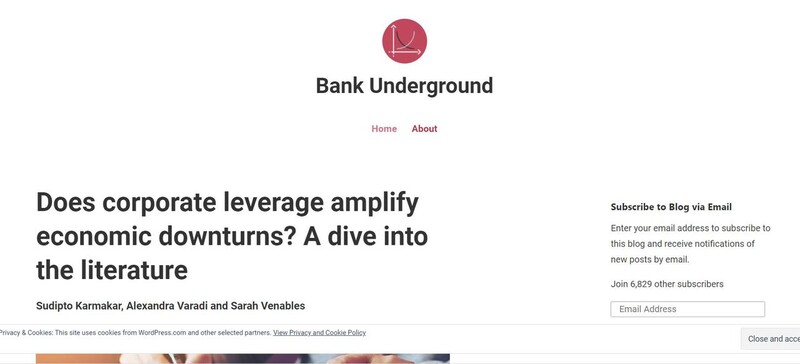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에는 ‘뱅크 언더그라운드(Bank Underground)’라는 게시판이 있다. 중앙은행 직원들이 작성하는 블로그로, 은행의 생각을 더 많이 공유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다. 중앙은행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자유로운 분석 보고서 등이 올라오며, 작성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것이 가능하다. 그대신 영국 중앙은행은 해당 게시판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공유하는 블로그이며, 저자의 견해가 반드시 은행의 견해는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가벼운 토론이 가능한 소통 공간을 만든 것이다.
중앙은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소통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체 경제를 좌우하는 통화정책을 다루는데, 이들의 생각과 연구 결과가 더 많이 사회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소통의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공표해야 하는 통계와 보고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등에 대한 자료만 주로 발표했다. 최근에는 여러 현안에 대한 내부 연구 보고서도 ‘이슈노트’ 등의 형식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아직 영국 중앙은행처럼 직원 개인의 연구 등이 공개되는 가벼운 소통 창구는 없다.
중앙은행이 과감한 소통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기관 특수성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라 다양한 의견이 자칫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으로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에서 근무했던 김진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중앙은행 직원 개인의 의견이지만, 국민은 은행 공식 견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미국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직적이다”며 “개인 홈페이지, 논문 등 의견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상대적으로 의견 표출이 자유롭다. 김 교수는 “중앙과 별개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견해를 말하는 편이다”라고 전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과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중앙은행은 우리나라와 구조적으로 다른 까닭에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소통과 혼선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은에서 근무했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이 가격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정책 기관이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닌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리 긴 호흡에서 의제를 던지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여유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공식적인 견해도 너무 공식적으로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영국 중앙은행처럼 공식 견해가 아닌 의견에 대해서는 언론과 사회가 열린 자세로 가볍게 받아들여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