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 고란 핸슨(가운데) 사무총장과 노벨경제학상위원회 위원들이 2021년 10월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화면 왼쪽부터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앵그리스트, 휘도 임번스이다. Claudio Bresciani/TT News Agency/REUTERS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 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7월은 최저임금의 달이다. 다음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언론이 대서특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보수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을 것을 알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쪽이 앞세우는 주장 가운데 대표적인 게 고용 감소(실업 증가) 효과다. 문재인 정부 초기 <조선일보>가 쏟아냈던 기사의 대부분이 이 주장에 근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통념을 실증적으로 반박한 사람이 2021년 노벨경제학상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카드(66)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다.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교수가 선택한 방법은 미국 뉴저지주와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동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뉴저지주는 1992년 1월 시간당 최저임금이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19%나 올랐고, 펜실베이니아주는 변동이 없었다. 1991년 10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4년 치 고용률을 분석했는데, 1993년 후반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뉴저지주의 고용률이 펜실베이니아주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기존 경제학 교과서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다. 기업이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기업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비용 증가를 상쇄한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최저임금과 고용은 별 상관없어
카드 교수가 공동연구자였던 앨런 크루거(2019년 사망) 프린스턴대 교수와 함께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도 고용과 최저임금이 관련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후학들의 연구 또한 같은 결론이다.( Cengiz·Dube·Lindner·Zipperer, 2019)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그렇듯이 주 경계선을 공유하는 지역은 주가 달라도 인적 구성이나 노동시장, 환경, 문화 등이 비슷하다. 이는 최저임금을 제외한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효과를 냈다. 의학의 임상실험이나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실험군(treatment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 비교 방식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뉴저지주는 실험군, 오르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조군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자연과학과 달리 사람과 사회의 경우 개인적 의지나 기타 다양한 변수가 뒤섞여 이를 분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는 이들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이 “경제학의 경험적 연구(emperical reasearch)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자연실험 방식을 경제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두루 활용한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가 언급한 카드와 크루거의 또 다른 업적은 저숙련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다. 이 역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통념(이민자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원주민의 고용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였다. 1980년 4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인들의 미국 이주를 이례적으로 허용한 적이 있다. 이때 약 12만5천 명의 쿠바인이 마이애미에 정착했고, 이로 인해 마이애미 노동력이 약 7% 증가했다. 카드와 쿠르거는 마이애미와 (이민자가 없는) 인근 4개 도시의 임금 및 고용 추세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먼저 이민해 들어온 쿠바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기존 주민들은 오히려 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 능력이 월등한 기존 주민들이 이민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는 직업으로 전환한 결과다.
실증연구로 통념을 뒤집다
카드와 함께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조슈아 앵그리스트(62·MIT대 교수)와 휘도 임번스(59·스탠퍼드대 교수)는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았다. 이들의 대표 연구 주제는 교육 분야다. 사람들이 어렴풋이 짐작하는 통념(교육 기간이 길면 소득이 높다는 생각)을 통계로 실증해냈다. 앵그리스트와 임벤스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는 도구로 활용한 것은 미국의 교육제도다. 미국은 주에 따라 16살 또는 17살이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생일이 지나면 자퇴할 수 있다) 상반기에 태어난 학생들이 하반기에 태어난 학생들보다 교육 기간이 짧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이들의 생애 소득을 따라가 보니 1분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4분기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소득이 낮았다. 추가 교육 1년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9%였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1년 먼저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소득이 9%나 낮아진 것이다. 교육과 소득 간의 연관성(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교육을 받을 확률)이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9%는 놀라운 결과였다고 노벨경제학상 위원회는 밝혔다.
이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진 이유가 단순히 방법론적인 기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세 사람 모두 경제학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불평등의 실제 전개과정에 관심을 기울인 학자들로, 실증연구를 통해 주류 경제학의 통념을 뒤집은 사람들이다. 노벨경제학상이 성장 이론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자 위원회는 1998년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을 비롯해 빈곤과 분배 문제에 천착한 학자들에게도 간간이 상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 안정에는 성장만이 아니라 분배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노벨경제학상 위원회가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친노조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세계적 흐름과 다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제도를 철폐할 것처럼 발언했다가 주워 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보도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 여부에 집중되었다. 세계 시계와 똑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려는 노력은 하길, 그들이 한때 ‘추앙했던’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조언한다.
sa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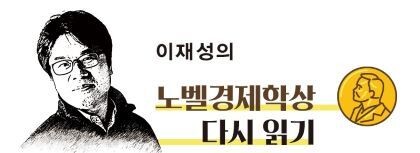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