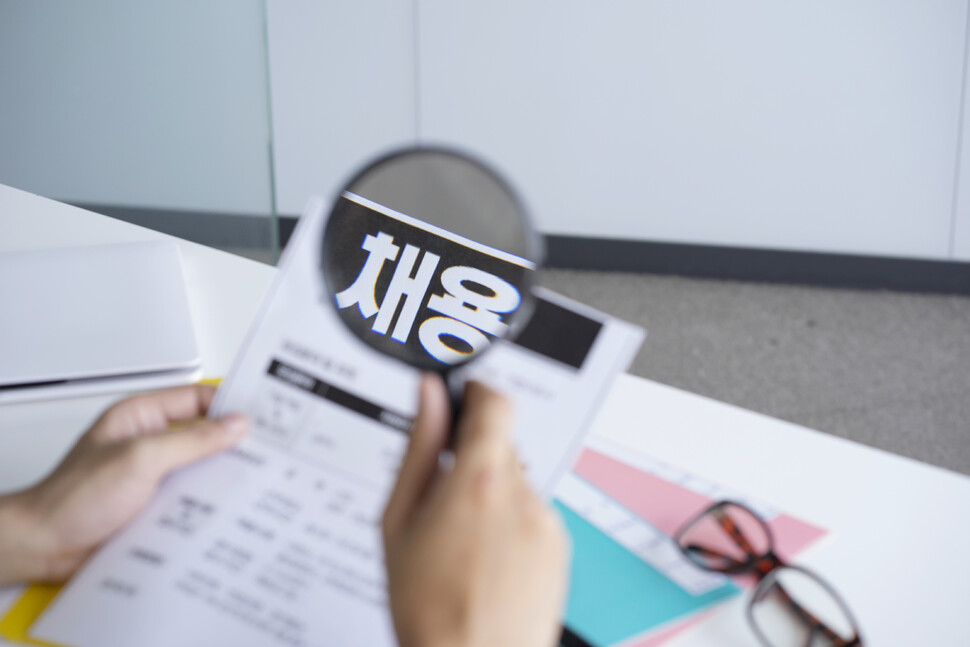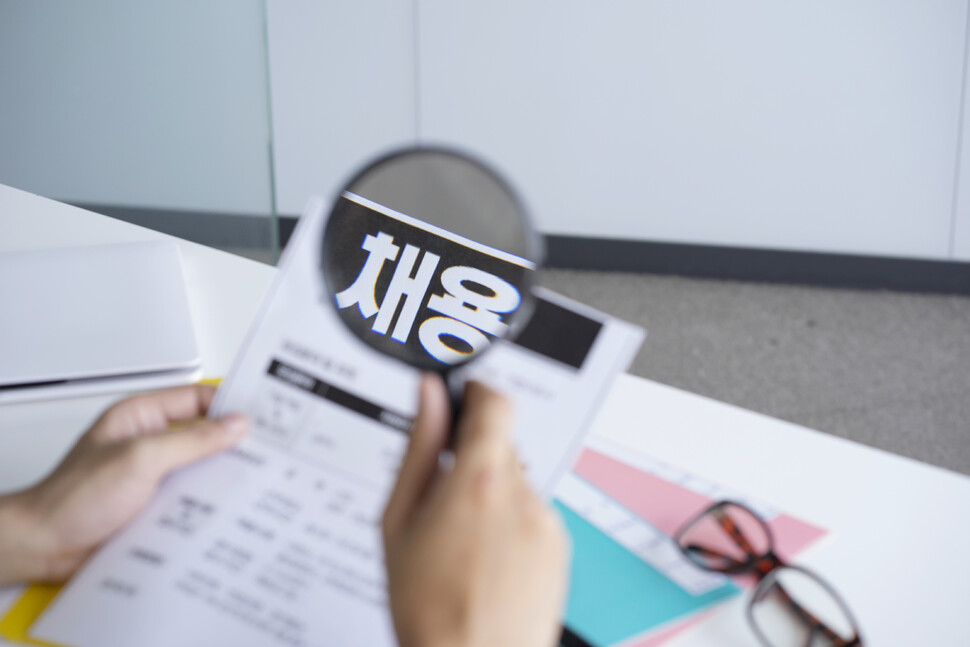▶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 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경제가 빠르고 큰 폭의 통화긴축 정책 수단으로 물가를 잡으려 할 때 그 대가로 실업률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명목(혹은 실질)임금상승률을 매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없다는 ‘필립스곡선’(1958년 발표)의 가르침이다. 영국의 경험적 실증자료(1861~1957년)를 분석해 도출한 이 곡선은 케인스 경제학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법칙’으로 여겨졌으나, 유효성을 둘러싸고 경제분석가와 정책담당자들 사이에 지금도 논쟁이 간혹 일어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상충 관계” 드디어 맞아떨어진 ‘필립스곡선’
단기에만 유효하고 장기에는 무기력하다거나, 경제·산업 구조가 크게 바뀐 새로운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변동이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고, 우하향하는 전통적 곡선이 이제는 누워버렸다는 분석도 있다. 팬데믹 이전에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필립스곡선이 당최 통하지 않는 ‘저물가 위험’으로 골치를 썩였다. 거의 완전고용 상황인데도 물가가 인플레이션 목표치(중장기 시계로 평균 2%)까지 좀처럼 오르지 않는, 필립스곡선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미스터리가 계속됐다.
그런데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완전고용)’이라는 전통 필립스곡선이 ‘뜻밖에도’ 잘 작동하는 계절이다. 인플레이션이 각국 경제를 휩쓰는 요즘 미국·한국 모두 물가가 크게 높아졌는데도 실업률은 오히려 사상 최저 수준이다. 2022년 7월 미국 실업률(3.5%)은 53년 만의 최저치고, 한국 실업률(2.9%)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다.
취업자로 보더라도 두 경제는 ‘고용 서프라이즈’를 지속 중이다. 미국은 7월 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가 시장 예상치보다 2배나 많은 52만8천 명을 기록했고, 상반기 전체로 일자리가 270만 개 증가했다. 한국도 1~7월에 월간 취업자가 83만~100만 명씩 늘고, 7월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중앙은행의 고강도 통화긴축 행렬로 미국 경제가 경기순환 주기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까지 무색하게 하는 견조한 고용 활황세로, 이는 퍼즐(수수께끼)에 가깝다. 요컨대 ‘이상하고 희귀하게도’ 필립스곡선이 작동하는 셈이다.
“실질임금 하락 탓 고용 확대” “생산인력 줄어든 탓” 분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기이한 현상에 ‘고용이 팽창하는 침체’(Jobful Recession)라는 낯선 이름이 붙여지고 여러 진단과 분석이 분분하다. 그 까닭으로 인플레이션이 지목되기도 한다. 경기둔화와 실질구매력 감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제품이 덜 팔리더라도 각국 기업은 높은 물가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실질임금도 감소하는 터라 고용을 오히려 확대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좋은 여건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팬데믹에 따른 거대한 퇴직 물결과 국제적인 노동자 이동의 제약, 또 인구구조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회복 속의 노동력 결핍’ 현상이 사상 최저 실업률의 배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인플레이션 시대는 기존의 익숙한 것들을 갑자기 붕괴시키면서 전통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현상을 낳고 있다. ‘인플레이션 속 고용 활황’이라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거의 분간하기 어려워진 고뇌와 혼돈의 계절이다. 경제학자 정운찬은 20년 전에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고용된 기득권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겠지만, 물가상승으로 고용이 늘어 그동안 실업 고통을 당하고 있던 노동시장 취약자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