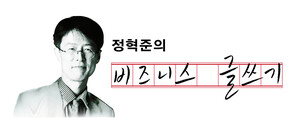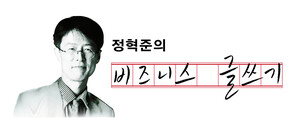① 글 쓸 때도 사람이 먼저다
②‘대한’을 대하는 자세
③‘의’와 전쟁을 선언하라
④‘빵들과 장미들’이 어색한 이유
⑤ 갖지 말고 버리자
⑥ ‘것’을 줄여쓰라
문장에서 앞에 나온 말에 맞게 뒤에 나오는 말을 적절하게 쓰는 걸 ‘호응’이라고 한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와 서술어는 호응해야 한다. 문법 용어로 쓰면 주어-서술어 일치, 또는 주어-서술어 호응이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다. 주어를 쓴 뒤 관형어와 목적어를 쓰고 나서 서술어를 쓰다보니 주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의 특징은 주어가 모든 사람이 알 만한 것이거나 연이어 나올 때 주어를 생략한다. 주어가 생략될 때 서술어와 호응을 맞추지 못하기도 한다.
주어와 서술어를 맞추려면 문장을 쓸 때 사람과 사물 가운데 어떤 것을 주어로 잡을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어에 맞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주어가 두 개나 들어간 문장을 한번 보자.
검찰은 김씨가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70여 차례 걸쳐 불법으로 대출받게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어는 ‘검찰’이다. 서술어는 ‘혐의를 받고 있다’다. 문장이 이상하다. ‘검찰이 ~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직이 혐의를 받는 게 이상하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문장이 길어서다. 문장을 짧게 쓰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주어가 하나일 때, 서술어가 하나일 때는 쉽게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한다. 하지만 주어가 생략되거나 주어가 두 개인 복잡한 문장일 경우 헷갈리기 일쑤다.
주어와 서술어가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문장을 간결하게 써야 한다.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와 서술어 간격이 벌어진다. 그러다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