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영어 문법을 배운다. 달달달 영문법을 외울 때 힘들었던 게 하나 있다. 영어 형용사 순서다. ‘주관적 의견+크기+나이+모양+색깔+기원+재료+목적’. 이런 차례로 형용사 순서를 외우고 객관식 시험을 치렀다. 오랜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형용사 순서가 바른 문장은 몇 번일까?
1. I saw a good big red wooden house.
2. I saw a good red big wooden house.
3. I saw a red wooden good big house.
4. I saw a wooden big red good house.
정답은 1번이다. ‘주관적 의견(good)+크기(big)+모양(red)+재료(wooden)’ 차례다. 직역 해보자. ‘나는 좋은 큰 붉은색 나무 집을 보았다.’ 어색하다. ‘나는 나무로 만든 붉은색 큰 집을 보았다’가 좀더 자연스럽다.
이 차이는 뭘까? 영어는 주관적인 기준을 앞세운다. 예문에서도 영어는 ‘주관적 의견(good)+크기(big)’을 앞세웠다. 반면 우리말은 남들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내용(‘나무로 만든’ ‘붉은색’)을 앞세웠다.
이처럼 우리말과 영어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영어 어순은 외우면서, 우리말 어순은 잘 모르는 사람이 무척 많다. 올바른 우리말 순서를 알아보자.
사람을 먼저 쓰고 큰 것부터 써라
첫 번째 법칙은 ‘사람이, 수와 양보다 먼저다’이다. 우리말은 사람과 사물을 먼저 쓰고, 반대로 영어는 수와 양을 먼저 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커플이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영어는 이렇게 쓴다. “The couple had two cups of Americano.” 우리말로 쓸 때는 이렇다. “그 커플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사물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숫자를 놓고 보자. 어느 걸 먼저 써야 할까? 영어는 숫자가 먼저다. 영어는 ‘Five apples’라고 한다. 우리말은 ‘사과 다섯 개’가 자연스럽다. ‘싱싱한 사과’를 5개 사고 싶을 때, 영어로는 ‘Give me five fresh apples’라고 하는 게 맞지만, 우리말은 ‘싱싱한 사과 다섯 개 주세요’가 맞다.
문제는 번역투 문장에 익숙해 숫자를 먼저 쓴다는 점이다. 숫자가 먼저 나오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일본어투 ‘의’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데 있다. ‘사과 다섯 개’라고 하면 ‘의’가 필요 없지만, ‘다섯 개의 사과’라고 쓰면 ‘의’를 넣어야 한다.
두 번째 법칙은 ‘큰 것부터 먼저 써라’다. 영어로 편지 주소를 쓸 때 순서를 기억하시는지? 미국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써야 한다. ‘사람 이름→동호수→아파트 이름→주소→도시→국가’차례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쓰면 된다. ‘국가→도시→주소→아파트 이름→동호수→사람 이름’으로 적는다. 영어로 편지 쓸 때는 작은 단위부터 쓰지만, 우리말로 편지 쓸 때는 큰 단위 먼저 쓴다. 개인을 내세우는 서양과 공동체를 앞세우는 동양의 사고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사고 차이는 글 쓰는 순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문장을 보자. “마케팅 본사 조직을 확대해 영업 부문을 강화한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 마케팅 조직과 본사 조직은 어디가 더 큰가? 본사가 더 크다. 본사를 우선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이다. “본사 마케팅 조직을 확대해 영업 부문을 강화한다.”
우리말 순서대로 써라
세 번째 법칙은 ‘우리말 문장 순서대로 써라’다. 우리말 순서는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다. 예문을 보자. “이 제품으로 실시간 재고현황 조회를 할 수 있다.” 문장 순서가 좀 어색하다. 우리말 문장 순서와 다르기 때문이다.
어색한 부분은 ‘실시간 재고현황 조회’다. 이걸 풀어쓴다면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이다. ‘실시간’이란 부사가 ‘조회한다’는 동사를 꾸미는 거다. “이 제품으로 재고현황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자연스럽다.
다음 예문도 ‘부사’ 순서가 맞지 않는다. “급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우리는 보통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라고 표현한다. 이 점을 반영해 문장을 고치면, “차선 급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쳐야 한다.
다음 문장은 순서가 어긋나 뜻도 엉망이 됐다. “보다 많은 아동학대 임시보호소가 필요하다.” 임시보호소 성격이 이상하다. ‘아동을 학대하는 임시보호소’라는 뜻이 됐다. 우리말다운 표현은 ‘학대받는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장소’다. 바르게 고치자. “더 많은 학대아동 임시보호소가 필요하다.”
순서를 바꾸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장이 많다. “A기업은 올해 큰 수익을 올렸지만, 내년엔 경기불황이 예상돼 쉽게 번 돈을 투자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부사 ‘쉽게’ 위치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해 엉뚱한 뜻이 돼버렸다. A기업이 쉽게 돈을 번 게 아니라, 번 돈을 쉽게 투자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동사 앞에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수정해보자. “A기업은 올해 큰 수익을 올렸지만, 내년엔 경기불황이 예상돼 번 돈을 쉽게 투자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네 번째 법칙은 ‘수식하는 단어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이다. 예문을 보자. “강원도는 1일 태풍으로 유실된 국도 9곳을 복구했다.” 강원도가 국도 9곳을 복구한 날이 1일이었다. 그런데 이 문장은 1일이라는 날짜가, 태풍 바로 앞에 있다. 문장을 읽은 사람은 태풍이 1일에 불었고, 며칠 뒤에 복구한 것으로 이해한다. 꾸며주는 내용 바로 앞에 숫자를 쓰자. “강원도는 태풍으로 유실된 국도 9곳을 1일 복구했다.”
찬물에도 순서가 있듯, 문장에도 순서와 차례가 있다. 차례를 지키며 문장을 써야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 문장을 쓰면 새치기한 사람에게 화를 내듯, 독자는 혼란스러워 ‘화’를 낸다.
정혁준기자
june@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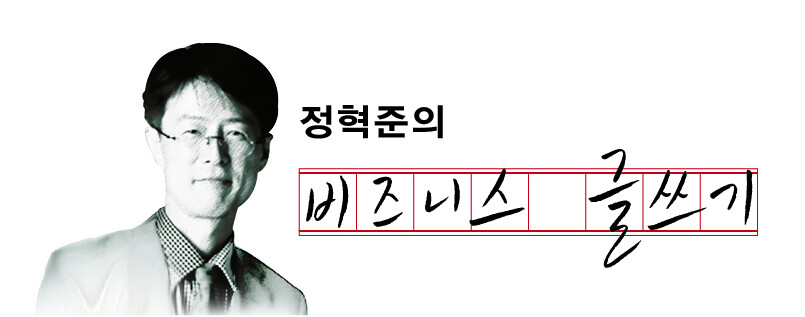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