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서 투자한 국외펀드(IIG)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에서도 사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폰지 게임’이라 불리는 다단계 금융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남은 돈은 빼돌린다. 하늘까지 올라갈 것처럼 보였던 피라미드는 의심이 벽을 타고 오르는 순간 무너진다.
다단계 사기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던진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온 찰스 폰지는 1919년 환율 차이를 이용한 먹잇감을 포착했다. 만국우편연합은 편지 수취인이 답신할 때 필요한 ‘국제반신권’을 발행해왔다. 회원국이면 어디서나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다. 스페인에서 미국 돈으로 1센트에 불과했던 이 쿠폰은 미국 우체국에서는 6센트 우표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쿠폰값이 미국에 견줘 훨씬 쌌다. 폰지는 이들 나라에서 반신권을 사들여 미국에서 우표로 교환해 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폰지는 1919년 12월 보스턴에 증권사를 차렸다. 본인이 대표이면서 유일한 직원이었다. 그는 투자자에게 45일 만에 50%, 90일 만에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증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정 당국이 우표와 현금의 교환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차익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폰지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공의 수익률을 만들어 냈다. 입소문이 나자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 폰지가 사무실 책상으로 다가가려면 발목 높이로 쌓인 돈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폰지를 믿은 투자자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미국에서 2만7천장의 쿠폰이 유통되고 있는데 폰지의 거래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1억6천만장이 있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폰지가 끌어모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만큼 충분한 쿠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20년 8월 <보스턴글로브>는 폰지의 과거 범죄 행각을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폰지는 체포됐고 8개월 만에 약 2천만달러를 끌어모은 사기극은 끝이 났다. 1949년 브라질의 한 자선병원에서 숨을 거둘 당시 폰지의 주머니에는 75달러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폰지는 역설적으로 금융발전에 기여했다. 1934년 미국 의회는 증권거래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출범했다. 폰지와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여년 뒤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인 뉴욕에선 사상 최대 규모 폰지 사기극의 씨앗이 뿌려졌다. 1960년 버나드 메이도프는 22살의 나이에 5천달러의 밑천으로 장외주식 중개회사를 세운다. 이 구멍가게는 1989년 미국 나스닥시장 거래의 5%를 점유하는 버나드메이도프투자증권(BMIS)으로 성장했다. 덕분에 메이도프는 나스닥 거래소 위원장(1990∼1993년)까지 지냈다.
그는 위험이 큰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고 선전했다. 실제 시장이 들쑥날쑥해도 해마다 연 10~15%의 수익률을 고객에게 선사했다. 메이도프가 내세운 미끼는 일반인이 알아듣기 힘든 ‘분할 태환’(split-strike conversion)이란 기법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00지수에 속한 우량기업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그 주식에 대한 풋옵션(팔 권리)을 사고 콜옵션(살 권리)을 팔면 증시의 폭락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권 전문가들은 같은 기법을 현실에 적용해보니 결과가 달랐다며, 메이도프가 폰지식 다단계 수법을 쓰고 있다고 의심했다.
메이도프는 명성이 높은 지인들을 이용해 피라미드식으로 펀드를 판매하며 몸집을 불려나갔다. 세계적인 대형은행에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프랑스 비엔피(BNP)파리바, 스페인 방코산탄데르,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일본 노무라 등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막대한 금액을 집어넣었다. 국내에서도 대한생명(5천만달러), 한국투자신탁운용(2천만달러) 등 여러 금융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했다.
<포브스>는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다면 메이도프의 20년 사기극은 계속됐을 것이라고 했다. 2008년 시장이 붕괴되자 공포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했다. 메이도프는 기관투자자를 찾아 파격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새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지만 소용없었다. 그해 12월 70억달러를 돌려줘야 했지만 은행 잔고에는 10억달러밖에 없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회사에 들어온 자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사기 피해 규모는 650억달러로 추산됐다. 이듬해 71살 생일을 맞은 그는 법정 최고인 15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메이도프 사태에 대해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우리가 믿던 부유함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빚을 통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를 축적한 미국의 민낯”이라고 짚었다. 국제금융 전문가 이브라힘 워드는 “금융의 세계화라는 낙원 속에 금융권은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를 받았고, 규제 당국은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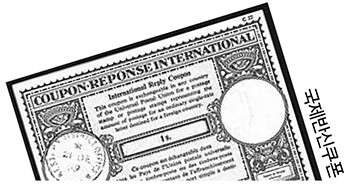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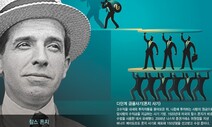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