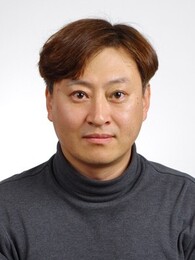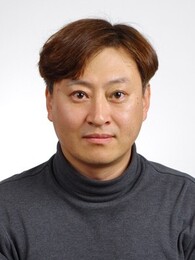“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전 미래통합당 김대호 의원이 2020년 총선 직전에 한 말이다. 그는 이 말로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말은 접근성을 얘기할 때 흔히 드는 비유다. 여기서 장애는 물리적 장애만 가리키지 않는다. 시끄러운 곳에서 티브이(TV)를 볼 땐 누구나 청각장애를 겪는다. 자막 기능이 티브이에 필요한 이유다. 손을 쓸 수 없는 위급 상황에선 음성비서가 생명의 은인이 되기도 한다. 2017년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선 물에 빠진 낚시꾼이 침수로 터치스크린이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에서 ‘시리’로 911에 구조 전화를 걸어 목숨을 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
시잉 에이아이(Seeing AI)’란 시각장애인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들었다. 주변 사물을 인식해 글자와 음성으로 알려주는 앱이다. 이 앱을 개발한 사큅 셰이크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시잉 에이아이를 내놓은 뒤 한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서 받은 메일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이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는데, 시잉 에이아이가 안내문을 읽어준 덕분에 오랑우탄에 관한 얘기를 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했다.
트위터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팀 케터링은 선천성 언어장애인이다. 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며 휴대폰에서 노트 앱을 열어 글자를 써서 운전자와 의사소통을 했는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택시기사가 읽기 힘들어했다. 그걸 보고 그는 글자를 키워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안내해주는 ‘
카드질라(Cardzilla)’ 앱을 만들었다. 그 앱을 할머니께 보여드리자 할머니가 흥분하며 말했다. “얘야, 드디어 너랑 대화할 수 있게 됐구나.” 팀 케터링은 ‘받아쓰기’ 버튼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넣어둔 ‘손쉬운 사용’ 메뉴도 맥락은 같다. ‘접근성’이란 말 대신 굳이 ‘손쉬운 사용’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자. 화면 속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확대·축소하고, 자막을 활성화하는 것이 장애인만을 위한 기능일까. 물리적 홈 버튼이 고장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홈 버튼을 대체재로 제공받지 않으면 홈 화면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 이동권은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만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웹도 다양한 변수와 환경을 고려해 이동과 접근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1996년 5월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백남중 부장은 국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 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이, 2006년에는
한국웹접근성그룹이 출범했다.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창시자 팀 버너스 리는 “웹의 힘은 장애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성에 있다”라고 말했다.
접근성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다양한 환경 변수를 고려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보편적 설계요, 포용적 디자인이다. 그 공간이 지하철이든 웹이든 스마트폰이든. 그 사용자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래서 똑같은 이용자 화면(UI)이 아니라 똑같은 이용자 경험(UX)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세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두 발로 이동하든, 휠체어나 리프트로 이동하든 ‘지하철에 탄다’는 경험을 해쳐선 안 된다. 엘리베이터나 시리, 시잉 에이아이와 카드질라는 언제 오감과 신체의 불편함을 맞닥뜨릴지 모를 당신과 그 가족 모두를 포용하는 장치다.
이희욱 미디어전략팀장
asadal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