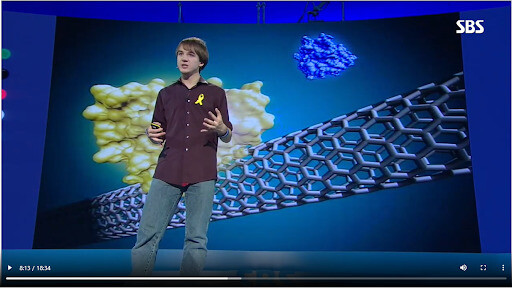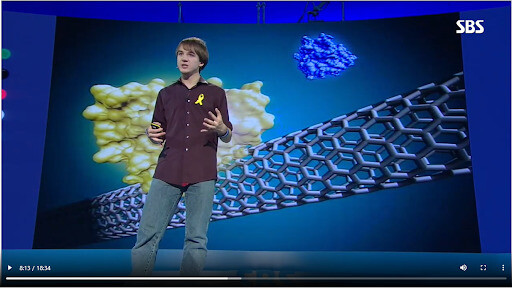2004년부터 열려온 서울디지털포럼 기조강연엔 빌 게이츠, 팀 버너스 리, 유발 하라리 등 세계적 저명인사들이 섰는데, 2014년엔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가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앳된 얼굴이었다. 그는 10대 과학자로 알려진 잭 안드라카(
사진)였다. 잭 안드라카는 15살에 새로운 췌장암 진단 키트를 발명한 천재 과학자다. 그의 키트를 이용하면 기존 진단 방법의 2만분의 1도 안되는 3.5달러로 췌장암 발병 여부를 간단히 판별할 수 있다. 진단에 걸리는 시간도 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무대에 올라온 10대 소년은 본인이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13살 무렵 가까운 이가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췌장암은 진단비가 800달러에 이르고 진단율이 너무 낮아서 생존율이 3%밖에 안된다. 그는 여름방학 내내 구글과 위키피디아를 뒤졌고, 췌장암 발병과 관련된 단서를 찾았다. 전기 코일 실험을 하다가 온 동네가 정전이 되고 대장균 실험을 하던 도중 아버지가 감염돼 고생을 하기도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실험실에서는 암세포 배양 플라스크를 이동하다가 깨먹기도 하고 원심분리기가 고장나는 등 쉽지 않는 과정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장벽은 과학 논문을 보기 위해 내야 하는 35달러였다고 했다.
잭 안드라카는 “지식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우리 모두 오픈액세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10대 천재 과학자가 말한 ‘오픈액세스’는 비용과 장벽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연구성과물 또는 자유로운 연구물 접속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2000년 초반 들어 학술출판사 구독료는 급등했다. 미국과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ARL)에 따르면 1986년부터 2006년까지 학술지 구입비용은 약 320% 증가했다. 학술출판사의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2002년 2월 부다페스트에서 연구자들이 주축이 돼 오픈액세스 선언을 했다. 학술 저작물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전세계로 확산됐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논문의 44.6%가 오픈액세스 논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공적기금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반드시 오픈액세스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에 가깝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지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오픈액세스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지만 그 결과인 학술논문을 보려면 학술출판사에 돈을 내야 한다.
논문은 연구자의 전유물일까? 아픈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관련 논문은 절실할 것이며 잭 안드라카처럼 호기심이 많은 아이에게는 그 어떤 만화책보다 재미있을 수 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된 연구과제가 공공재가 되려면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잭 안드라카처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진짜 정보의 바다에서 혁신적인 발명을 향해 헤엄칠 수 있게 하자. 그 시작은 닫힌 정보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다.
강현숙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경제사업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