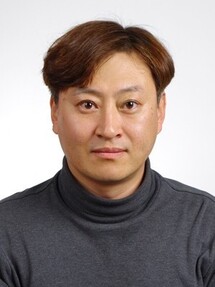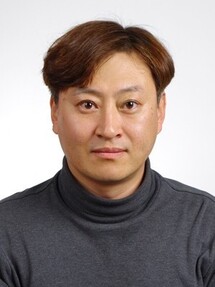지난해 7월,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언론인들에게
물었다. “소셜미디어가 미국 언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매우 부정적’(26%)이거나 ‘다소 부정적’(41%)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18%)에 그쳤다. 응답자의 94%는 소셜미디어를 무척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었다.
소셜미디어는 언론을 구원할 것인가. 한때 모두들 그런 꿈을 꾸었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태우고 트위터로 기사 목록을 반복 전송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페이스북은 변덕쟁이이고, 트위터는 돈키호테다.
한국은 여전히 포털이나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보는 비중이 높은 나라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보자.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검색엔진이나 뉴스 수집 서비스로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69%로 가장 높았다. 언론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비중은 5%에 그쳤다.
정작 소셜미디어들은 뉴스 콘텐츠를 마뜩잖아 한다. 페이스북은 2014년부터 꾸준히 뉴스 도달률을 떨어뜨려 왔다. 지난해 11월엔 직원 1만1천명을 해고했는데, 저널리즘 관련 부서 직원이 적잖이 포함됐다. 제휴 언론사의 뉴스 수수료를 줄이겠다는 정책도 만지작거린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틱톡과 경쟁할
숏폼 동영상에 쏠려 있다. 페이스북이 뉴스를 버리려 한다는 얘긴 더이상 소문이 아니다.
트위터에 기댈 수도 없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수많은 인력이 트위터를 떠났다. 직원도, 광고주도, 이용자도 미련을 버렸다.
마스토돈은 대안이 되기엔 설익었다. 설령 트위터만큼 성숙한다 해도 그들의 플랫폼일 뿐이다. 언론은 또 다시 소셜미디어에 기생하며 눈치를 봐야 한다. 칼자루를 흔드는대로 끌려다닐 게 뻔하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최소 30명이 넘는 중국 반체제인사들이 트위터에서 제대로 메시지가 노출되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지금이 기회다. 소셜미디어가 뉴스를 지울 때 언론사는 튼튼한 디지털 성채를 차근차근 쌓아야 한다. 소셜미디어에 뉴스를 흘려보내는 대신, 우리 플랫폼 안에서 선순환하는 정보들을 채울 때다.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저널리즘을 구원하진 않는다.
<뉴욕타임스> ‘스노우폴’은 서사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기술이 언론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 10년 넘도록 ‘나홀로 급변하지 않는’ 언론 환경에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다. 내러티브 저널리즘이 강물처럼 흘러넘쳤고, 기교가 스토리를 가렸다. 돈 많은 미디어들의 보여주기식 내러티브 콘텐츠는 호응도, 수명도 짧았다. 콘텐츠에 걸맞는 옷을 찾기보다는 무겁고 화려한 장신구로 채우기에 바빴던 시절이었다.
낡고 불편한 갑옷은 벗자. 남의 장터를 기웃거리며 좌판 펼 기회를 엿보는 것도 부질없다. 오래 달릴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우리 경기장 안에서 뛰자. 우리의 스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만의 플랫폼을 구축할 때다. 뉴스레터든, 로그인월이든, 유료화든, 뉴스 아울렛이든. 신뢰의 저널리즘은 미더운 플랫폼을 딛고 자란다. 소셜미디어에 담아둔 달걀을 우리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담아야 한다. 머잖아 부화해 울타리 안을 누빌 독자들을 만나려면.
이희욱 미디어전략팀장
asada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