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의 기어박스 자리(왼쪽)와 현대차 GV80 기어박스(오른쪽)
자동차 실내의 버튼 수는 적어야 할까, 많아야 좋을까. 무엇이 운전자를 위한 걸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걷는 길은 저마다 다르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버튼 수를 확 줄인 사례다. ‘자동차 버튼 전쟁’에 불을 붙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모든 인풋은 에러”…머스크의 버튼 최소화 전략
테슬라는 최근 신형 전기차 ‘모델S 플레이드’ 차량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운전대 옆에 붙어있던 기어 조작 막대를 없앤 점이다. 운전자의 제어 없이 주행·후진·주차 등을 자동차가 알아서 선택하는 기능을 넣어서다. 완성차 업계에선 최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신형 모델S 인도식 행사에서 “모든 인풋(운전자의 조작)은 에러(잘못된 것)”라고 했다. 차량의 조작 버튼을 최소화해 운전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테슬라는 앞서 내놓은 전기차 모델3와 모델Y에선 차의 속도와 연료 상태 등을 표시하는 운전석 앞 계기반도 없애버렸다. 운전자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테슬라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은 운전석 오른쪽 대형 화면을 눌러 조작할 수 있다. 자동차의 각종 부속품과 안전·편의 기능을 한 곳에서 제어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 조절, 옆거울(사이드미러) 접기, 실내 수납함과 트렁크 여는 것도 모두 여기서 한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는 정반대 길을 걷는다. 자동차에 전자 장비가 대거 적용되면서 이를 조작하는 차량 내부의 버튼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와 모델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실내 버튼 수 증가는 요즘 완성차의 전반적인 추세다. 이러다 보니 외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차가 만드는 고급 차 브랜드인 제네시스 ‘GV80’ 차를 탄다는 한 금융회사 임원은 “운전석 주변에 버튼이 워낙 많아서 뭐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른다”며 “차를 사고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버튼도 많다”고 말했다.
현대차 GV80 운전석(위)과 테슬라 모델Y 운전석(아래)
현대차 GV80 운전석 문(왼쪽)과 테슬라 모델Y 운전석 문(오른쪽)에 붙은 버튼
현대차 GV80 운전석 위 실내등(왼쪽)과 테슬라 모델Y 실내등(오른쪽)에 붙은 버튼
실제로 현대차 제네시스(GV80)와 테슬라 전기차(모델Y)의 실내를 비교해봤다. 지난해 출시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V80 운전석에 앉아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수를 세어보니 모두 89개다. 운전석 문에 18개, 운전석 문과 운전대 사이 6개, 운전대 14개(패들 시프트 2개 포함), 공조기 패널 22개(터치스크린 제외), 기어박스 14개, 운전석 머리맡 실내등 10개, 운전석 시트에 5개의 버튼이 붙어 있다.
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세어본 테슬라 모델Y의 운전석 주변 버튼 수는 15개뿐이다. GV80의 6분의 1이다. 물론 테슬라 차량에 없는 통풍 시트, 운전자 마사지 기능, 필기 인식 등 편의 기능이 GV80엔 많은 영향도 있다. 하지만 실제 GV80을 5시간 넘게 운전하며 눌러본 버튼은 10개 남짓이었다. 기능이 너무 복잡한 탓에 유튜브에는 GV80의 실내 버튼 사용법을 알려주는 설명 영상도 적잖이 올라와 있다.
자동차 실내 버튼 수에 정답이 있진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래의 방향은 단순화라 점친다. 김학선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유니스트 미래차연구소장)는 “비행기가 컴퓨터화되며 조종석 버튼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동차 안의 불필요한 버튼이 사라지고 조작이 단순해지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며 “현대차 등 기존 완성차 업체는 개별 업체로부터 부품을 각각 납품받아서 단순히 조립하는 현재의 관행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테슬라보다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기능의 통합과 단순화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었던 건 백지상태에서 자동차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부품 납품 업체, 조립 인력 등 ‘딸린 식구’가 많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의 사정은 다르다.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지금은 중소 부품회사가 현대모비스 등 완성차 업체의 부품 계열사에 개별 부품을 공급하면 모비스가 이를 다시 모듈(부품 덩어리)로 만들어 완성차 업체에 건네고 공장에서 이를 단순 조립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자동차 버튼 통합으로 수많은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전성 측면에선 대형 화면에 각종 기능을 몰아넣은 테슬라보다 개별 버튼 제어 방식이 더 낫고 기계식의 아날로그 버튼을 여전히 선호하는 소비자도 많다”며 “차를 처음 만드는 테슬라가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르게 기존 완성차 업체는 변화 흐름에 맞춰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미국 애플이 복잡한 키패드를 없애고 홈버튼 하나 달린 휴대전화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던 2007년이 그랬다. 당시 기존 휴대전화 제조사는 버튼 수를 최소화한 아이폰의 인기를 ‘찻잔 속 태풍’으로 평가 절하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맞불을 놓기 위해 키보드를 붙인 울트라 스마트폰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휴대전화 회사는 애플을 따라갔다.
자동차나 휴대전화 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 기존 은행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과 달리 이용자 인터페이스(이용자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단순화해 대형 시중은행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리라 예상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은 부서마다 자기네 기능을 앱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다 보니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게 만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글·사진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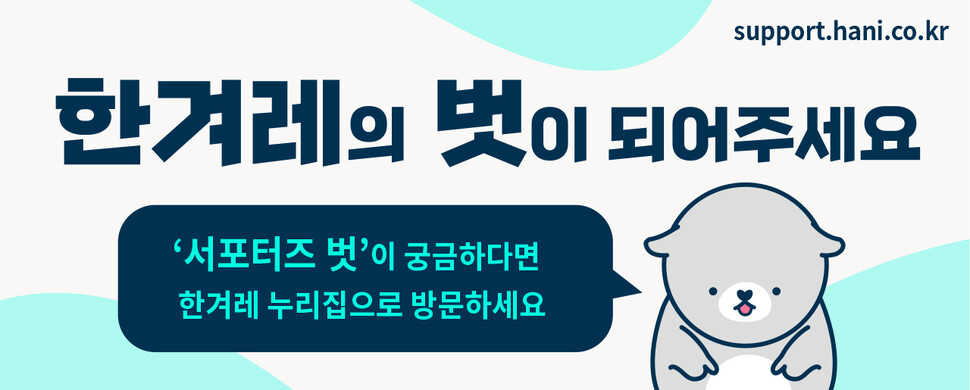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