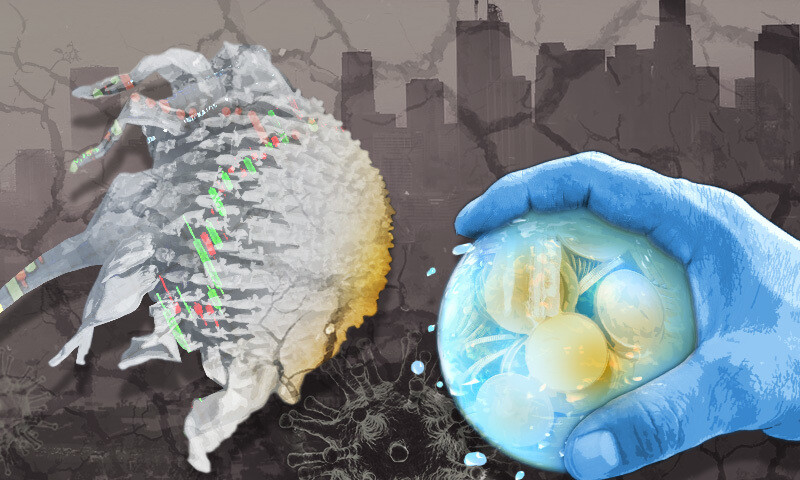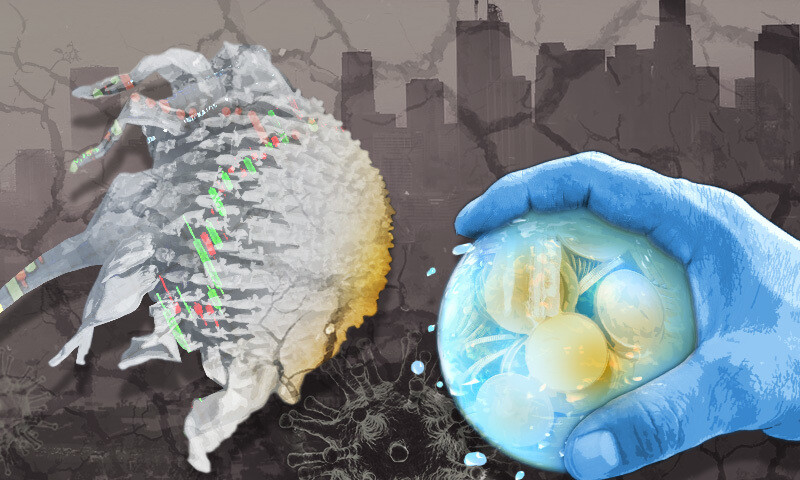외환위기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서 줄곧 하락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1997년 7월 800 부근에 있었던 주가는 외환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500으로 떨어졌다. 위기 발생에 따른 공포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위기가 발생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자 주가가 350대까지 또 한 번 떨어졌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다. 1998년 주식시장이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한 달 사이에 68%나 상승했다. 뉴욕에서 외채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때마침 외국인도 매수에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시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우량 기업의 주가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다. 외국인 매수가 뜸해진 3월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 석 달 만에 277까지 52% 하락했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 기록했던 저점보다 더 내려간 건데 이때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주가 움직임을 통해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시장은 ‘위기 발생에 따른 공포-상황이 정리되면서 오는 안도-실제 지표 확인에 따른 불안’순으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포와 상황이 수습된 데 따른 안도감 모두가 주가가 반영되면서 V자 움직임이 완성됐다. 두 번째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닥칠 상황은 경기 둔화이다. 질병으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영향이 쏟아져 나올 텐데 주식시장이 나쁜 수치를 가정해 움직였어도 실제 수치를 보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국내외 경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간 경기 확장에 따른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경제 활동이 멈췄기 때문에 큰 폭의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부양대책의 강도를 고려할 때 빠르게 회복될 거란 시각도 있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로 -30%와 4조 달러를 내세우고 있다.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쪽에서는 여러 선진국 정부가 4조 달러의 부양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 힘이 셀지 아직 판단하기 힘들지만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달 전만 해도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운운했는데 큰 경기 둔화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지나친 낙관이기 때문이다.
고점 대비 주가 하락 폭이 10%로 줄었다. 10%는 경기 둔화가 아닌 일반 상황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 폭이다. 더는 주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시장이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이종우 주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