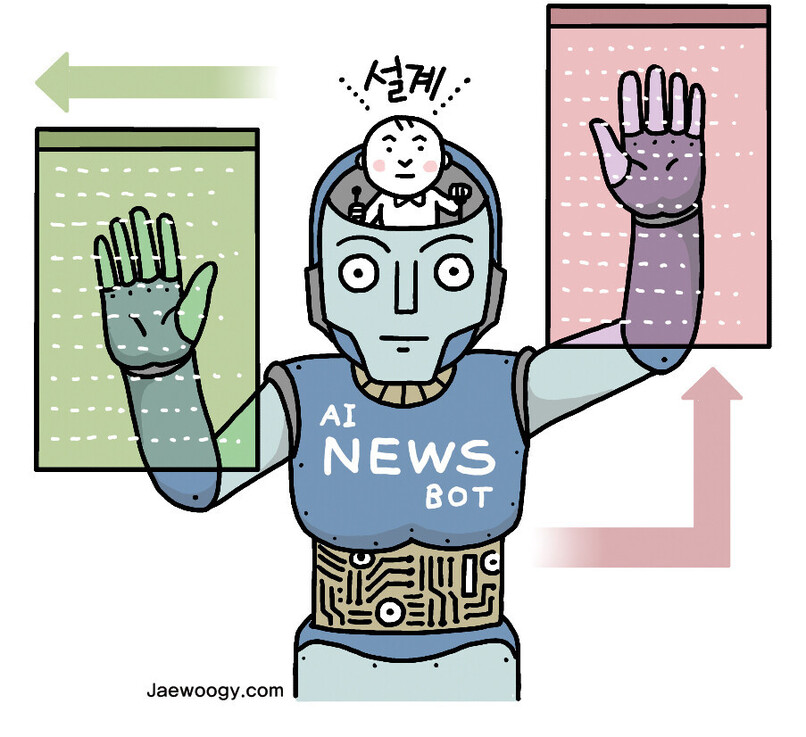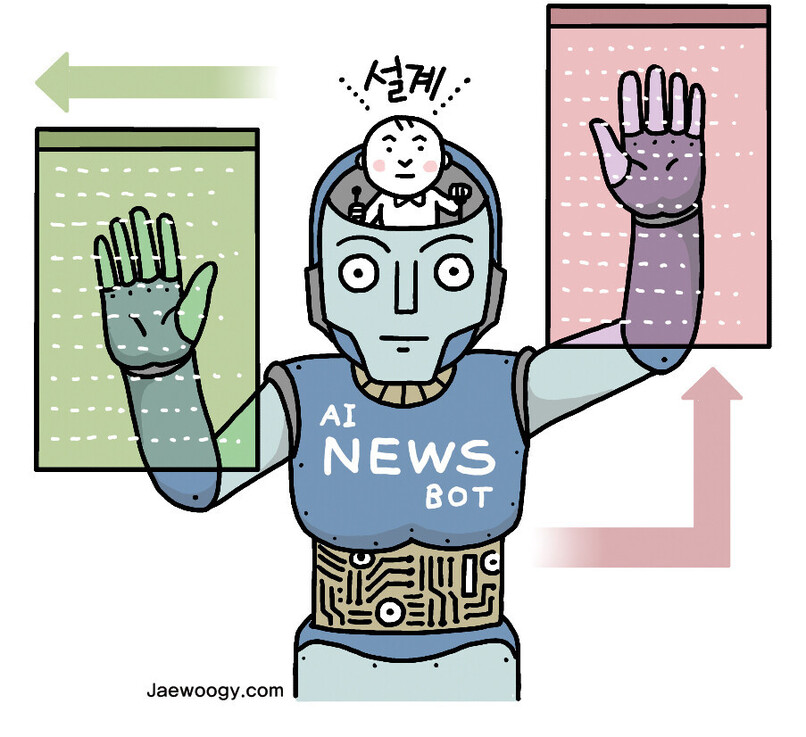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잇따라 기업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의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플랫폼 사업자 쪽은 영업기밀 유출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회에는 포털의 뉴스를 배열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다. 오는 27일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공청회도 열린다. 지난 3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와 매출액을 확보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포털 사업자들이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정요구 권한도 이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작업에 한창이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공개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안)’에서 추천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공정성·책무성을 3대 핵심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보면,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개시 때 콘텐츠 자동 배열의 주요 기준을 알려야 한다. 알고리즘 자체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성별·연령 같은 알고리즘에 반영된 기준은 공개하라는 뜻이다. 이 기본원칙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최종 확정된다.
사업자 쪽에선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업기밀 공개에 가까운 요구라고 맞서거나 정부의 알고리즘 개입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시각도 내비친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작동 기준 공개 요구는 사업자들의 핵심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알고리즘 논란은) 투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비자 개성이 달라 그 기준이 충돌해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 자체가 알고리즘 불투명성이 아닌 정치적 견해 등 특정 성향이나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는 취지다.
네이버 쪽은 “(정부와 국회의) 제도 논의 상황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지난 2018년에 꾸렸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결과를) 다시 한 번 외부에 공개하는 작업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감독 체계와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 규율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산업육성 관점에서만 추진되고 있을 뿐,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건에서 나타난 인권문제나 위험성 등을 간과했다는 지적에서다.
선담은 최민영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