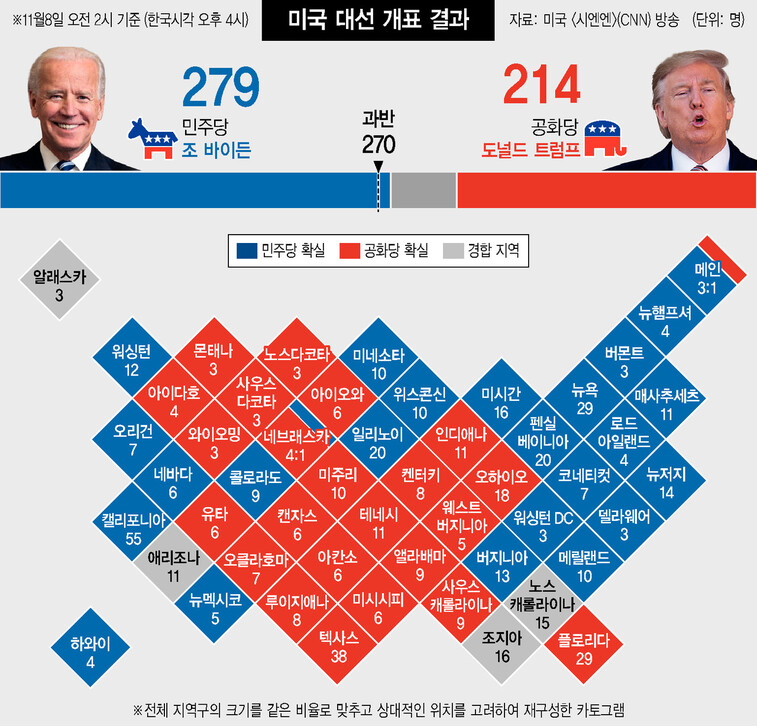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7일 밤(현지시각)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윌밍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그에 대조되는 바이든의 포용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상황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며 바이든에게 길을 열어준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강력한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에서 치러졌다. 온건 성향의 바이든은, 분열적 언행을 쏟아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트럼프를 꺾는 대항마로 적임자였다. 연방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의 경륜은 78살 고령이라는 단점을 희석해줬다. 바이든은 올해 초 민주당 경선 때 당내 지지를 흡수하기 위해 노선을 더 좌클릭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뿌리쳤다고 한다. 본선에서 트럼프를 꺾는 데는 자신과 같은 실용주의 노선이 낫다는 점을 당원들이 선택해줄 걸로 믿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전략가 리스 스미스는 <애틀랜틱>에 “많은 전문가들이 몰랐던 점은 사람들이 ‘트럼프 드라마’와 당파성에 지쳤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편가르기와 돌발 행동에 지친 유권자들이 오히려 개성은 약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통령을 원했다는 얘기다. 바이든은 경선과 본선 내내 ‘품격과 통합’을 강조하며 트럼프와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에 사회주의 색깔을 입히려 지속적으로 애썼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상대방이 온건 성향의 바이든이었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2016년 트럼프에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호감도가 높았던 점도 승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4년 전 클린턴은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10%포인트나 높았다. 당시 민주당이나 버니 샌더스 지지층 상당수가 대선에서 투표를 포기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4년 전의 쓰라린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단합한 것도 중요한 요소다. 바이든은 경선 경쟁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중도하차하자, 전화를 걸어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특히 샌더스의 요구를 수용해 기후변화 등 주요 정책을 세우는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꾸리며 그를 포용했다. 중도부터 진보층에 이르는 당 안팎의 다양한 세력을 ‘반트럼프’ 전선으로 아우른 셈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7일 밤 워싱턴 ‘비엘엠(BLM·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광장’에서 바이든 당선자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봄부터 미국을 덮친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조건은 바이든에게 커다란 기회가 됐다. 트럼프는 기민하고 솔직한 대응으로 정치적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위험성을 깎아내리는 길을 택해 경제와 인명 피해를 동시에 키웠다. 바이든은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핵심 메시지로 파고들며 자신을 ‘믿음직한 코로나19 사령탑’으로 부각했다. 그는 보건 전문가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고, ‘집콕’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 <시비에스>(CBS)가 이번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금 경제 재건보다는 코로나19 통제가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바이든 투표자의 8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투표자는 18%만 동의했다. 65살 이상 노인층에서의 트럼프의 득표 우위가 4년 전 7%에서 이번에 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것도,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노인층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