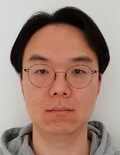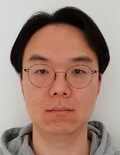[왜냐면] 김해식ㅣ핀란드 오울루 시민
북유럽 국가들이 만들어놓은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해 학자, 전문가들의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으로 혹은 사회학적 분석으로 이를 설명하려 합니다. 저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핀란드에 10년 넘게 살면서 와닿는 것은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관점의 기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1933년 덴마크 작가 악셀 산데모세가 쓴 소설에 “보통 사람들의 법칙”(Law of Jante, 얀테의 법칙)이라는 10가지 법칙이 소개되었는데, 북유럽 국가 사람들의 보편적 도덕 관습, 우리로 치면 ‘장유유서’처럼 대부분 당연히 받아들이는 윤리 규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 가르치려 들지 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이 있는데 이 10가지 법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특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하며 그래서 협동해야 한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더 똑똑하다고, 과시하지도 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어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상을 받은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박수를 받을 때, 수상자들은 많이 쑥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우리로 치면 어린 중학생이 나이 지긋한 일흔살 노인에게 반말하는 정도의 느낌을 서로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도덕적 규범이 공동체가 협동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 토대, 즉 보편적 복지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경쟁을 통해 소수의 승자를 길러내는 미국식 영웅주의와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우리만의 공동체 의식,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그려졌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통해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익숙하고 더 좋은 스펙을 만들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10대, 20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낙오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지기 쉽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안 좋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만의 공동체 의식이 빛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강원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차들이 달려가는 모습이라든가, 세월호 때 전국의 민간 잠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는 모습이라든가, 조금 더 멀리는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라든가, 모두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고 협동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기사를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경쟁을 통한 성장일까요, 연대를 통한 평등한 공동체 구축일까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복지제도를 만들고 공동체가 연대하고 협동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세상을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