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1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가 용산 철거민 희생자 유족 등과 함께 용산 참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다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왜냐면]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지금 노회찬이라면, 뭐라 할까요?” 노회찬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노회찬은 없는데, 사람들은 노회찬을 찾는다.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답답함 때문이기도 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분투하다가 홀연히 떠난 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하리라. 어느 경우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3주기를 맞으며 명필름, 시네마6411과 함께 다큐 영화 <노회찬6411>을 제작해 노회찬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노회찬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노회찬6411>은 영웅 서사가 아니다. 선운사 참당암에서 고뇌하던 한 청년이 용접공이 되어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고, 진보 정치인이 되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 생애를 마감한 이야기다. 노회찬과 동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인생역정을 노회찬의 생애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용접 노동을 할 때나, 비합법운동으로 지명수배되어 쫓길 때나,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의정활동 할 때나, 지역을 누비며 낙선 인사 할 때나, 일관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의 헌신과 열정이었다. 그의 한결같았던 삶, 진정성이 그를 남다른 정치인으로 각인시켜주었다.
우리는 모두 노회찬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다. 답답한 가슴 뻥 뚫리게 하는 촌철살인의 언어 한 방, 2004년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 노동자·농민 대표들의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용산 철거민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비를 맞던 노회찬. 각자의 기억들은 <노회찬6411> 속에서 노회찬을 만나면서 현실이 된다. 그러고 나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추억하게 될 것이다.
노회찬의 개인적 바람은 소박했다. 노동자를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 <노회찬6411>과 함께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노동자들 또한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도 들려주고 싶다.
<노회찬6411> 제작으로 또 한차례 작별을 맞게 될 줄은 몰랐다. 첫번째 작별은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황망한 작별이었기에 이번엔 이별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안타까움, 원망스러움까지도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이별식이 되면 좋겠다. 노회찬을 그리워하지만, 그와 만남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노회찬을 만나서 작별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만큼, 아쉬움 남기지 않는 이별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하는 만큼, 6411 버스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의 꿈은 우리의 가슴에 묻고, <노회찬6411>과 함께 그를 보내드리는 이별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별식은 대형 복합상영관들이 아니라 독립예술극장들에서 치러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감독과의 대화, 인터뷰, 출연자들과 만남도 진행된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배우 문소리가 관객을 만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으로 할인쿠폰 혜택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노회찬6411> 제작을 후원한 1만2천여명 서포터스의 이름을 수놓은 엔딩 크레디트와 함께 영화관을 찾는 분들 모두 이별식을 잘 마무리하시길 빈다.
2009년 7월18일 오후 청와대를 향해 용산 참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다가 경찰들에게 가로막히자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용산 철거민 희생자 유족들. 노회찬재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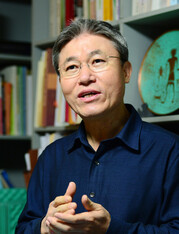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