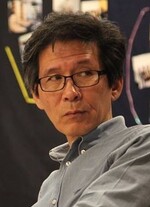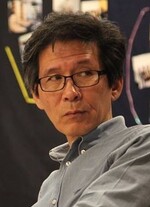연극 <산재일기>의 엔딩 장면. 노회찬재단 제공
[왜냐면] 곽봉재 |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노회찬재단이 무대에 올린 연극 <산재일기>는 전국의 산재 피해자를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았다. 연극 첫머리에 등장하는 67년생 박용식씨는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공작물을 절삭하는 밀링기에 잘린 손목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러려니’ 했다고 한다. 70년대 ‘구로공단에서만 하루에 잘린 손가락이 가마니 한짝, 손목이 가마니 한짝’이라는 자조 섞인 농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흔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이번엔 나구나 했다는 얘기다. 마치 죽음이 모두에게 언젠가는 오듯이 노동자에게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고 여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려니’ 해야 할까?
그러려니. 사람이 다쳐도 그러려니, 죽어도 그러려니. 기계에 뜯긴 제 살점을 보고도 그러려니 하는데, 흔하고 하찮은 다른 사람이라면 뭐. 유구한 ‘그러려니’의 역사가 있잖나. 인디언들, 흑인들 잡아다가 하루에 썩은 대구 한마리, 주인 나리들 안 먹는 닭모가지, 닭다리 먹이며 부려 먹으면서도 그러려니.
산업화 초기 유럽 노동자들은 밧줄에 걸쳐서 잠자고 하루 20시간 일한 임금으로 바게트 하나 받아도 감지덕지(?)하지 않았냐고 했던 ‘그러려니’들.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인건비 안 들여야, 적게 들여야 이문이 생기는 게 사업인데, 그래야 돈이 불어나는데, 조금 다쳤다고, 일하다가 몇명 죽었다고 법석을 떤다고? 다치고 죽어 일자리 비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데 뭐. 그러려니 하라고 윽박지르는 그러려니들. 법도, 제도도, 관리들도,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자 만드는 학교도, 놀랍게는 제 살을, 목숨을 갈아 넣어야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려니 해왔다. ‘그러려니’들이 흔하고 하찮게 취급할 때 굴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밥은 치욕이다. 연극 <산재일기>는 치욕을 밥으로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밥을 치욕으로 만든 것들에 대한 고발장이다.
텅 빈 무대에는 의자와 박스 몇개가 놓여 있다. 의자는 이리저리 옮겨지고 박스는 쌓였다가 흩어져 놓인다. 의자는 자리를 상징한다. 부모의 자리, 스승, 친구, 동료, 이웃의 자리. 서열도 차별도 없는 자리가 있는 반면 권좌인 법관이나 관료, 정치인과 사장의 자리가 있다. 무대의 의자는 권력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오가고, 배우들은 때로는 산재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를 연기한다. 자리는 충돌하고 뒤섞인다. ‘그러려니’ 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강요하는 자리와 그 부당함을 승인해버린 자리, 끝내 ‘그러려니’에 머물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자리까지.
연극의 줄기는 산재와 이를 다루는 법과 제도의 구멍에 있다. 무엇보다도 법이 돌보지 않는 고통에 주목한다. 부연하면 법이 보려고 하지 않는, 법이 무능해서 볼 수 없는 영역이다. 교섭권도 없는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부터 딸을 잃은 아버지, 아이에게 유전된 재해, 부모의 빈자리, 그 상실과 가난을 떠안은 어린 자녀가 그렇다. 이 연극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곳은 노동법과 산재법과 제도들이 보지 않으려 하고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영역에 있는, 절대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삶이다.
일하다 죽고 다치는 일에 ‘그러려니’ 못 하는 사람들은 관객이 되어보시라. 산재를 둘러싼 문제들은 생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한 구분은 집에 돌아가 곰삭을 때까지 생각해보시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발의한 고 노회찬의 정신까지 담아. 삶은 존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