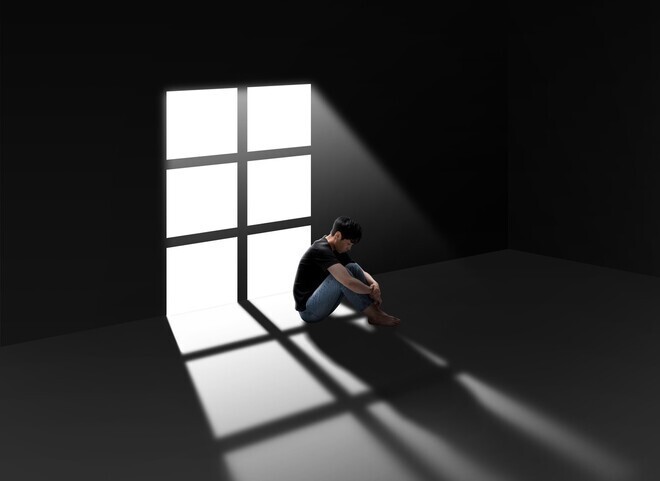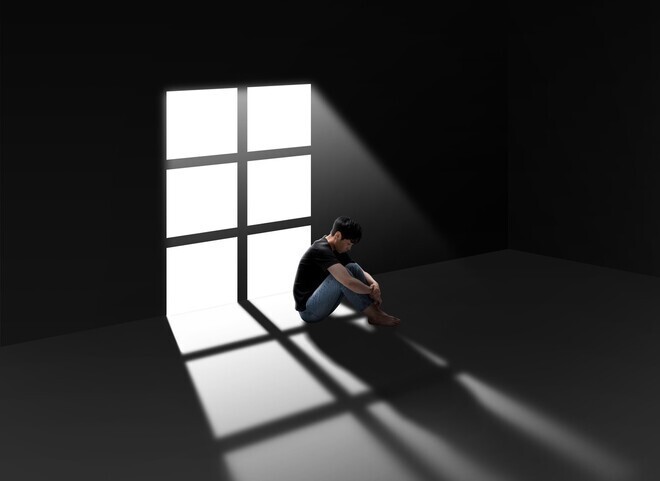[왜냐면] 손자영 | 27살 자립준비청년
얼마 전 보육원을 퇴소해 자립에 나선 만 18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두명이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은 처지의 자립준비청년으로서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됐기에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보육원에서 퇴소했던 7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아졌다. 자립정착금은 올랐고, 퇴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매달 40만원 자립수당을 받게 됐다. 만18살이었던 퇴소 연령도 희망자에 한해 24살까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등지는 청년들이 나오자, ‘이만큼 지원하는데 또 뭘 지원해야 하느냐’ ‘자립정착금을 더 올려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의 자립은 돈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내가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아도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해줄 사회 분위기 등이 필요하다. 당사자 시각에서 이뤄지는 복합적인 솔루션인 셈이다.
자립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재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지원전담요원이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에 15곳뿐이다. 또한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이 살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평균 85.4명으로 촘촘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020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보고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과의 충분한 교감이 있기도 전에 요원들이 빈번하게 교체되면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전담요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당사자 커뮤니티도 더 많아져야 한다. 커뮤니티에서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이를 통해 어렵게 자립에 도전하고 있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퇴소 5년까지 청년에게 집중돼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그 이후로도 이어져 정서적 지지대로 남을 수 있다. 현재는 민간 주도로 당사자 자조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조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때 주민센터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내 상황과 환경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게 너무 어려웠다. 자립준비청년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한 일일 텐데,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는 이유는 미디어에 있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캐릭터는 어떤 역경도 웃으며 이겨내는 비현실적인 ‘캔디형’ 또는 이유 없이 악행을 일삼는 ‘악인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편견은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를 위축시킨다. 내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열여덟 어른 캠페인―미디어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를 보통 청년처럼 평범하게 입체적으로 다뤄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미디어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 편견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약 7년 전 보육원을 떠나 자립에 나서던 때가 눈에 선하다. 나는 무기력했고 우울했다. 혼자 삶을 견뎌야 한다는 부담을 이기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넌 누구보다 강해져야 해. 네 삶을 책임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소리치며 스스로 주문을 걸었다. 마음을 꽁꽁 동여매고 하루를 보낸 뒤 집에 오면 쓰러져 잠만 잤다. 앞으로 세상에 나올 자립 후배들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여덟살이면 어른이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우리 ‘열여덟 어른’들이 바라는 사회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고, 뭔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이다. 고립이 아닌 자립을,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꾼다.